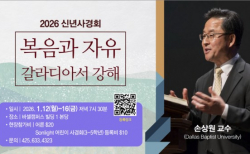1세기가 넘게 살아 온 미주한인의 역사는 어떠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을까? 척박한 야산에서도 꾸부러진 모양이기는 하지만 사계절 내내 푸르름을 내뿜으며 씩씩하게 자라고 있는 한국소나무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아주 오래 전의 일이다. 새 집으로 이사 오면서 한 그루의 소나무를 작은 정원에 심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물도 주고, 가지치기도 하면서 정성을 들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자연의 일부가 되어 버렸다.
언제나 거기에 그런 모습으로 서있었기 때문이었을까? 드나드는 사람들의 면면이 같아 그들에게 조차 새로운 자랑거리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었을까?
그렇게 잊혀졌던 그 나무가 다시 나의 관심권으로 등장한 것은 처음 나의 집을 방문한 한국으로부터 온 손님에 의해서였다.
“낮선 미국 땅에 사시다 보니 한국의 자연이 소중하게 느껴지시나 봅니다. 사실 저도 반가운 걸요.” 예상 밖의 대화에 화들짝 놀라 뒤돌아보니 그 방문객은 내게는 이미 잊혀졌던 그 소나무의 가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이날 이후로 이 소나무는 다시 나의 관심권으로 들어왔고, 이제는 나와 내 집을 이야기할 때 항상 등장하는 주인공이자 역사가 되어 버렸다.
나는 역사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나와 내 가족, 이웃들의 삶을 반추해 내고,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시간의 흐름이라는 수평적 공간이동을 그 어떤 사건이라는 행위들의 축에 엮어 내는 그런 작업이라고.
‘아메리카로 가는 길’을 쓴 파란 눈의 웨인 패터슨 박사는 하와이 한인이민1세, 그들 삶의 애환과 승리를 그린 글에서 “구한말의 한인들에게 하와이는 과연 어떤 나라였을까? 풍부한 과일과 많은 음식과 옷이 나무에 걸려 있어서 따기만 하면 되고, 모든 것이 풍요로워 걱정할 것이 없는 땅, 심지어 미국의 땅은 황금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막상 와보니 하와이 농장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언제나 먹을 것이 부족했으며, 농장의 노예 같은 노동에 시달려야 했었다.
그들은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마침내 사탕수수 농장을 떠나 와이하와에 있는 파인애플 농장으로 더 높은 임금을 따라 나서기도 했으며, 하와이의 수도 호놀룰루로 모여들어 강인한 생활력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인들은 제1, 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하와이에 주둔하게 된 군인들을 상대로 세탁업과 옷 수선, 구두 수선 등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 그리고 조직적으로 일본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독립운동과 민족운동을 펴나갔다.”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이민으로 시작된 미주 한인 이민역사를 한편의 드라마처럼 그린 그의 책은, 잊혀졌던 나의 집 정원에 서있는 그 소나무를 역사가 되게 한 방문자처럼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나도 잊고 산 우리의 이야기 아니, 나의 이야기를 담담히 그려 내는 파란 눈의 작가 앞에서 말이다. 이런 부끄러움이 나로 하여금 ‘미주한인 재단-워싱턴’ 일에 작은 정성이나마 기울이게 채찍질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가오는 새해 벽두인 1월 16일 이제 보통 명사가 되어 버린- 미주 한인의 이민 역사를 기념하는 하는 - ‘미주 한인의 날 (1월 13일)기념 축전’을 개최하려고 한다.
바쁜 이민 삶 사느라 한 그루의 소나무도 심을 겨를이 없었던 사람들, 설령 심었다 하더라도 나처럼 잊고 사는 사람들과 함께 이미 훌쩍 커버린 그 소나무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다.
역사란 그리 거창한 주제이거나 사가(史家)의 것만은 아니다.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 지난 온 시간 살아 온 선조들의 삶을 반추하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기록이거나 그 수평적 시간들의 흐름과 사건들이 하나의 축에 그려진 아니 그려져 가고 있는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지도 모른다.
미주 한인들이 미국 땅에 발을 내디딘 그 100년이 되는2005년 해에 미국 의회를 통해 매년 1월 13일을 ‘한인의 날’로 선포한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났다. 내 집 정원 심어진 그 소나무처럼 누군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 잊혀져 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앞선다. 훗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나는 자랑스러운 한인 이민 1세, 2세’라고 이야기할 때 당신은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웨인 패터슨 박사처럼 지난날을 그려 낼 이야기 거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매년 열리는 ‘미주 한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서 이민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고, 잊혀졌던 우리 문화를 맛보곤 했었지…’하는 추억거리, 잊혀진 소나무를 역사가 되게 하는 깨움 이였다고 말이다.
아니 미주한인은 누구든지 미국이라는 낮선 땅에서 할렘의 야채장수이든 더러워진 옷을 깨끗하게 세탁하는 드라이 클리너이든 된장찌개를 끓이는 식당이든 어떠한 모습의 삶을 엮어 가면서 꼬불뚱한 모양이나마 그래도 꿋꿋하게 자라고 있는 소나무의 이민역사를 써 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주 오래 전의 일이다. 새 집으로 이사 오면서 한 그루의 소나무를 작은 정원에 심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물도 주고, 가지치기도 하면서 정성을 들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자연의 일부가 되어 버렸다.
언제나 거기에 그런 모습으로 서있었기 때문이었을까? 드나드는 사람들의 면면이 같아 그들에게 조차 새로운 자랑거리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었을까?
그렇게 잊혀졌던 그 나무가 다시 나의 관심권으로 등장한 것은 처음 나의 집을 방문한 한국으로부터 온 손님에 의해서였다.
“낮선 미국 땅에 사시다 보니 한국의 자연이 소중하게 느껴지시나 봅니다. 사실 저도 반가운 걸요.” 예상 밖의 대화에 화들짝 놀라 뒤돌아보니 그 방문객은 내게는 이미 잊혀졌던 그 소나무의 가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이날 이후로 이 소나무는 다시 나의 관심권으로 들어왔고, 이제는 나와 내 집을 이야기할 때 항상 등장하는 주인공이자 역사가 되어 버렸다.
나는 역사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나와 내 가족, 이웃들의 삶을 반추해 내고,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시간의 흐름이라는 수평적 공간이동을 그 어떤 사건이라는 행위들의 축에 엮어 내는 그런 작업이라고.
‘아메리카로 가는 길’을 쓴 파란 눈의 웨인 패터슨 박사는 하와이 한인이민1세, 그들 삶의 애환과 승리를 그린 글에서 “구한말의 한인들에게 하와이는 과연 어떤 나라였을까? 풍부한 과일과 많은 음식과 옷이 나무에 걸려 있어서 따기만 하면 되고, 모든 것이 풍요로워 걱정할 것이 없는 땅, 심지어 미국의 땅은 황금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막상 와보니 하와이 농장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언제나 먹을 것이 부족했으며, 농장의 노예 같은 노동에 시달려야 했었다.
그들은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마침내 사탕수수 농장을 떠나 와이하와에 있는 파인애플 농장으로 더 높은 임금을 따라 나서기도 했으며, 하와이의 수도 호놀룰루로 모여들어 강인한 생활력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인들은 제1, 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하와이에 주둔하게 된 군인들을 상대로 세탁업과 옷 수선, 구두 수선 등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 그리고 조직적으로 일본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독립운동과 민족운동을 펴나갔다.”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이민으로 시작된 미주 한인 이민역사를 한편의 드라마처럼 그린 그의 책은, 잊혀졌던 나의 집 정원에 서있는 그 소나무를 역사가 되게 한 방문자처럼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나도 잊고 산 우리의 이야기 아니, 나의 이야기를 담담히 그려 내는 파란 눈의 작가 앞에서 말이다. 이런 부끄러움이 나로 하여금 ‘미주한인 재단-워싱턴’ 일에 작은 정성이나마 기울이게 채찍질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가오는 새해 벽두인 1월 16일 이제 보통 명사가 되어 버린- 미주 한인의 이민 역사를 기념하는 하는 - ‘미주 한인의 날 (1월 13일)기념 축전’을 개최하려고 한다.
바쁜 이민 삶 사느라 한 그루의 소나무도 심을 겨를이 없었던 사람들, 설령 심었다 하더라도 나처럼 잊고 사는 사람들과 함께 이미 훌쩍 커버린 그 소나무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다.
역사란 그리 거창한 주제이거나 사가(史家)의 것만은 아니다.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 지난 온 시간 살아 온 선조들의 삶을 반추하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기록이거나 그 수평적 시간들의 흐름과 사건들이 하나의 축에 그려진 아니 그려져 가고 있는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지도 모른다.
미주 한인들이 미국 땅에 발을 내디딘 그 100년이 되는2005년 해에 미국 의회를 통해 매년 1월 13일을 ‘한인의 날’로 선포한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났다. 내 집 정원 심어진 그 소나무처럼 누군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 잊혀져 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앞선다. 훗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나는 자랑스러운 한인 이민 1세, 2세’라고 이야기할 때 당신은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웨인 패터슨 박사처럼 지난날을 그려 낼 이야기 거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매년 열리는 ‘미주 한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서 이민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고, 잊혀졌던 우리 문화를 맛보곤 했었지…’하는 추억거리, 잊혀진 소나무를 역사가 되게 하는 깨움 이였다고 말이다.
아니 미주한인은 누구든지 미국이라는 낮선 땅에서 할렘의 야채장수이든 더러워진 옷을 깨끗하게 세탁하는 드라이 클리너이든 된장찌개를 끓이는 식당이든 어떠한 모습의 삶을 엮어 가면서 꼬불뚱한 모양이나마 그래도 꿋꿋하게 자라고 있는 소나무의 이민역사를 써 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