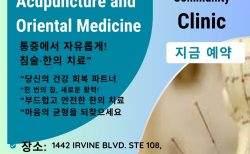많은 이들이 한국교회의 위기를 말한다. 정체 혹은 후퇴하고 있는 성장세, 자꾸만 들려오는 부정적 소식들, 교회에 대한 사회의 불신 팽배 등 총체적 난국은 미래 한국교회의 전망을 어둡게 한다. 그러나 한국교회 구석구석에서 여전히 저마다의 영성과 철학으로 ‘희망’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본지는 특별히 목회 현장 가운데에서 한국교회에 희망을 전하는 리더십 50인을 만나 그들의 사역을 소개함으로써 한국교회에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람들이 무릎 꿇고 뭐라 중얼중얼 하는거야. 뭐하는 거지… 아, 기도하는 거구나. 그래서 나도 뒤에 가만히 앉아봤어요.”
머리가 히끗한 이철 목사(남서울교회)는 그렇게 40여년 전으로 가만히 눈을 들었다. 혈기왕성 했던 대학생 시절, 하나님을 만났던 그 때로.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데 어렸을 때 전쟁나서 부산으로 피난갔던 기억, 어렵고 못살았던 학창시절 기억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대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서롭고 그래서 막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을 쏟고 나니 마음이 후련했지요.”
그의 집안은 하나님을 몰랐고 그 역시 대학생이 되기까지 교회란 곳엘 가본 적이 없었다. 대학생이 되고 친구 따라간 교회, 그리고 난생 처음 해본 새벽기도. 하나님과의 이 만남이 자신을 크리스천으로, 또 목회자로 이끌 줄 그 땐 미처 몰랐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다 이곳 남서울교회로 오셨죠?
“네. 지난 1996년에 왔으니까 올해로 벌써 14년째네요.”
-그럼 한국에서의 목회 경험은 남서울교회가 처음이십니까?
“아뇨. 미국엘 가기 전에 농촌교회에서 2년간 개척교회를 목회했었습니다. 남서울교회에서도 교역자로 있었구요. 그러다 1980년 미국으로 갔죠.”
“목사님, 목회관이 어떻게 되십니까?” 기자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목회관이라…”
그는 여기서 잠시 머뭇했다. ‘처음부터 너무 무거운 질문을 했나’ 하는 생각에 “목사님의 목회를 경험해보지 못했기에 일단 그것부터 알고 싶었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했다.
“그럼 제 얘기를 좀 해야겠군요. 전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교회도 대학교 때부터 다녔어요. 대학교 때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동생들을 가르쳤어요. 한번은 친구가 교회에 같이 가자고 하길래 따라갔다가 처음으로 목사님 설교도 듣고 헌금하는 것도 봤어요.
그 때 제가 교회를 따라갔던 건 당시 많이 방황하던 때라 절에도 가고 성당도 가고 그랬어서, 교회 가자는 친구 말에 아, 이번에 내가 교회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다 어느날 설교를 듣는데 ‘아니, 왜 목사님이 자꾸 내 얘기를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에요. 친구한테 이 얘길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시나 보다’라고 하대요. 그 후로 성경도 보면서 신앙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철 목사가 신앙을 갖게 된 대략의 스토리다. 다 적을 수 없지만 청년시절, 사연 깊은 비하인드 스토리도 많다. 농촌계몽에 관심이 많아 농부들한테 돼지를 몇 마리씩 사주기도 했고, 어머니께 말도 없이 텐트 짊어진 채 산으로 들로 돌아녔으며, ‘사영리’(四靈理) 전도지를 들고 직접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면서 발바닥에 물집이 잡혔던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 때는 목사가 되겠다는 꿈 같은 건 없었고, 오로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일념만이 넘쳤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방황과 고뇌, 그 후의 의욕과 열정. 누구나 그런 것처럼, 그 역시 신이 허락한 젊음에 많은 흔적들을 남기며 살았다.
“그렇게 오다보니 여기까지 왔고, 꿈꾸지도 않았던 목회자가 됐네요. (목회관을 물었던 질문을 다시 떠올리며) 목회자로서 전 말씀과 사람, 청년과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제 목회관이라 할 수 있죠.”
사실 처음부터 대뜸 목회관을 물은 게 잘못이었다. 일평생을 두고 쌓아온 한 사람의 가치관과 신념을 어찌 한번에 이해할 수 있으랴. 그는 너무도 친절히 자신의 과거를 들려줬다. “늙으니까 말이 많아지네”하며 그는 웃었지만 나는 비로소 그의 목회관을 들을 준비가 돼 있었다.
“말씀은 제 목회에 있어 항상 그 중심에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늘 이걸 강조해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좀 더 말씀 중심으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요즘 보면 서로 말은 많이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정말 말씀 중심으로 살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사람인데, 결국 목회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에 한 영혼 한 영혼에 혼신을 다하고 정성을 쏟는 일이야말로 목회자인 저의 사명이죠. 사실 대학생 땐 그런 마음이 컸어요. 그런데 졸업을 하고 교역자가 되면서 그런 마음이 흐려졌지요. 그러다 미국에서 그 마음을 다시 회복했어요. 거기선 심방 한번 가려면 차를 몇 시간씩 몰아야했고, 그렇게 단 몇 사람 만나면서 하루를 보내고 나면 ‘내가 이러려고 여기 왔나’하는 생각에 회의가 들기도 했어요. 그러던 중 깨달은 거죠. 아, 내가 영혼에 대한 간절함을 많이 잃었구나.
셋째가 청년이에요. 다음 세대를 책임질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청소년 청년들입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기성 세대가 중심이 된 목회 시스템이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중심이 된 시스템으로 자연스레 바뀔 것인가에 깊이 고민하고 있어요.
마지막은 공동체성의 회복입니다. 공동체가 가진 유대감과 정신이 지금 한국교회에서 차츰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질타를 받는 것도 이 공동체성의 상실에서 비롯된 면이 있죠. 소금이 그 짠 맛을 잃어버렸다고나 할까.”
-짠 맛을 잃은 교회…, 무엇이 가장 문제라고 보십니까?
“인간 관계에서 갈등이 없을 순 없지요. 그러나 한국교회는 갈등이 있으면서도 그걸 직시하지 못하고 덮어버렸기에 속으로 곪아간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한인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에게도 갈등과 분쟁이 많았죠. 그러나 지금 한인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 특성상 갈등과 분쟁을 감출 수 없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도 쉬웠던 겁니다.
과거 외부의 침략이 있었을 때 한국교회는 내부의 힘을 결집해 하나로 뭉칠 수 있었지만, 침략이 사라지자 그 힘이 흩어져 갈등으로 표출된 거에요. 우리는 이걸 직시해야 합니다.”
-‘피스메이커’ 사역도 그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 개개인의 선한 영향력을 키우고 그것이 하나로 합해져 선을 이루어가길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로도 목회자가 되겠다는 꿈은 없었다고 하셨는데, 그럼 무엇을 꿈꾸셨나요?
“목회자보다는 전도자가 되고 싶었죠.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하는 사명을 감당하길 원했어요. 대학생 때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역교회보다는 파라처치운동에 관심이 많았던 거고요. 어떤 때는 농촌 계몽 운동에 관심이 생겨 한평생 시골 사람들 전도하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죠. 집에서 쫓겨났던 적도 있고…, 하지만 교회 역사를 알게 되면서 결국 교회로 가야겠다고 결심했던 겁니다.”
-돌아보면 가장 힘들었던 때와 가장 기뻤던 때는 언제였나요?
“가장 힘들었던 때는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건강이 나빠져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던 때였습니다. 그 때 약 석달 동안 설교밖에는 할 수가 없었고 몸이 다 낫기까지 3년이란 세월이 걸렸는데, 그 때가 제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위기가 아니었다 생각됩니다.
그런데 가장 기뻤던 순간 역시 바로 그 때 있었어요. 제가 아픈 중에 교회 성도들이 힘을 합쳐 새 성전 건축을 결국 성공시킨 겁니다. 약할 때 강함되신다는 진리를 그 때서야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었지요.”
-꿈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피스메이커 사역에 더 집중하고 싶어요. 그것 말고는 특별한 꿈이 없네요. 목회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부름에 끝까지 충성한다는 생각 밖에는…….”
이철 목사는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사학과를 거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나왔다. 이후 농촌교회에서 개척목회를 했고 남서울교회 전도사로도 있었다. 1980년 도미, 미국 뉴욕중부교회 담임목사로 있다 지난 1996년 남서울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현재 한국 피스메이커 회장, 학원복음화협의회 공동대표, 성경번역선교회(GBT) 이사장으로 사역 중이다.
 |
| ▲남서울교회 이철 목사는 인터뷰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 하나님을 만났던 그 때를 들려줬다. 그 역시 다른 이들처럼 방황과 고뇌, 의욕과 열정들을 젊음에 남겼다. 그리고 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 송경호 기자 |
“사람들이 무릎 꿇고 뭐라 중얼중얼 하는거야. 뭐하는 거지… 아, 기도하는 거구나. 그래서 나도 뒤에 가만히 앉아봤어요.”
머리가 히끗한 이철 목사(남서울교회)는 그렇게 40여년 전으로 가만히 눈을 들었다. 혈기왕성 했던 대학생 시절, 하나님을 만났던 그 때로.
“눈을 감고 가만히 있는데 어렸을 때 전쟁나서 부산으로 피난갔던 기억, 어렵고 못살았던 학창시절 기억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대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서롭고 그래서 막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을 쏟고 나니 마음이 후련했지요.”
그의 집안은 하나님을 몰랐고 그 역시 대학생이 되기까지 교회란 곳엘 가본 적이 없었다. 대학생이 되고 친구 따라간 교회, 그리고 난생 처음 해본 새벽기도. 하나님과의 이 만남이 자신을 크리스천으로, 또 목회자로 이끌 줄 그 땐 미처 몰랐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다 이곳 남서울교회로 오셨죠?
“네. 지난 1996년에 왔으니까 올해로 벌써 14년째네요.”
-그럼 한국에서의 목회 경험은 남서울교회가 처음이십니까?
“아뇨. 미국엘 가기 전에 농촌교회에서 2년간 개척교회를 목회했었습니다. 남서울교회에서도 교역자로 있었구요. 그러다 1980년 미국으로 갔죠.”
“목사님, 목회관이 어떻게 되십니까?” 기자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목회관이라…”
그는 여기서 잠시 머뭇했다. ‘처음부터 너무 무거운 질문을 했나’ 하는 생각에 “목사님의 목회를 경험해보지 못했기에 일단 그것부터 알고 싶었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했다.
“그럼 제 얘기를 좀 해야겠군요. 전 믿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교회도 대학교 때부터 다녔어요. 대학교 때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동생들을 가르쳤어요. 한번은 친구가 교회에 같이 가자고 하길래 따라갔다가 처음으로 목사님 설교도 듣고 헌금하는 것도 봤어요.
그 때 제가 교회를 따라갔던 건 당시 많이 방황하던 때라 절에도 가고 성당도 가고 그랬어서, 교회 가자는 친구 말에 아, 이번에 내가 교회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다 어느날 설교를 듣는데 ‘아니, 왜 목사님이 자꾸 내 얘기를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에요. 친구한테 이 얘길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시나 보다’라고 하대요. 그 후로 성경도 보면서 신앙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
| ▲이 목사는 말씀과 사람, 청년과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 송경호 기자 |
여기까지, 이철 목사가 신앙을 갖게 된 대략의 스토리다. 다 적을 수 없지만 청년시절, 사연 깊은 비하인드 스토리도 많다. 농촌계몽에 관심이 많아 농부들한테 돼지를 몇 마리씩 사주기도 했고, 어머니께 말도 없이 텐트 짊어진 채 산으로 들로 돌아녔으며, ‘사영리’(四靈理) 전도지를 들고 직접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면서 발바닥에 물집이 잡혔던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 때는 목사가 되겠다는 꿈 같은 건 없었고, 오로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일념만이 넘쳤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방황과 고뇌, 그 후의 의욕과 열정. 누구나 그런 것처럼, 그 역시 신이 허락한 젊음에 많은 흔적들을 남기며 살았다.
“그렇게 오다보니 여기까지 왔고, 꿈꾸지도 않았던 목회자가 됐네요. (목회관을 물었던 질문을 다시 떠올리며) 목회자로서 전 말씀과 사람, 청년과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제 목회관이라 할 수 있죠.”
사실 처음부터 대뜸 목회관을 물은 게 잘못이었다. 일평생을 두고 쌓아온 한 사람의 가치관과 신념을 어찌 한번에 이해할 수 있으랴. 그는 너무도 친절히 자신의 과거를 들려줬다. “늙으니까 말이 많아지네”하며 그는 웃었지만 나는 비로소 그의 목회관을 들을 준비가 돼 있었다.
“말씀은 제 목회에 있어 항상 그 중심에 있습니다. 성도들에게도 늘 이걸 강조해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좀 더 말씀 중심으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요즘 보면 서로 말은 많이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정말 말씀 중심으로 살고 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사람인데, 결국 목회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에 한 영혼 한 영혼에 혼신을 다하고 정성을 쏟는 일이야말로 목회자인 저의 사명이죠. 사실 대학생 땐 그런 마음이 컸어요. 그런데 졸업을 하고 교역자가 되면서 그런 마음이 흐려졌지요. 그러다 미국에서 그 마음을 다시 회복했어요. 거기선 심방 한번 가려면 차를 몇 시간씩 몰아야했고, 그렇게 단 몇 사람 만나면서 하루를 보내고 나면 ‘내가 이러려고 여기 왔나’하는 생각에 회의가 들기도 했어요. 그러던 중 깨달은 거죠. 아, 내가 영혼에 대한 간절함을 많이 잃었구나.
셋째가 청년이에요. 다음 세대를 책임질 사람들은 누가 뭐래도 청소년 청년들입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기성 세대가 중심이 된 목회 시스템이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중심이 된 시스템으로 자연스레 바뀔 것인가에 깊이 고민하고 있어요.
마지막은 공동체성의 회복입니다. 공동체가 가진 유대감과 정신이 지금 한국교회에서 차츰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질타를 받는 것도 이 공동체성의 상실에서 비롯된 면이 있죠. 소금이 그 짠 맛을 잃어버렸다고나 할까.”
 |
| ▲한국교회의 위기를 말하면서 그는 “드러나지 않은 갈등들이 속으로 곪았다”고 했다. ⓒ 송경호 기자 |
-짠 맛을 잃은 교회…, 무엇이 가장 문제라고 보십니까?
“인간 관계에서 갈등이 없을 순 없지요. 그러나 한국교회는 갈등이 있으면서도 그걸 직시하지 못하고 덮어버렸기에 속으로 곪아간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한인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에게도 갈등과 분쟁이 많았죠. 그러나 지금 한인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 특성상 갈등과 분쟁을 감출 수 없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도 쉬웠던 겁니다.
과거 외부의 침략이 있었을 때 한국교회는 내부의 힘을 결집해 하나로 뭉칠 수 있었지만, 침략이 사라지자 그 힘이 흩어져 갈등으로 표출된 거에요. 우리는 이걸 직시해야 합니다.”
-‘피스메이커’ 사역도 그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 개개인의 선한 영향력을 키우고 그것이 하나로 합해져 선을 이루어가길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로도 목회자가 되겠다는 꿈은 없었다고 하셨는데, 그럼 무엇을 꿈꾸셨나요?
“목회자보다는 전도자가 되고 싶었죠.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하는 사명을 감당하길 원했어요. 대학생 때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역교회보다는 파라처치운동에 관심이 많았던 거고요. 어떤 때는 농촌 계몽 운동에 관심이 생겨 한평생 시골 사람들 전도하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죠. 집에서 쫓겨났던 적도 있고…, 하지만 교회 역사를 알게 되면서 결국 교회로 가야겠다고 결심했던 겁니다.”
-돌아보면 가장 힘들었던 때와 가장 기뻤던 때는 언제였나요?
“가장 힘들었던 때는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건강이 나빠져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던 때였습니다. 그 때 약 석달 동안 설교밖에는 할 수가 없었고 몸이 다 낫기까지 3년이란 세월이 걸렸는데, 그 때가 제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위기가 아니었다 생각됩니다.
그런데 가장 기뻤던 순간 역시 바로 그 때 있었어요. 제가 아픈 중에 교회 성도들이 힘을 합쳐 새 성전 건축을 결국 성공시킨 겁니다. 약할 때 강함되신다는 진리를 그 때서야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었지요.”
-꿈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피스메이커 사역에 더 집중하고 싶어요. 그것 말고는 특별한 꿈이 없네요. 목회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부름에 끝까지 충성한다는 생각 밖에는…….”
이철 목사는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사학과를 거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나왔다. 이후 농촌교회에서 개척목회를 했고 남서울교회 전도사로도 있었다. 1980년 도미, 미국 뉴욕중부교회 담임목사로 있다 지난 1996년 남서울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현재 한국 피스메이커 회장, 학원복음화협의회 공동대표, 성경번역선교회(GBT) 이사장으로 사역 중이다.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