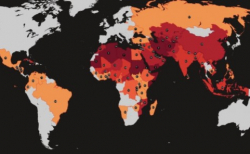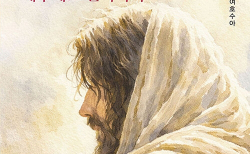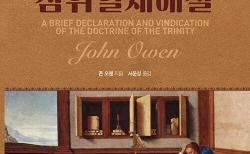지난 주 심방 중 센트럴 길을 지나다가 옥톤 칼리지 근처의 숲에 눈길이 끌렸습니다. 제 눈을 강하게 잡아끈 것은 바로 ‘색’이었습니다. 같은 품종의 나무들로 숲을 이루고 있는 그곳은 온통 황금색이었습니다. 아직 가지에 붙어 있는 이파리들도 황금색, 땅에 떨어져 바람이 스칠 때마다 몸을 들썩대는낙엽들도 황금색이었습니다. 땅과 하나가 되어가면서 뿜어댈 낙엽의 ‘달콤한 몸냄새(막 구운 빵 냄새를 닮은)’가 코로 밀려드는 듯 했습니다.
차를 멈추고 그 황금더미를 바스락거리며 즈려 밟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그냥 지나쳐 왔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 ‘색’과 ‘향’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 낙엽의 미학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땅을 떠나 주님께 갈 때도 저렇듯 고운 색과 좋은 향을 남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을이 떠남의 계절이라 그런가요, 센트럴과 리버 로드가 만나는 지점에 있는 묘지가 스쳐가질 않고 마음에 담겨왔습니다. 멀리 무덤 앞의 비석들을 바라보면서 그 비석에 새겨진 글들이 궁금해졌습니다. 비석의 한 줄 글로 그 주인의 인생이 완전히 정리될 순 없지만, 비석 주인을 먼저 보낸 사람들의 가슴에 새겨져 있을 압축된 평가는 엿볼 수 있을 겁니다. 페스탈로찌의 묘비에는 이런 글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남을 위해서만 일했을 뿐,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제임스 답슨 부친의 묘비에는 “그는 기도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민지, 민희 그리고 신욱이는 내 묘비에 어떤 글을 새겨넣을까?’
때가 되면 우리들 모두는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 계신 곳으로 떠나가야 합니다.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때 지상에 남겨 놓은 스스로의 발자국을 내려다 보면서 어떤 평가를 내리게 될지 미리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후손들은 뭐라고 기억할까도 한 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실 주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인생을 꾸려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색의 계절에 ‘나’를 돌아 보는 기회를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글/ 두란노 침례교회 이 준 목사.
차를 멈추고 그 황금더미를 바스락거리며 즈려 밟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그냥 지나쳐 왔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 ‘색’과 ‘향’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 낙엽의 미학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땅을 떠나 주님께 갈 때도 저렇듯 고운 색과 좋은 향을 남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을이 떠남의 계절이라 그런가요, 센트럴과 리버 로드가 만나는 지점에 있는 묘지가 스쳐가질 않고 마음에 담겨왔습니다. 멀리 무덤 앞의 비석들을 바라보면서 그 비석에 새겨진 글들이 궁금해졌습니다. 비석의 한 줄 글로 그 주인의 인생이 완전히 정리될 순 없지만, 비석 주인을 먼저 보낸 사람들의 가슴에 새겨져 있을 압축된 평가는 엿볼 수 있을 겁니다. 페스탈로찌의 묘비에는 이런 글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남을 위해서만 일했을 뿐,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제임스 답슨 부친의 묘비에는 “그는 기도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민지, 민희 그리고 신욱이는 내 묘비에 어떤 글을 새겨넣을까?’
때가 되면 우리들 모두는 하던 일을 멈추고 주님 계신 곳으로 떠나가야 합니다.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때 지상에 남겨 놓은 스스로의 발자국을 내려다 보면서 어떤 평가를 내리게 될지 미리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후손들은 뭐라고 기억할까도 한 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실 주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인생을 꾸려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색의 계절에 ‘나’를 돌아 보는 기회를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글/ 두란노 침례교회 이 준 목사.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