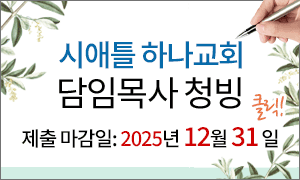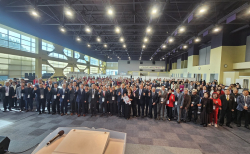기독교의 죽음과 장례문화를 고찰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새세대아카데미와 목회사회학연구소는 7일 오후 서울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주제로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다.
먼저 '죽음 이해와 추모문화'를 주제로 발표한 조성돈 교수(실천신대)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운 그 무엇으로 남아 있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그 고통 때문이기보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준비돼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라며 "정말 구원이 무엇이고,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때"라고 했다.
조 교수는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죽음은 곧 죄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은 죽음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스올이라는 죽은 자들의 세계조차도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시 139:8)"이라고 했다.
그는 욥기 14장 13절,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를 예로 들며, "즉 죽음의 세계인 스올조차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있으며, 그의 통치가 이뤄지는 곳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욥은 자신을 그곳에 감추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 죽음의 장소가 긍휼의 하나님 앞에서 피난처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조 교수는 특히 "죽음도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이뤄져야 하는 믿음의 행위"라며 죽음이 생과 사를, 선함과 악함을, 구원과 패망을 가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하나돼 그 분 안에서 다시 죽을 수 없는 존재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날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죽음 자체가 신의 영역에서 떠밀려 인간의 선택이 되고 있다"며 "그래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도, 존엄사나 안락사를 통해 자신의 죽어야 할 때를, 또는 부모가 죽어야 할 때를 결정한다"고 했다.
조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는 죽음과 생명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르쳐야 한다"며 "한국교회는 바른 구원관과 죽음에 대한 관점을 제시하고 그 뜻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생명에 대한 바른 가치를 제시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곽혜원 교수(21세기교회와신학포럼)는 '소외된 죽음에서 존엄한 죽음으로'를 제목으로 발표했다. 곽 교수는 "사람들은 평소에는 죽음에 대해 생각하기를 회피하다가도 불현듯 죽음에 직면하게 되면, 엄청난 공포감을 느끼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이처럼 준비 안 된 죽음을 당하는 일처럼 인생사에서 참담한 일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죽음에 대한 성찰은 기독교 역사 내내 기독교를 지탱해나갔던 중심축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동력이었다"며 "초대교회 교인들은 죽음을 인생사에서 가장 중대한 사건, 출저한 준비가 필요한 영적인 사건으로 믿는 가운데 죽음이라는 신성한 순간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했다"고 했다.
곽 교수는 "그러나 20세기 들어와 의학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이 전통은 급격히 설 자리를 잃었다"며 "생로병사의 순리에 따라 죽음을 준비하던 과정이 '무의미한 연명의료' 시스템에 의해 오염되고, 상장례(喪葬禮)에서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 상업적인 상조업체에 대폭 이관되면서 기독교의 아름다운 전통은 그 의미가 퇴색되어 갔다. 21세기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소외시키는 세속의 흐름에 급속히 함몰돼 버린 것"이라고 했다.
그는 "좋은 신앙인으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적으로 '잘 죽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이제 한국교회는 죽음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초대교회의 귀중한 전통을 회복시켜 성도가 평생 하나님의 영원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밖에 이날 세미나에선 문시영 교수(남서울대학)가 '웰다잉 시대의 죽음 내러티브'를, 김선일 교수(웨스트민스터대학원대학교)가 '과정으로서의 죽음: 역설의 복음전도'를 제목으로 각각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