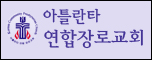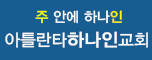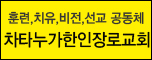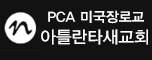요즘 들어 부쩍 애틀랜타가 한국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시작은 지난 해 연달아 일어났던 한인 강력범죄의 영향이었을 것이다. 그런 가운데 또 다시 애틀랜타가 이슈의 중심에 서 있다. 그것은 바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일 때문이다.
다 아는 것처럼, 미주 동포 주부들이 중심이 되어 세월호 관련하여 정부에 대한 비판을 뉴욕 타임즈에 게재한 일이 있었다. 그리고 이후 추모 집회가 미주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번 애틀랜타에서도 추모 집회가 있었다. 한국의 여느 집회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와 욕설과 집회를 방해하였고, 심지어는 총영사관의 사찰의혹까지 일고 있다.
그리고 일부 한인 단체들이 신문을 통해 맞불 광고를 게재하며 뉴욕 타임즈에 광고하고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종북세력'이라고 매도하였다. 한국 사회의 구조적 갈등이 미국 동포 사회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이 일어나는 문제의 핵심은 '정부를 어떻게 보느냐'하는 것이다. 20세기 진보 언론의 영웅으로 추앙 받는 이지 스톤은 "모든 정부는 거짓말을 한다"라고 말했다. 세상에 도덕적인 정부는 없다. 권력의 통조림을 따는 순간부터 부패하기 시작한다.
정부는 종교가 아니다. 정부는 무조건 믿고 따라야 하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국민은 정부가 획득한 권력을 가지고 부정과 부패, 거짓을 일삼지 못하도록 늘 견제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 비판과 견제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사회를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정부를 무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큰 문제다. 정부를 비판하는 것을 반정부 세력이나 종북세력으로 규정지어서는 안 된다. 아무런 근거와 권리도 없이, 다만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의 주장을 뭉뚱그려 종북으로 매도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정부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하는 사람들에게 '종북'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위기에 직면한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종북은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척결의 대상일 뿐이기 때문이다. 비판과 견제가 없는 열렬한 애국주의를 역사에서는 '파시즘'이라고 부른다. 즉, 그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주의를 숭배하는 것이다.
또한 '국격'의 문제도 거론된다. 국격이라는 말 자체가 어색한데, 하도 많이 쓰다 보니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는 국격은 아마도 '국가의 품격'의 줄임 말인 듯 싶다. 세월호 참사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외국 언론에 싣는 것은 국격이 떨어지는 일이라는 것이다. 다른 나라 사람들 보기에 창피하다는 말인 것 같다.
그러나, 국격을 이야기하면 매번 불쾌한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국격의 기준이 국민에게 있지 않고 다른 나라의 시선에 있기 때문이다. 국제 사회에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는 경우는 그들이 획득한 정권이 정당하지 못할 때뿐이다. 부정한 권력은 그들의 정부를 인정받기 위해서 국제 사회의 시선에 매우 민감하다. 그 외에는 자국민과 자국의 권리가 우선한다.
즉, 국격이란 우리나라의 망국병 중의 하나인 '체면 문화의 국가적 확장판'이라고 볼 수 있다. 자국 안에서의 시위와 비판을 장악된 언론에 의하여 통제 하고, 국격 타령하면서 외국의 언론의 눈치나 본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소치이다.
민주주의는 총화단결이 아니다. 다양성 속에서의 서로를 인정하고, 때로는 자신의 권리를 양보하며 이루어 나가는 합의이다. 세월호 참사로 여기 저기서 분노하고 비판하는 것은 나라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선진들이 피 흘려 이 나라와 민주주의를 지켰다면, 지금 세대는 총 대신 촛불을 들고 민주주의를 위해 또 다른 숭고한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 니콜라이 네크라소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