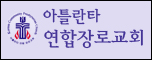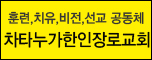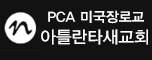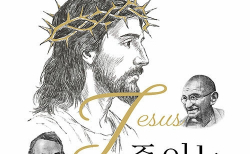어린 시절 경험하는 세상은 끝없이 넓었다. 초등학교 운동장은 그 보다 더 큰 것을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공간이었고, 옆 동네로 놀러 가는 것은 새로운 세상을 마주치는 것만큼 설레는 일이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다. 너무나 작은 세상이다. 마치 걸리버가 풍랑을 만나 소인국에 도착한 것처럼, 세파에 휩쓸려 정신 없이 살다 보니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작아져 버렸다.
너무 작고 가까워져서 오히려 당황스럽다. 옛 동네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고, 겨우 찾아낸 기억의 파편조차 생각하던 것과는 영 딴판이다. 어렸을 때 보았던 높고, 넓고, 큰 것은 어디로 모조리 다 사라졌는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모두 생각하던 것들의 반의 반도 안 되는 크기가 되었다.
그리고 가까워졌다. 이제는 어느 곳이든, 누구든 훨씬 가까워졌다. 더 이상 전학 가는 친구를 위해 눈물 흘릴 필요가 없어졌다. 교통과 통신수단의 발달로 모든 것이 빨라졌고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고향도 더 이상 고향이라는 말이 머쓱할 정도로 가까운 곳이 되어 버렸다.
빨라지고 가까워진 세상이 우리에게 훨씬 편한 것은 사실일 텐데, 무언가 허전함이 있다. 사람과 사람의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진 것만큼 마음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 거리는 멀어졌고, 사람 사이의 완충지대 역할을 했던 언어들도 힘을 잃었다. 말을 하면 할수록 이해는커녕 여기 저기서 삐걱거리는 소리만 더 커진다.
이야기할 때도 심사 숙고해서 말하는 세상이 아니다. 말하는 타이밍이 중요할 뿐이다. 무엇을 말하느냐 보다 그것을 언제 말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부치지 못한 편지 따위는 없다. 그냥 손에 쥔 전화기로 몇 자씩 두드리면 모든 것이 다 표현된다.
마음의 언어는 사라지고 기능적인 말들만 넘쳐난다. 영혼을 울리는 단어들은 기억의 감옥 속으로 사라지고 '기쁘다, 슬프다, 짜증난다' 같은 원색적인 감정을 전달하는 단어들에 눈이 부시다.
그만큼 생각의 호흡도 짧아졌다. 마음의 양식창고인 책들도 점점 더 두께는 얇아지고 여백은 늘어나고 있다. 내 인생을 쓰면 대하소설이 될 거라던 호기는 다 사라지고 이제는 엽서 한 장에도 내 마음을 다 적어내지 못한다.
세상은 물리적 거리를 좁히는 것을 발명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반작용으로 마음은 더 멀어졌다. 몸은 가깝게 부대끼는데 마음은 닿을 수 없을 만큼 먼 거리로 멀어졌다.
전에는 한 동네 사는 사람은 모두 이웃이었는데 이제는 아파트 건너 건너 사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표현하기에도 어색하고, 옆 동에 사는 사람에게서 느끼는 거리감은 다른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느끼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이렇게 가까운 세상에 마음의 거리는 왜 더 멀어진 것일까? 투박하지만 사람 냄새 났던 거친 손은 어디 가고, 모두들 향수냄새 나는 매끈하고 예의 바른 손만 내미는 것일까? 아무리 내민 손을 꽉 잡고 흔들어봐도 마음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는다. 전에는 서로 다른 마음과 생각이 부딪히는 충격에 가슴이 아팠는데 이제는 그 아련한 느낌마저 사무치도록 그립다.
멀어진 마음을 좁힐 수 있는 것들이 발명 되었으면 좋겠다. 상처받은 마음의 문을 여는 기술로 노벨상을 받는 것을 보고 싶고, 어떤 전화기를 사야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닿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보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다. 너무나 작은 세상이다. 마치 걸리버가 풍랑을 만나 소인국에 도착한 것처럼, 세파에 휩쓸려 정신 없이 살다 보니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작아져 버렸다.
너무 작고 가까워져서 오히려 당황스럽다. 옛 동네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고, 겨우 찾아낸 기억의 파편조차 생각하던 것과는 영 딴판이다. 어렸을 때 보았던 높고, 넓고, 큰 것은 어디로 모조리 다 사라졌는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모두 생각하던 것들의 반의 반도 안 되는 크기가 되었다.
그리고 가까워졌다. 이제는 어느 곳이든, 누구든 훨씬 가까워졌다. 더 이상 전학 가는 친구를 위해 눈물 흘릴 필요가 없어졌다. 교통과 통신수단의 발달로 모든 것이 빨라졌고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고향도 더 이상 고향이라는 말이 머쓱할 정도로 가까운 곳이 되어 버렸다.
빨라지고 가까워진 세상이 우리에게 훨씬 편한 것은 사실일 텐데, 무언가 허전함이 있다. 사람과 사람의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진 것만큼 마음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 거리는 멀어졌고, 사람 사이의 완충지대 역할을 했던 언어들도 힘을 잃었다. 말을 하면 할수록 이해는커녕 여기 저기서 삐걱거리는 소리만 더 커진다.
이야기할 때도 심사 숙고해서 말하는 세상이 아니다. 말하는 타이밍이 중요할 뿐이다. 무엇을 말하느냐 보다 그것을 언제 말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부치지 못한 편지 따위는 없다. 그냥 손에 쥔 전화기로 몇 자씩 두드리면 모든 것이 다 표현된다.
마음의 언어는 사라지고 기능적인 말들만 넘쳐난다. 영혼을 울리는 단어들은 기억의 감옥 속으로 사라지고 '기쁘다, 슬프다, 짜증난다' 같은 원색적인 감정을 전달하는 단어들에 눈이 부시다.
그만큼 생각의 호흡도 짧아졌다. 마음의 양식창고인 책들도 점점 더 두께는 얇아지고 여백은 늘어나고 있다. 내 인생을 쓰면 대하소설이 될 거라던 호기는 다 사라지고 이제는 엽서 한 장에도 내 마음을 다 적어내지 못한다.
세상은 물리적 거리를 좁히는 것을 발명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반작용으로 마음은 더 멀어졌다. 몸은 가깝게 부대끼는데 마음은 닿을 수 없을 만큼 먼 거리로 멀어졌다.
전에는 한 동네 사는 사람은 모두 이웃이었는데 이제는 아파트 건너 건너 사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표현하기에도 어색하고, 옆 동에 사는 사람에게서 느끼는 거리감은 다른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느끼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이렇게 가까운 세상에 마음의 거리는 왜 더 멀어진 것일까? 투박하지만 사람 냄새 났던 거친 손은 어디 가고, 모두들 향수냄새 나는 매끈하고 예의 바른 손만 내미는 것일까? 아무리 내민 손을 꽉 잡고 흔들어봐도 마음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는다. 전에는 서로 다른 마음과 생각이 부딪히는 충격에 가슴이 아팠는데 이제는 그 아련한 느낌마저 사무치도록 그립다.
멀어진 마음을 좁힐 수 있는 것들이 발명 되었으면 좋겠다. 상처받은 마음의 문을 여는 기술로 노벨상을 받는 것을 보고 싶고, 어떤 전화기를 사야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닿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