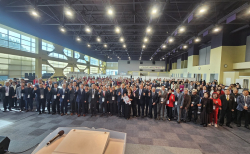(뉴욕=연합뉴스) 미국 뉴욕의 마리스트대학에서 패션을 전공한 멜리사 리예스는 지난해 5월 졸업 후 수십 군데에 입사 지원서를 냈지만 모두 떨어졌다. 그래서인지 맨해튼의 한 패션회사에서 무보수 인턴십 자격을 얻었을 때에는 날아갈듯이 기뻤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였고 이내 비애감에 빠졌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밤 9시에 퇴근하는 일이 예사일 정도로 노동을 `착취'당했으나 배우는 것이라고는 도무지 없었다. 리예스에게 주어진 일이라고는 도시락 심부름이나 청소, 재고품 정리 등의 허드렛일이 전부였다.
미국 고용시장에 혹한기가 지속되면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노동시장 진출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무보수 인턴에 나서는 대학 졸업생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과거 영화사나 비영리기구 등에 국한됐던 것이 지금은 패션업체, 출판사, 홍보ㆍ마케팅 회사, 미술품 갤러리, 연예인 기획사, 로펌 등으로 널리 확산되는 추세다.
많은 인턴십은 소중한 경험을 제공하지만 리예스처럼 배우는 것은 거의 없이 하찮은 일에만 내몰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인턴들은 대안이 없다고 말한다. 지난 4일 발표된 노동부의 통계에서 20∼24세 미국 젊은이들의 실업률이 13.2%에 달했을 정도로 일자리 상황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다수의 인턴십 프로그램이 연방정부 규정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에 따르면 무보수 인턴십은 사실상의 직업교육이어야 한다. 또 인턴의 노동은 엄격한 감독 하에서 이뤄져야 하고 고용주는 인턴의 근로를 통해 직접적인 이득을 보면 안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하지만 노동부의 단속의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단속 인력이 부족한데다 무엇보다 인턴들이 취업에 불리하게 작용할지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불만 제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타임스는 24세 이하 대졸자의 실업률이 9.4%로 1985년 이래 최고치로 치솟은 가운데 무보수 인턴에 나선 대졸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갈수록 숫자가 늘어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노동시장 조사업체인 인턴 브릿지는 미국에서 매년 인턴을 하는 대학생이 100만명에 달하며 이들 중 절반 정도는 무보수로 일하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인턴 문제 전문가인 미 경제정책연구소(EPI)의 로스 아이센브레이 부소장은 "몇년 전만 해도 대졸자가 무보수 인턴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아이비리그 졸업생도 무보수 인턴에 나선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