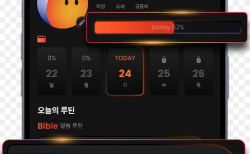최근 한국의 유명한 등반가가 히말라야의 고봉을 등반하다가 실종된 사건이 있었다. 실종된 등반가는 세계의 고봉을 거의 다 등반한 거의 전설에 가까운 등반가였기에 그 충격이 컸다.
한국이 여러 가지 면에서 눈부신 발전을 하면서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에베레스트의 고봉과 남극 북극을 탐험하는 일에도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인의 강인함과 도전정신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생각된다. 사람들에 따라서는 험난한 고봉과 극지에 도전하는 이런 일을 무모하고 쓸데없는 일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무엇 때문에 목숨을 걸고 산에 오르는가? 라고 묻는다. 이런 질문에 대해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오른 힐라리 경은 유명한 대답을 남겼다. 무엇 때문에 산에 오르느냐고? 거기 산이 있기 때문에! 언뜻 들으면 이 대답은 동문서답 같이 들리지만 내 생각에 무척 영감 있고 지혜로운 대답이다. 내 나름으로 조금 해석을 덧붙이자면 이런 얘기다. 산을 오르는 것은 우리가 시작한 일이 아니라 산을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나님은 산을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함과 장엄함을 보게 하셨을 뿐 만 아니라 우리 가슴에 그 산을 오르고자 하는 도전정신도 아울러 주셨다는 말이다.
그런즉 산을 오른다는 것은 꼭 사람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에, 아니 더 나아가 신의 섭리에 순응하는 일이라는 의미이다. 그런 까닭에 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높은 곳을 올랐다는 정복의 쾌감보다는 그 곳에 오른 후 더욱 더 겸허해진다고 한다. 마치 어느 우주인이 우주에 간 후 우주에 가보니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더욱 분명히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한국인으로 처음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고상돈 대원은 그 곳에 성경을 묻고 왔다고 하며 최근 고봉을 많이 오르는 산악인들은 산을 정복했다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고 한다. 좋은 생각이다 싶다. 산이란 본래 누구를 정복하거나 정복하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나는 어린 시절 서울 변두리의 산동네에서 자랐다. 그리 높은 산은 아니지만 신라시대 때 지은 절이 있으니 꽤 유서 깊은 곳이다. 우리 집은 그 산의 중턱쯤에 있었는데 집 옆으로는 산에서 흘러내리는 적지 않은 개울이 흘렀고 그 건너편에는 눕기 좋은 넓직한 바위가 있었다. 여름에는 개울에서 멱을 감고 그 바위에 누워 하늘을 보며 별을 세었다. 가슴이 답답할 때면 한 숨에 오를 수 있는 산에 올라 먼 곳을 바라보곤 했다. 산에 오르면 멀리 김포공항에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것이 보였는데 그것을 보면 언젠가 나도 저 비행기를 탈 날이 있을까 하며 꿈을 꾸기도 했다. 산은 그렇게 나의 집이자 놀이터이자 친구이자 스승이었다. 그래서 난 지금도 산을 좋아한다. 그러나 형편상 자주 가볼 수는 없다. 그래서 난 언젠가 내쇼날 지오그래피에 부록으로 나온 에베레스트 산의 화보를 늘 내 책상 옆에 붙여놓고 있다. 위성으로 찍어 다양한 등반 코스까지 세세히 그려진 이 화보를 보며 난 가끔씩 에베레스트를 오른다.
베이스캠프에서 산을 올려다 본 후 호기 있게 출발하고 중턱쯤부터는 숨이 차다가 정상에 오를 쯤은 정신이 몽롱해지는 상상을 한다. 그리곤 정상! 그 곳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내려다보며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에베레스트 그 넘어 먼 하늘을 우러러 보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다. 그리고 기도한다. 어린 시절 동네 뒷산에서 꾸던 꿈을 이루사 비행기 타고 미국에 와 나를 오늘 여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나를 부르사 에베레스트 그 너머의 나라로 부르사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실 것을. 그런 즉 에베레스트 그 너머를 바라보는 믿음의 도전은 영원한 소망이자 영원한 감격이다. 나는 오늘도 에베레스트 그 너머를 향해 묵묵히 걸어간다
한국이 여러 가지 면에서 눈부신 발전을 하면서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에베레스트의 고봉과 남극 북극을 탐험하는 일에도 단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인의 강인함과 도전정신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생각된다. 사람들에 따라서는 험난한 고봉과 극지에 도전하는 이런 일을 무모하고 쓸데없는 일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무엇 때문에 목숨을 걸고 산에 오르는가? 라고 묻는다. 이런 질문에 대해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오른 힐라리 경은 유명한 대답을 남겼다. 무엇 때문에 산에 오르느냐고? 거기 산이 있기 때문에! 언뜻 들으면 이 대답은 동문서답 같이 들리지만 내 생각에 무척 영감 있고 지혜로운 대답이다. 내 나름으로 조금 해석을 덧붙이자면 이런 얘기다. 산을 오르는 것은 우리가 시작한 일이 아니라 산을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다. 하나님은 산을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함과 장엄함을 보게 하셨을 뿐 만 아니라 우리 가슴에 그 산을 오르고자 하는 도전정신도 아울러 주셨다는 말이다.
그런즉 산을 오른다는 것은 꼭 사람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에, 아니 더 나아가 신의 섭리에 순응하는 일이라는 의미이다. 그런 까닭에 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높은 곳을 올랐다는 정복의 쾌감보다는 그 곳에 오른 후 더욱 더 겸허해진다고 한다. 마치 어느 우주인이 우주에 간 후 우주에 가보니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더욱 분명히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한국인으로 처음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고상돈 대원은 그 곳에 성경을 묻고 왔다고 하며 최근 고봉을 많이 오르는 산악인들은 산을 정복했다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고 한다. 좋은 생각이다 싶다. 산이란 본래 누구를 정복하거나 정복하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나는 어린 시절 서울 변두리의 산동네에서 자랐다. 그리 높은 산은 아니지만 신라시대 때 지은 절이 있으니 꽤 유서 깊은 곳이다. 우리 집은 그 산의 중턱쯤에 있었는데 집 옆으로는 산에서 흘러내리는 적지 않은 개울이 흘렀고 그 건너편에는 눕기 좋은 넓직한 바위가 있었다. 여름에는 개울에서 멱을 감고 그 바위에 누워 하늘을 보며 별을 세었다. 가슴이 답답할 때면 한 숨에 오를 수 있는 산에 올라 먼 곳을 바라보곤 했다. 산에 오르면 멀리 김포공항에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것이 보였는데 그것을 보면 언젠가 나도 저 비행기를 탈 날이 있을까 하며 꿈을 꾸기도 했다. 산은 그렇게 나의 집이자 놀이터이자 친구이자 스승이었다. 그래서 난 지금도 산을 좋아한다. 그러나 형편상 자주 가볼 수는 없다. 그래서 난 언젠가 내쇼날 지오그래피에 부록으로 나온 에베레스트 산의 화보를 늘 내 책상 옆에 붙여놓고 있다. 위성으로 찍어 다양한 등반 코스까지 세세히 그려진 이 화보를 보며 난 가끔씩 에베레스트를 오른다.
베이스캠프에서 산을 올려다 본 후 호기 있게 출발하고 중턱쯤부터는 숨이 차다가 정상에 오를 쯤은 정신이 몽롱해지는 상상을 한다. 그리곤 정상! 그 곳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내려다보며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에베레스트 그 넘어 먼 하늘을 우러러 보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다. 그리고 기도한다. 어린 시절 동네 뒷산에서 꾸던 꿈을 이루사 비행기 타고 미국에 와 나를 오늘 여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나를 부르사 에베레스트 그 너머의 나라로 부르사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실 것을. 그런 즉 에베레스트 그 너머를 바라보는 믿음의 도전은 영원한 소망이자 영원한 감격이다. 나는 오늘도 에베레스트 그 너머를 향해 묵묵히 걸어간다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