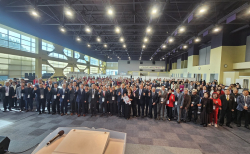(애틀랜타=연합뉴스)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미국의 신생아 사망률이 일부 후진국보다 높은 원인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은 지난 8월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신생아 사망률 통계에서 세계에서 41번째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9년 1천명당 4.3명이 태어난 지 4주 안에 숨져, 실질적 1위인 일본(1.1명)에 비해 무려 4배나 그 수가 많았다. 한국은 1천명당 2.2명으로 미국의 절반 수준이었다.
미국의 신생아 사망자는 233명 중에 1명꼴로 발생해 345명 중 1명 꼴인 쿠바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이 더욱 컸다.
이런 망신스러운 결과를 놓고 각계에서 원인 진단과 함께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고 4일 USA 투데이가 보도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미국의 신생아 사망률이 높은 것은 출산 교육과 의료수준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다.
특히 신생아 사망의 상당수가 질식사와 임신 전 비만, 당뇨병 등 여성의 건강 상태와 관계있는 돌연사라는 점에서 의료계 탓이 크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신생아 사망의 주된 요인인 조산의 위험을 높이는 임신촉진제 등 의사의 과도한 약처방도 또다른 원인으로 지목됐다.
그러나 의료계 측은 WHO의 조사는 혼혈아와 흑인이 많은 미국의 인구 특징을 무시한 통계치 나열에 불과한 것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혼혈아와 흑인은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신생아의 돌연사 확률이 타인종에 비해 월등히 높다.
미국은 신생아 사망률이 매우 낮은 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 영국에 비해 타인종 간 결혼 인구가 4배에서 최대 8배까지 많다.
따라서 미국의 높은 신생아 사망률은 불가피한 것이며 의료의 질과는 무관하다는 게 미국 의료계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공공기관과 시민단체 측은 `아기 홀로 잠재우기' 캠페인 같은 산모 교육을 통해 신생아 사망률을 1년 만에 10% 이상 떨어트린 메릴랜드와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성공 사례를 소개하면서 "변화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WHO와 함께 신생아 사망률 조사를 실시하는 `세이브더칠드런' 측은 "신생아 사망은 모두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란 견해를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