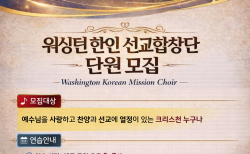(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미국 연방 정부가 이동통신사업자 AT&T와 티모빌 합병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일자리 감소를 우려한 때문이라고 1일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가 보도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두 회사의 합병이 시장의 경쟁을 저해해 요금 인상을 초래한다며 합병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시장 점유율 26.6%(이하 1월 기준)인 AT&T와 12.2%인 티모빌이 합치면 버라이존(31.3%)을 제치고 시장 점유율 1위가 된다.
LAT는 하지만 연방 정부가 두 회사의 합병에 제동을 건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합병 이후 예상되는 대규모 감원이라고 분석했다. 두 회사 조직이 합쳐지면 잉여 인력을 쳐낼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유선 전화 사업이 주력인 AT&T는 휴대 전화 부문을 포함해 25만8천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지만 티모빌 직원은 4만2천명에 불과하다. 휴대전화 1위 업체 버라이존 역시 직원은 8만3천명 뿐이다.
줄잡아 2만여명이 해고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재선을 위해 일자리 창출에 목을 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처지에서는 결코 반길 일이 아니다.
지난 3월 AT&T가 티모빌 인수 계획을 설명할 때 합병하면 중복 투자와 불필요한 구매를 줄여 100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와 구매가 줄어들면 당연히 일자리도 줄어든다. 또 두 회사 콜센터와 요금 청구 및 징수 부문을 합치면 100억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이는 대규모 감원과 직결된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장기적으로 보면 합병이 기업 경쟁력을 키워 더 많은 일자리와 투자를 창출해낸다는 주장이다.
AT&T도 합병이 성사되면 외국에 있는 콜센터를 미국으로 옮겨오겠다고 약속했다. 5천개의 일자리가 미국으로 온다는 뜻이다. 그리고 8억 달러를 투자해 사업 규모를 늘리면 9만6천명을 더 고용할 수 있게 된다는 연구 자료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합병에 따른 신규 투자의 효과는 장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오바마 행정부의 선택지는 아니다.
대규모 합병에서 이제 경제적, 산업적, 사회적 효과뿐 아니라 일자리도 민감한 이슈로 등장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