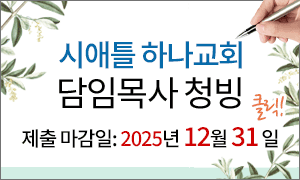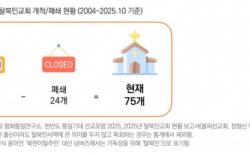‘온 천하에 다니며 만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대위임령(The Great Commission)은 2천년 동안 교회와 신학의 ‘세계화’를 이끌었지만, 특히 19세기 이후 급속히 이뤄진 기독교의 세계화는 ‘세속화’와 ‘상황화’를 불러오면서 교회와 신학의 방향을 흐리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템플턴상을 1997년 수상했던 한스 슈바르츠 박사(Hans Schwarz·독일 레긴스부르크대 조직신학 교수)가 내한해 ‘세계화 시대에 신학하기’라는 발제를 통해 이에 답했다.
30일 루터대학교(총장 박일영)에서 자신의 고희(古稀)를 기념해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 슈바르츠 박사는 “‘신학의 세계화’와 ‘세계화 시대에 신학하기’는 동일한 의미”라며 “세계화 시대라는 다양한 상황과 문화 가운데서도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중요한 신학의 방향은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삶의 궁극적인 질문을 던져야 하며, 그 답을 실존적이고 성경적 근거에서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슈바르츠 박사는 “신학은 결코 시대와 장소,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는 복음의 진리와 가치가 시간에 의해 퇴색되지도, 상황에 의해 변질되지도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사는 중국과 베트남, 캄보디아 등의 아시아 공산권 국가들의 사례를 들었다. “최근 이 지역들에서 기독교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며 “기독교는 이곳 사람들에게 전에 없던 새로운 삶의 의미를 던져주고 미래의 지향점을 보여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공산권 체제 하에서 그들은 참된 자유를 맛보지 못하고 삶의 궁극적 목표를 찾지 못했지만, 이들은 복음을 통해 이를 알게 됐다.
이러한 복음은 성경 말씀에 근거하게 되는데, 시대와 문화가 다른 상황 속에서 이를 어떻게 온전히 전할 수 있을까? 박사는 “이것이 바로 신학자와 목회자인 우리의 질문이며 과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폴 틸리히는 자신의 ‘상관방법론’으로 문화와 신학을 하나로 엮어내려 했다. 박사에 따르면 이 방법은 루터의 대교리문답서(십계명 제1항 해설)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궁극적 관심(ultimate concern)을 문화를 통해 질문하고 신학은 그들의 언어로 답하게 하는 것이다.
박사는 판넨베르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판넨베르크는 신학의 ‘과학화’와 ‘학문화’를 주장하면서 신학이 신학자들만의 ‘놀이 공간’이 아닌, 모든 학문이 통섭할 수 있는 공동의 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회와 신학이 세속화된 세계 한가운데서 세계를 향해 하나님의 계시 사건을 전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종말에 일어날 완전한 계시의 선취적 사건이므로, 현대인은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올바로 보아야 한다며 “이는 우리의 과거였지만 우리의 현재이며, 미래”라고 그는 주장했다.
박사는 이들이 주장하는 데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바로 “현대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다양한 방법으로 성서적 진리를 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사는 “그러나 상황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변하라는 것도 아니고, 상황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적 진리를 퇴색시키라는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오는 2일까지 계속되는 학술대회는 슈바르츠 박사의 아시아 제자들 모임인 ATS(Asian Theological Society)가 주최하고, 루터교단과 루터대가 후원하고 있다. 루터 신학을 기초로 현대 신학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슈바르츠 박사는 기독교 진리를 현대인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변증적 관심을 갖고 학문 연구에 매진해 왔다. 독일과 미국에서 왕성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그의 대표적인 저작으로는 <종말론(Eschatology, 2000)>, <창조(Creation, 2002)>, <세계의 신학(Theology in a Global Context, 2005)> 등이 있다.
‘종교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템플턴상을 1997년 수상했던 한스 슈바르츠 박사(Hans Schwarz·독일 레긴스부르크대 조직신학 교수)가 내한해 ‘세계화 시대에 신학하기’라는 발제를 통해 이에 답했다.
30일 루터대학교(총장 박일영)에서 자신의 고희(古稀)를 기념해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 슈바르츠 박사는 “‘신학의 세계화’와 ‘세계화 시대에 신학하기’는 동일한 의미”라며 “세계화 시대라는 다양한 상황과 문화 가운데서도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중요한 신학의 방향은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삶의 궁극적인 질문을 던져야 하며, 그 답을 실존적이고 성경적 근거에서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슈바르츠 박사는 “신학은 결코 시대와 장소,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는 복음의 진리와 가치가 시간에 의해 퇴색되지도, 상황에 의해 변질되지도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사는 중국과 베트남, 캄보디아 등의 아시아 공산권 국가들의 사례를 들었다. “최근 이 지역들에서 기독교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며 “기독교는 이곳 사람들에게 전에 없던 새로운 삶의 의미를 던져주고 미래의 지향점을 보여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공산권 체제 하에서 그들은 참된 자유를 맛보지 못하고 삶의 궁극적 목표를 찾지 못했지만, 이들은 복음을 통해 이를 알게 됐다.
이러한 복음은 성경 말씀에 근거하게 되는데, 시대와 문화가 다른 상황 속에서 이를 어떻게 온전히 전할 수 있을까? 박사는 “이것이 바로 신학자와 목회자인 우리의 질문이며 과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폴 틸리히는 자신의 ‘상관방법론’으로 문화와 신학을 하나로 엮어내려 했다. 박사에 따르면 이 방법은 루터의 대교리문답서(십계명 제1항 해설)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궁극적 관심(ultimate concern)을 문화를 통해 질문하고 신학은 그들의 언어로 답하게 하는 것이다.
박사는 판넨베르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판넨베르크는 신학의 ‘과학화’와 ‘학문화’를 주장하면서 신학이 신학자들만의 ‘놀이 공간’이 아닌, 모든 학문이 통섭할 수 있는 공동의 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회와 신학이 세속화된 세계 한가운데서 세계를 향해 하나님의 계시 사건을 전해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종말에 일어날 완전한 계시의 선취적 사건이므로, 현대인은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올바로 보아야 한다며 “이는 우리의 과거였지만 우리의 현재이며, 미래”라고 그는 주장했다.
박사는 이들이 주장하는 데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바로 “현대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다양한 방법으로 성서적 진리를 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사는 “그러나 상황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변하라는 것도 아니고, 상황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적 진리를 퇴색시키라는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오는 2일까지 계속되는 학술대회는 슈바르츠 박사의 아시아 제자들 모임인 ATS(Asian Theological Society)가 주최하고, 루터교단과 루터대가 후원하고 있다. 루터 신학을 기초로 현대 신학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슈바르츠 박사는 기독교 진리를 현대인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변증적 관심을 갖고 학문 연구에 매진해 왔다. 독일과 미국에서 왕성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그의 대표적인 저작으로는 <종말론(Eschatology, 2000)>, <창조(Creation, 2002)>, <세계의 신학(Theology in a Global Context, 2005)> 등이 있다.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