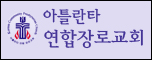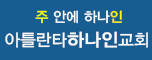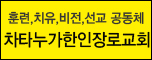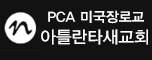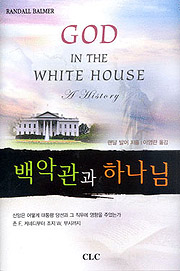
신간 <백악관과 하나님(God in the White House a History, CLC)>을 제목만 보고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링컨(생명의말씀사)>이나 <미국 역대 대통령의 믿음(베드로서원)> 같은 대통령들의 신앙 이야기라고 생각했다면, 당신은 ‘낚였다’.
美 컬럼비아대 종교사 교수이자 <크리스채너티투데이> 편집인인 랜달 발머(Randall Balmer)는 여러 저작을 통해 미국의 ‘기독교 우파’의 움직임들에 대해 비판해 온 것처럼, 이 책에서도 백악관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는 이들에게 날선 비판을 가하고 있다.
이 책은 특히 첫 카톨릭 신자 대통령이었던 1960년대의 존 F. 케네디부터 ‘거듭난 크리스천’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직전 대통령 조지 W. 부시까지의 대통령 당선에 종교가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핀다.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위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대륙을 건너간 청교도들이 세운 미국이라는 ‘기독교 국가’는, 그 신앙의 자유를 헌법에서 기독교 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까지 확대해 놓고 있다. ‘의회는 국교(國敎) 제정에 관한 법률을 만들 수 없으며, 신앙의 자유를 금하는 법률도 만들 수 없으며…’, ‘미 합중국에서는 어떤 직책이나 공직에 대한 자격 요건으로 여하한 종교 검증을 규정해서는 아니된다.’
책에 따르면 케네디는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투표소에 들어설 때는 제발 후보자의 종교는 무시해버리라”고 국민들에게 읍소한 끝에 1960년 간신히 당선됐다. 케네디의 이 주장은 1964년, 1968년, 1972년까지 성공했다. 심지어 1968년 몰몬교도였던 조지 롬니(George Romney)도 공화당 예비선거에 출마했음에도 관심 밖일 정도였다.
저자에 따르면 이러한 패러다임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한 닉슨(Richard Nixon)의 사임으로 와해된다. 여러 차례 발뺌하려는 닉슨의 속임수를 겪으면서, 후보자의 신앙을 따져보는 일이 중요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남침례교 주일학교 교사였던 구속자(救贖者) 카터를 백악관에 입성하게 했고, 이후 레이건(Ronald Reagan)과 조지 부시(George Bush), 그리고 클린턴(Bill Clinton)에까지 이어졌다. 특히 클린턴의 스캔들은 드라마틱한 간증을 들려주는 부시(George W. Bush)를 당선시켰다.
저자는 그러나 신앙의 정직성이 정치에 그대로 적용된 것만은 아니라고 말한다. 재선에 성공한 ‘거듭난 크리스천’ 조지 W. 부시는 이라크에서 고문을 자행했고, 실제로 도덕성과 기독교적 가치에서 집무를 수행했던 카터(Jimmy Carter)와 아버지 부시는 재선에 실패했다.
저자는 미국의 대통령이 최고 사령관일 뿐, 대제사장이나 수석 목사는 아니라고 결론내린다. 후보자의 신앙을 고려하는 것은 물론 잘 하는 일이지만, 고려해야 할 많은 것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다.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내가 수술실에 들어가거나 비행기를 탈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그 외과 의사 혹은 그 조종사가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종교적 판단 기준의 굴절 때문에 상처를 입은 것처럼 신앙 그 자체도 정치화로 인해 상처를 입었으며, 종교가 정치적 영향력을 끼치려고 할 때는 타협의 예술이라 표현되는 정치의 속성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저자는 “종교란 권력의 협의체 속에서가 아닌 사회의 변두리에 있을 때 언제나 가장 잘 제 구실을 한다”며 “일단 종교 문제를 어떤 특정 후보나 정당 또는 정치적 영향력 탐색과 연관시키기 시작하면, 궁극적으로 상처를 입는 쪽은 신앙”이라고 말한다. 종교나 신앙의 영역에서는 ‘타협’이 별로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유권자들을 향해서도 “후보자들의 신앙 고백을 약간의 의심 그 이상을 가지고 보라”고 지적한다. 결국 그들이 그토록 신앙을 강조하는 것은 그러한 수법이 ‘먹히기’ 때문이 아니냐는 말이다. 그리고, 후보자와 대통령 모두에게 그들이 했던 신앙고백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명실상부한 기독교 국가인 미국의 이야기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이 책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물론 이 책은 ‘기독교 우파’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을 갖고 있고, 신앙적인 면만으로 표를 던지는 유권자들을 비판한 것처럼 ‘종교’라는 이슈 하나로 대통령 당선 유무가 결정됐다는 논리적 비약이 사용되기도 했다(이 책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빌리 그래함일 정도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 사학법과 복지법 개정 등으로 기독교는 ‘탄압’을 직접 당하진 않았지만 최소한 이를 느꼈고, 현 이명박 정부 출범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이명박 정부가 비판받을 때마다 기독교가 함께 비판받는 빌미를 제공했다. 실제로 지난해 총선에는 ‘기독당’이 나서기도 했다. ‘안티 기독교’ 분위기 확산과 기독교의 정치세력화를 경계하는 목소리들 속에서, 이 책의 교훈처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과 국교가 기독교가 아닌 나라에서 기독교적 가치를 위해 정치에 참여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美 컬럼비아대 종교사 교수이자 <크리스채너티투데이> 편집인인 랜달 발머(Randall Balmer)는 여러 저작을 통해 미국의 ‘기독교 우파’의 움직임들에 대해 비판해 온 것처럼, 이 책에서도 백악관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는 이들에게 날선 비판을 가하고 있다.
이 책은 특히 첫 카톨릭 신자 대통령이었던 1960년대의 존 F. 케네디부터 ‘거듭난 크리스천’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직전 대통령 조지 W. 부시까지의 대통령 당선에 종교가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핀다.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위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대륙을 건너간 청교도들이 세운 미국이라는 ‘기독교 국가’는, 그 신앙의 자유를 헌법에서 기독교 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까지 확대해 놓고 있다. ‘의회는 국교(國敎) 제정에 관한 법률을 만들 수 없으며, 신앙의 자유를 금하는 법률도 만들 수 없으며…’, ‘미 합중국에서는 어떤 직책이나 공직에 대한 자격 요건으로 여하한 종교 검증을 규정해서는 아니된다.’
책에 따르면 케네디는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투표소에 들어설 때는 제발 후보자의 종교는 무시해버리라”고 국민들에게 읍소한 끝에 1960년 간신히 당선됐다. 케네디의 이 주장은 1964년, 1968년, 1972년까지 성공했다. 심지어 1968년 몰몬교도였던 조지 롬니(George Romney)도 공화당 예비선거에 출마했음에도 관심 밖일 정도였다.
저자에 따르면 이러한 패러다임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한 닉슨(Richard Nixon)의 사임으로 와해된다. 여러 차례 발뺌하려는 닉슨의 속임수를 겪으면서, 후보자의 신앙을 따져보는 일이 중요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남침례교 주일학교 교사였던 구속자(救贖者) 카터를 백악관에 입성하게 했고, 이후 레이건(Ronald Reagan)과 조지 부시(George Bush), 그리고 클린턴(Bill Clinton)에까지 이어졌다. 특히 클린턴의 스캔들은 드라마틱한 간증을 들려주는 부시(George W. Bush)를 당선시켰다.
저자는 그러나 신앙의 정직성이 정치에 그대로 적용된 것만은 아니라고 말한다. 재선에 성공한 ‘거듭난 크리스천’ 조지 W. 부시는 이라크에서 고문을 자행했고, 실제로 도덕성과 기독교적 가치에서 집무를 수행했던 카터(Jimmy Carter)와 아버지 부시는 재선에 실패했다.
저자는 미국의 대통령이 최고 사령관일 뿐, 대제사장이나 수석 목사는 아니라고 결론내린다. 후보자의 신앙을 고려하는 것은 물론 잘 하는 일이지만, 고려해야 할 많은 것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다.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내가 수술실에 들어가거나 비행기를 탈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그 외과 의사 혹은 그 조종사가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종교적 판단 기준의 굴절 때문에 상처를 입은 것처럼 신앙 그 자체도 정치화로 인해 상처를 입었으며, 종교가 정치적 영향력을 끼치려고 할 때는 타협의 예술이라 표현되는 정치의 속성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저자는 “종교란 권력의 협의체 속에서가 아닌 사회의 변두리에 있을 때 언제나 가장 잘 제 구실을 한다”며 “일단 종교 문제를 어떤 특정 후보나 정당 또는 정치적 영향력 탐색과 연관시키기 시작하면, 궁극적으로 상처를 입는 쪽은 신앙”이라고 말한다. 종교나 신앙의 영역에서는 ‘타협’이 별로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
| ▲똑같이 ‘거듭난 크리스천’임을 표방했지만 재선에 실패한 카터(왼쪽)와 성공한 부시(오른쪽). 그러나 부시는 이라크 전쟁과 관련해 의견이 엇갈린다. |
명실상부한 기독교 국가인 미국의 이야기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이 책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물론 이 책은 ‘기독교 우파’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을 갖고 있고, 신앙적인 면만으로 표를 던지는 유권자들을 비판한 것처럼 ‘종교’라는 이슈 하나로 대통령 당선 유무가 결정됐다는 논리적 비약이 사용되기도 했다(이 책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빌리 그래함일 정도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 사학법과 복지법 개정 등으로 기독교는 ‘탄압’을 직접 당하진 않았지만 최소한 이를 느꼈고, 현 이명박 정부 출범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이명박 정부가 비판받을 때마다 기독교가 함께 비판받는 빌미를 제공했다. 실제로 지난해 총선에는 ‘기독당’이 나서기도 했다. ‘안티 기독교’ 분위기 확산과 기독교의 정치세력화를 경계하는 목소리들 속에서, 이 책의 교훈처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과 국교가 기독교가 아닌 나라에서 기독교적 가치를 위해 정치에 참여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