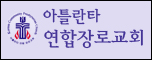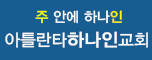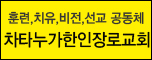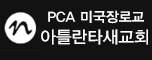경기한파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세계 어느 곳에 가도 교회를 가장 먼저 세우는 한국인의 영성은 세계 곳곳에서 ‘선교의 열매’를 맺고 있다. 단기선교 시즌을 맞아, 지역교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선교를 조명해본다. 가는 선교사만큼 중요한 ‘보내는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각 교회의 다양한 선교방법과 선교대상, 그 비전을 각 교회 선교부장을 통해 들어본다. -편집자 주-
경기 어렵지만 선교지, 선교금 오히려 늘려
가나, 태국, 파라과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푸아뉴기니, 터키, 불가리아, 이란, 멕시코, 미얀마, 이스라엘,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듣기만해도 다양한 나라의 이름들은 새한장로교회(담임 송상철 목사)가 지원하고 있는 선교지 40군데 중 일부를 나열한 것이다. 새한장로교회는 경제불황이 닥친 지난 3년 간 선교금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선교지를 매년 5군데씩 늘렸고 후원금도 올해 100불에서 150불씩으로 늘렸다. 새한장로교회의 뜨거운 선교열정의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
그 비밀을 듣기 위해 새한장로교회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바울선교사역지원단 단장 김교선 장로와 선교사역팀장 정진영 권사를 16일(목) 만났다.
“경기가 어렵지만 교인들 선교열정은 대단합니다. 올해는 선교헌금 배당금을 올리고 지원 선교지도 늘렸습니다.”
헌금의 10분의 1을 선교로 지원하는 것이 교회 창립 당시 목표였지만 현재는 선교금이 총 수입의 10%를 넘어섰다. 불경기 탓에 교회마다 20~30% 가량 헌금이 줄었고, 선교지와 후원금까지 늘린다는 것은 말만큼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그러나 “전 생애를 바치고 헌신하는 선교사님과 열악한 선교지를 직접 방문하면서, 선교지의 상황이 너무나 어려웠기에 현실은 보이지 않았다”는 게 선교담당 정진영 권사의 말이다.
돼지도 비쩍 마른, 바나나만 먹는 선교지… 지원 그칠 수 없다
코스타리카 원주민 선교, 박성도 선교사. 김교선 장로와 정진영 권사가 꼽은 가장 인상 깊었던 선교지와 선교사의 이름이다.
500년 전 스페인의 학살을 피하기 위해 먼 산꼭대기로 피신한 후 대대로 해발 3천 피트가 넘는 고지대에 살고 있다는 코스타리카 치리뽀 원주민들. 먹을 것이라고는 바나나뿐이고, 40이 안 돼 모두 죽기 때문에 13살이면 결혼해 아이를 낳는다.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도 갈비뼈를 훤히 드러내고 있다’는 이 곳. 가슴까지 빠지는 개울과 늪을 지나고 미끄러지는듯한 급경사 고바위를 타야만 다다르는 그야말로 ‘위험한’ 선교지다. 18년 전 원주민 사역을 위해 바위를 타고 처음 이 곳에 교회를 세운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인 박성도 선교사였고 현재 총 11개 교회를 개척했다. 모두 현지 사역자가 모두 세워져 자리를 잡았지만, 박 선교사는 “선교사는 편하면 안 된다”며 니카라과로 ‘또’ 개척을 떠났다.
코스타리카 현지 선교 사정은 열악하다. 정진영 권사는 “1500스퀘어피트 남짓의 교회는 움막을 연상케 한다”며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사진에는 대충 이어 붙인 나무들이 벽을 이루고 있고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좁은 문이 있는 한 집이 보였다. 도저히 교회라고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였다. 내부 사진을 들여다보니 얇고 길다란 나무 3그루를 세모꼴로 이어 불을 지펴 음식을 만들어 먹고 있었다. 바나나를 삶는 것이라고 했다.
김교선 장로는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선교집회에 모여든 사람들의 열정에 놀랐다고 밝히며 “치리뽀 지역을 방문했을 때 4~500명이 선교집회를 위해 모여들었다. 선조들의 ‘모여있으면 죽는다’는 사고방식을 그대로 이어받아 마을을 형성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사는 원주민들은 갓난아이를 등에 업고 10시간 이상을 걸어왔다. 급경사 바위와 늪지대를 헤치고 어린이와 오는 어른들이 마냥 신기하기만 했다”고 했다.
정 권사는 “땅바닥에 대충 비닐을 깔고 생활하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선교지를 돌아본 후, 선교지 사람들이 가엾어 돌아와 많이 울었다”고 말했다.
인생은 화살, 기독교인이라면 말씀전파에 전생애 바쳐야
왜 선교인가? 라는 질문에는 입을 모아 하나의 답이 돌아왔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사명” 때문이다.
김 장로는 “인생은 화살같이 빠른 것. 평생 청년일 것 같지만 어느새 60대 노인이 됐다는 건 나만의 고백은 아닐 것이다”라며 “짧은 생애, 기독교인이라면 이 진리를 일찍 깨닫고 하나님 생명을 전하는 일에 생애를 바쳐야 마땅하다”고 힘주어 이야기 했다.
정 권사도 동의하며 “예수님이 남기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다”면서 기도 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된 간증을 전해왔다.
코스타리카를 다녀와 “왜 저들은 입지도 못하고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못듣는 환경에 처해있어야 하나”라고 하나님께 떼를 쓰며 울부짖었다는 정 권사.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흥분 속에 기도할 그 때, 하나님은 ‘너무나’ 고요하게 임하셨다.
“울며 방방 뛰며 기도하는 데 가슴 저 밑에서부터 저를 차분하게 하는, 조용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무나 고요하게 ‘슬프냐? 가엾으냐? 그러니까 네가 전도해야지’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제가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은 더 그들을 불쌍하게 보시고, 제가 마음 아픈 것보다 주님은 더 마음이 아프시다는 생각이 겹쳐 들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어요. 그 때부터 선교에는 더 열심을 내기 시작했죠.” 이렇게 말하는 정 권사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여있었다.
“예전에는 호주머니는 든든해도 마음이 비어있으니 늘 울고 다니기 일쑤였죠.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선교로 호주머니는 가벼워졌지만 마음이 부유해서 늘 감사하며 살아요. 정말 하나님에겐 공짜가 없으십니다(웃음).”
경기 어렵지만 선교지, 선교금 오히려 늘려
가나, 태국, 파라과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푸아뉴기니, 터키, 불가리아, 이란, 멕시코, 미얀마, 이스라엘,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듣기만해도 다양한 나라의 이름들은 새한장로교회(담임 송상철 목사)가 지원하고 있는 선교지 40군데 중 일부를 나열한 것이다. 새한장로교회는 경제불황이 닥친 지난 3년 간 선교금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선교지를 매년 5군데씩 늘렸고 후원금도 올해 100불에서 150불씩으로 늘렸다. 새한장로교회의 뜨거운 선교열정의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
그 비밀을 듣기 위해 새한장로교회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바울선교사역지원단 단장 김교선 장로와 선교사역팀장 정진영 권사를 16일(목) 만났다.
“경기가 어렵지만 교인들 선교열정은 대단합니다. 올해는 선교헌금 배당금을 올리고 지원 선교지도 늘렸습니다.”
헌금의 10분의 1을 선교로 지원하는 것이 교회 창립 당시 목표였지만 현재는 선교금이 총 수입의 10%를 넘어섰다. 불경기 탓에 교회마다 20~30% 가량 헌금이 줄었고, 선교지와 후원금까지 늘린다는 것은 말만큼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그러나 “전 생애를 바치고 헌신하는 선교사님과 열악한 선교지를 직접 방문하면서, 선교지의 상황이 너무나 어려웠기에 현실은 보이지 않았다”는 게 선교담당 정진영 권사의 말이다.
돼지도 비쩍 마른, 바나나만 먹는 선교지… 지원 그칠 수 없다
코스타리카 원주민 선교, 박성도 선교사. 김교선 장로와 정진영 권사가 꼽은 가장 인상 깊었던 선교지와 선교사의 이름이다.
 |
| ▲코스타리카 치리뽀 지역 교회의 모습. 마치 움막을 연상케 하는 교회는 나무로 대충 이어 벽을 만들었고 바닥은 흙으로 되어있다. |
코스타리카 현지 선교 사정은 열악하다. 정진영 권사는 “1500스퀘어피트 남짓의 교회는 움막을 연상케 한다”며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사진에는 대충 이어 붙인 나무들이 벽을 이루고 있고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좁은 문이 있는 한 집이 보였다. 도저히 교회라고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였다. 내부 사진을 들여다보니 얇고 길다란 나무 3그루를 세모꼴로 이어 불을 지펴 음식을 만들어 먹고 있었다. 바나나를 삶는 것이라고 했다.
김교선 장로는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선교집회에 모여든 사람들의 열정에 놀랐다고 밝히며 “치리뽀 지역을 방문했을 때 4~500명이 선교집회를 위해 모여들었다. 선조들의 ‘모여있으면 죽는다’는 사고방식을 그대로 이어받아 마을을 형성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사는 원주민들은 갓난아이를 등에 업고 10시간 이상을 걸어왔다. 급경사 바위와 늪지대를 헤치고 어린이와 오는 어른들이 마냥 신기하기만 했다”고 했다.
정 권사는 “땅바닥에 대충 비닐을 깔고 생활하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선교지를 돌아본 후, 선교지 사람들이 가엾어 돌아와 많이 울었다”고 말했다.
인생은 화살, 기독교인이라면 말씀전파에 전생애 바쳐야
왜 선교인가? 라는 질문에는 입을 모아 하나의 답이 돌아왔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사명” 때문이다.
김 장로는 “인생은 화살같이 빠른 것. 평생 청년일 것 같지만 어느새 60대 노인이 됐다는 건 나만의 고백은 아닐 것이다”라며 “짧은 생애, 기독교인이라면 이 진리를 일찍 깨닫고 하나님 생명을 전하는 일에 생애를 바쳐야 마땅하다”고 힘주어 이야기 했다.
정 권사도 동의하며 “예수님이 남기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다”면서 기도 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된 간증을 전해왔다.
코스타리카를 다녀와 “왜 저들은 입지도 못하고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못듣는 환경에 처해있어야 하나”라고 하나님께 떼를 쓰며 울부짖었다는 정 권사.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흥분 속에 기도할 그 때, 하나님은 ‘너무나’ 고요하게 임하셨다.
“울며 방방 뛰며 기도하는 데 가슴 저 밑에서부터 저를 차분하게 하는, 조용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무나 고요하게 ‘슬프냐? 가엾으냐? 그러니까 네가 전도해야지’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제가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은 더 그들을 불쌍하게 보시고, 제가 마음 아픈 것보다 주님은 더 마음이 아프시다는 생각이 겹쳐 들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어요. 그 때부터 선교에는 더 열심을 내기 시작했죠.” 이렇게 말하는 정 권사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여있었다.
“예전에는 호주머니는 든든해도 마음이 비어있으니 늘 울고 다니기 일쑤였죠.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선교로 호주머니는 가벼워졌지만 마음이 부유해서 늘 감사하며 살아요. 정말 하나님에겐 공짜가 없으십니다(웃음).”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