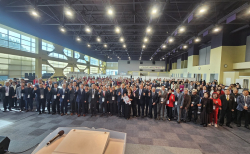한국인을 이해하려면 먼저 한국인의 한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한다. 한이 서리서리 맺혀 죽은 자의 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원귀가 되어 떠돌아다니다가 해궃이를 한다고 믿는 까닭에 한 풀이의 영매자인 무당들의 푸닥거리가 아직도 성업 중이다.
이런 미신이 종교안에도 침투하여 불교안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케톨릭이나 기독교 안에 서도 판을 치고 있다. 소위 귀신론을 다루는 대부분의 사이비들이 여기에 속한다 할 것이다. 한국인의 한의 정서를 절묘하게 아니 교묘하게 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겠다. 한 맺힘을 교묘하게 성경에 대입하여 연약한 영혼들을 미혹해 교세확장에 열을 올리는 자들을 수수방관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워낙 한 맺혀 한풀이 하고자 하는 수요자들이 많은 까닭이다.
그런데 이 한 맺힘의 정서는 매우 소극적인 미가 담겨 있다. 한이 주렁주렁 맺혀 있지만 그것을 내면으로만 삭이는 까닭에 오장육부가 다 썩어 문들 어 져도 참고 또 참는다. 그래서일까? 한국인들은 위암과 장암에 걸리는 확률이 높다. 고작 생전에 한 맺힘을 풀이 하는 것은 막거리 한사발에 젓가락 장단으로 "한 많은 이 세상 야속한 님아/정을 주고 몸만 가니 눈물이 나네." 하는 한 오백년을 부르던가 아니면 맵고 짠 시집살이를 통박하듯 며느리가 시댁 바가지를 박살내거나 탈바가지를 쓰고 양반님네들을 꾸짖는 해학 정도가 고작이었다.
서양인의 한은 복수를 함으로써 풀어지는 데 반해 한국인의 한은 이와 같이 생전의 복수보다는 타인의 손을 빌어 하는 사후 한 풀이가 고작이다. 한국동란 이후 교회는 이러한 한 맺힘을 이해하고 다독이는 데 성공하였다. 특히나 3.8 이북을 고향으로 둔 피난민들이 흘린 홍수 같은 눈물을 받아 준 것은 교회의 마루바닥이었다. 가난하고 지친 사람들의 포근한 안식처는 낙수 물 소리가 또록또록 떨어지는 가난한 양철지붕 교회였으며, 그럴듯한 종탑을 세울 수 없어 교회 추녀에 걸려 목 메인 쇳소리 같은 포탄 피 종소리였으며, 펄 펄 날리는 눈을 맞으며 들어선 교회당안에 피어 놓은 톱밥난로였다. 그런데 이제 의식주가 해결된 이즈음에도 여전히 한들은 더 많이 쌓여있고 맺혀있다. 그러나 교회는 이 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답을 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한 맺힘은 악 바침으로 나가고 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한을 고이 마음에 맺혀 두려는 사람들은 없다. 대신 악다구니의 함성들로 가득 차있다. 목소리 큰 자가 왕이다 하는 식으로 현장 해결사들이 대부분이다. 부끄럽게도 상욕이 난무하여도 폭력이 행사되어도 패거리 악다구니로 합창을 이루어도 아무도 놀래지 않는 때가 되었다. 하소연이나 한탄이나 한 줄기 눈물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라 패자의 힘없는 몸짓에 불과하게 되었다. 이제 악이 턱에 바친 사나운 심령들을 차라리 한 맺힌 체로 살라 할 수는 없을 까?
이런 미신이 종교안에도 침투하여 불교안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케톨릭이나 기독교 안에 서도 판을 치고 있다. 소위 귀신론을 다루는 대부분의 사이비들이 여기에 속한다 할 것이다. 한국인의 한의 정서를 절묘하게 아니 교묘하게 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겠다. 한 맺힘을 교묘하게 성경에 대입하여 연약한 영혼들을 미혹해 교세확장에 열을 올리는 자들을 수수방관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워낙 한 맺혀 한풀이 하고자 하는 수요자들이 많은 까닭이다.
그런데 이 한 맺힘의 정서는 매우 소극적인 미가 담겨 있다. 한이 주렁주렁 맺혀 있지만 그것을 내면으로만 삭이는 까닭에 오장육부가 다 썩어 문들 어 져도 참고 또 참는다. 그래서일까? 한국인들은 위암과 장암에 걸리는 확률이 높다. 고작 생전에 한 맺힘을 풀이 하는 것은 막거리 한사발에 젓가락 장단으로 "한 많은 이 세상 야속한 님아/정을 주고 몸만 가니 눈물이 나네." 하는 한 오백년을 부르던가 아니면 맵고 짠 시집살이를 통박하듯 며느리가 시댁 바가지를 박살내거나 탈바가지를 쓰고 양반님네들을 꾸짖는 해학 정도가 고작이었다.
서양인의 한은 복수를 함으로써 풀어지는 데 반해 한국인의 한은 이와 같이 생전의 복수보다는 타인의 손을 빌어 하는 사후 한 풀이가 고작이다. 한국동란 이후 교회는 이러한 한 맺힘을 이해하고 다독이는 데 성공하였다. 특히나 3.8 이북을 고향으로 둔 피난민들이 흘린 홍수 같은 눈물을 받아 준 것은 교회의 마루바닥이었다. 가난하고 지친 사람들의 포근한 안식처는 낙수 물 소리가 또록또록 떨어지는 가난한 양철지붕 교회였으며, 그럴듯한 종탑을 세울 수 없어 교회 추녀에 걸려 목 메인 쇳소리 같은 포탄 피 종소리였으며, 펄 펄 날리는 눈을 맞으며 들어선 교회당안에 피어 놓은 톱밥난로였다. 그런데 이제 의식주가 해결된 이즈음에도 여전히 한들은 더 많이 쌓여있고 맺혀있다. 그러나 교회는 이 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답을 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한 맺힘은 악 바침으로 나가고 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한을 고이 마음에 맺혀 두려는 사람들은 없다. 대신 악다구니의 함성들로 가득 차있다. 목소리 큰 자가 왕이다 하는 식으로 현장 해결사들이 대부분이다. 부끄럽게도 상욕이 난무하여도 폭력이 행사되어도 패거리 악다구니로 합창을 이루어도 아무도 놀래지 않는 때가 되었다. 하소연이나 한탄이나 한 줄기 눈물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라 패자의 힘없는 몸짓에 불과하게 되었다. 이제 악이 턱에 바친 사나운 심령들을 차라리 한 맺힌 체로 살라 할 수는 없을 까?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