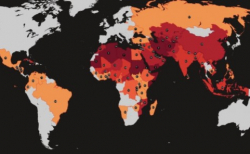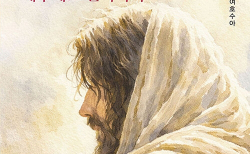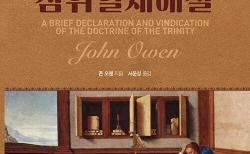| |
| ▲주일을 바쁘게 보낸 목회자들이 쉴 수 있는 월요일 오후, 시카고목사부부합창단 소속 단원들이 바쁘게 향한 곳은 바로 페어몬트 양로원이었다. ⓒ 김준형 기자 | |
월요일의 목회자는 평범 그 자체, 목사의 변신은 무죄다
8일 저녁 6시 20분 페어몬트 양로원에는 이미 몇몇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서로를 ‘형님’, ‘동생’ 부르는 사람도 있고, 바나나와 감을 들고 나르는 사람도 있었다. 급하게 식사 중인 사람도 있었고 양로원 간병인과 이런 저런 대화를 격의없이 나누는 사람도 많았다. “어라. 김 기자 왔어?” 이경희 목사님이시다. 다시 보니 짐나르는 사람도, 연습하는 사람도 다 목사님, 사모님이었다. 매주 모인다는 그들은 지난 주에도 만나 양로원 공연을 펼쳤다고 하는데 뭐가 그리 반가운지 서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목사님들끼리, 사모님들끼리 있으니 이런 저런 이야기도 하고 힘든 것도 털어 놓고 조금은 썰렁한 농담도 나눈다. “목사님도 이런 모습이 있네요”라는 말에 “에이, 목사도 사람이야”라고 누군가 답해 왔다.
7시 공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 식사 중인 간병인 아주머니들 옆에 앉았다. 목사님들에게 물어 봐야 “목사부부합창단이 좋다”는 말 외에 들을 말이 없을 것 같아서였다. 빨간 비빔밥을 만들어 드시던 간병인 나오미 리 씨가 “목사님들이 매년 저렇게 오셔서 우리 양로원에서 공연해 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애처럼 좋아해요. (이 양로원을 매년 방문하기 시작한지) 5년 넘었지 아마”라며 말을 시작했다. “목사님들이 실력은 좀 어떠세요?” 간병인 이현복 씨는 “잘하시죠. 얼마 전에 한국 갔을 때는 청와대에서 공연도 했다두만요. 역시 장로 대통령이 되니까”라고 말을 거들었다. 합창단에서 기타를 맡고 있는 신정철 목사님에게 나중에 확인해 보니 청와대는 아니고 국가조찬기도회 때 대통령 앞에서 공연했고, 국회에서도 공연했다고 한다. 여튼 후배 기자가 전해준 대로 목사부부합창단의 명성은 인정할 만했다.
“여기 할머니들이 공연하는 분들이 목사님, 사모님인거 아세요?”라고 물어 보니 “알다마다. 그래서 공연하다 기도도 받고 그러는데 아주 좋아해”라고 누군가 말했다. “아, 양로원에 기독교인이 많으신가 보네요.” “많다고? 늙으면 의지할 곳이 없는데…. 하나님말고 의지할 데가 없어. 다 믿게 되지.” 오늘 공연을 관람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평균연령은 85세, 최고령은 103세였다.
 | |
| ▲애잔한 하모니카 연주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노래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감동적으로 그려냈다. ⓒ 김준형 기자 | |
6시 57분, 양로원 소강당에는 벌써 30여 명이 모여 공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공연이 시작되자 목사님, 사모님들은 음악인으로 변신했다. 전문적으로 음악을 공부한 사람부터 아마추어까지 다양한 이들로 구성됐지만 음악을 연주하는 그들을 다들 수준급이었다. 잔잔한 하모니카 연주와 찬양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아멘’을 연발시켰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같은 찬양엔 장구까지 동원됐다. 뒤에서 “얼쑤” 소리가 나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애잔한 하모니카로 울리자 뜨겁던 분위기는 순간 잔잔해지며 급반전됐다. 파란색으로 곱게 차려입은 사모님들의 노래, 턱시도를 입은 목사님들의 찬송은 전문가도 경탄할만큼 수준급이었다.
목사의 또 다른 변신, 어쩔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좋아서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기 오셨고 여러분이 우리의 노래를 믿음으로 듣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역시 목회자는 본업은 못 버리나 보다. 노래를 불러도 찬송가가 더 힘차게 나오고 노래 중간중간에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저들의 모습을 볼 때, 월요일에 만나도, 아무리 음악을 잘해도 목회자는 목회자인 모양이다. 순서 중간에는 이경희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도 전하고 함께 기도하기도 했다.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마무리일 것이다. 그들에게 음악만이 아니라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끝까지 붙들게 하는 것은 바로 목회자란 직업, 아니 사명일 것이다.
 | |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목사님, 사모님들 앞에선 아멘과 박수에 열심일 수 밖에 없었나 보다. 목사님, 사모님들은 이 시대의 아들과 딸로 다시 변신한다. ⓒ김준형 기자 | |
공연이 끝난 후, 기도하고 모임을 정리하는 목사님, 사모님들. 그들에겐 어머니 아버지뻘되는 어른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다는, 좀더 한국적으로 말하면 ‘효’를 했다는 기쁨이 얼굴에 넘쳤다. 머나먼 타국에서 고달픈 이민 목회자로 살아가는, 또 이민 목회자의 사모로 살아가는 저들의 모습은 이민자의 아들, 딸이며 또 이민자의 어머니 아버지로서 함께 울고 웃을 수 밖에 없는 이 시대의 아름다운 기록물과 같다. 목사님, 사모님 파이팅!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