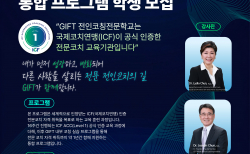가끔 새벽에 하늘을 올려다보면, 어둠 속에서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동쪽 하늘, 하루를 여는 그 별이 바로 금성(Venus)이다. 예부터 사람들은 이 별을 ‘계명성’이라 부르기도 했고, ‘샛별’이나 ‘새벽별’이라고 불렀다. 라틴어로는 Lucifer, 그러니까 ‘빛을 가져오는 자’라는 뜻이다.
이 하나의 금성이 성경에서는 두 얼굴로 등장한다.
한쪽에서는 타락한 자의 상징, 다른 쪽에서는 구속의 빛, 예수님의 상징으로. 같은 별인데, 왜 이렇게 정반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
계명성, 빛나던 자의 추락
먼저 이사야 14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온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계명성, 곧 샛별은 원래 밤이 끝나고 아침이 오기 직전 가장 마지막까지 하늘에 남아 있는 별이다. 어찌 보면 밤하늘의 왕처럼 빛나던 존재였다. 이사야서는 그 찬란한 존재가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말한다.
이 말씀은 전통적으로 루시퍼, 즉 사탄을 가리키는 구절로 해석돼 왔다.
한때 천사장이었던 그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다, 오히려 심판을 받고 땅에 떨어진 것이다. 빛을 머금고 있었지만, 결국 그 빛이 자기 자신을 비추기 위해 쓰였기에 어두움에 빠지게 되었다.
광명한 새벽별, 진짜 빛의 등장
반면에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놀랍게도, 예수님도 똑같이 ‘샛별’, 금성을 빗대어 자신을 설명하신다. 하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 예수님은 어둠의 끝에서 참된 새벽을 여는 빛,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는 진짜 아침의 별이시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나온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건 단순히 외적인 천체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마음 속에 빛으로 임하신다는 의미이다.
그 빛은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는 빛, 다시 말해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비추는 빛이다.
같은 금성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아니, 똑같은 금성인데 왜 어떤 데선 루시퍼, 또 어떤 데선 예수님이 나오는 거지?”
그 차이는 바로 ‘무엇을 비추는가’에 있다. 루시퍼는 자기 자신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비췄다.
빛은 언제나 아름다워 보인다. 하지만 그 빛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그건 결국 가짜 빛이 된다. 반대로, 그 빛이 진리와 생명을 비추기 위한 것이라면, 그건 구원의 빛이 되는 것이다.
양자의 중첩처럼, 우리 안에도 두 가능성이 있다
양자역학에서는 ‘중첩(superposition)’이라는 개념이 있다.
하나의 입자가 두 가지 상태(예를 들어 파동과 입자, 0과 1)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게 사실 우리 인간의 상태에도 비슷하게 적용된다.
우리도 그렇다. 루시퍼처럼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비추고 싶은 믿음 — 두 가지가 우리 안에 공존한다.
말 잘하는 재능, 영향력, 자원… 이 모든 것이 자기 영광을 위해 쓰이면 계명성의 길,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이면 광명한 새벽별의 길이 되는 것이다.
진짜 샛별을 따르자
결국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
“나는 어떤 빛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비추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12)
우리 안에도 두 별이 떠오른다.
하나는 자기 영광을 꿈꾸는 샛별,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비추는 광명한 새벽별.
우리가 어떤 별을 따를지는 오직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외형은 같지만, 그 빛의 방향이 달라지면 정체성도 완전히 바뀌게 된다.
같은 금성, 같은 빛처럼 보이지만 하나는 스스로를 위한 빛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을 위한 빛 즉, 우리가 따라야 할 빛이다.
오늘도 참된 광명한 새벽별, 우리 주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는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