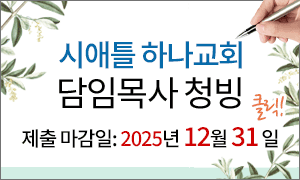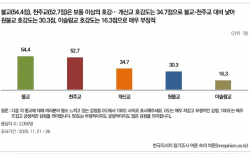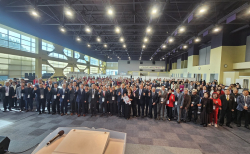첫째를 낳고 제 마음에 들었던 가장 큰 감정은 걱정이었던 같습니다. 처음 아이를 키우니 모든 것이 낯설어 아빠로서 걱정이 먼저 든 것입니다.
첫 아이를 병원에서 낳고 집으로 데려왔는데 목욕시켜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물을 떠 놓고 한참을 망설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둘째, 셋째, 넷째를 낳으니까 아이 키우는 게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몇 살쯤 되면 뭐가 필요한지 선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막내를 보면 걱정보단 일단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감정이 듭니다.
대학생인 첫째와 비교하면 작은 5살 늦둥이 막내는 손자 같기도 합니다. 이번에 유치원에 처음 들어갔는데 작은 체구에 큰 책가방을 메고 뒤뚱거리며 형 손을 잡고 학교에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 괜히 뭉클하고 같이 따라 들어가고 싶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면 영어를 아직 잘 못 하니까 웃으면서 비밀이라고 넘깁니다.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가냘프고 불안합니다. 뭘 해도 부모나 형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제 태어난 지 5년밖에 안 되었는데 무엇인들 하나 온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연약함이 아비인 제게는 큰 기쁨을 줍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님도 내 연약함을 보고 이렇게 기뻐하실까? 나는 내 연약함이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은 내 연약함도 아실 뿐 아니라, 보시면서도 나처럼 뭉클해 하실까? 제 귓가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생각납니다.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은 품에 안고 돌아오시는 아버지의 모습, 못된 동생을 더 챙긴다고 뿔이 난 첫째를 토닥이며 함께 밥 먹자고 타일러서 잔치로 데려가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우리 연약함에 분노하지 않으시고, 여유 있는 모습으로 다독이시며 아니 오히려 그런 연약함을 보며 막내의 실수를 흐뭇하게 바라보는 아비들의 미소처럼 우리를 바라보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아버지가 계셔 오늘도 힘이 나고 소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