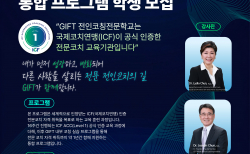세상의 마지막 밤

C. S. 루이스 | 홍성사 | 152쪽 | 12,000원
홍성사 출간 C. S. 루이스 정본 클래식 스무 번째 시리즈인 <세상의 마지막 밤>에는, 그가 곳곳에 기고했던 에세이 일곱 편이 담겨 있다.
'기도의 효력', '믿음의 고집에 대하여', '세상의 마지막 밤' 등 세 편의 작품은 기독교에 관한 글이며, 나머지 네 편인 '썩은 백합', '스크루테이프, 축배를 제안하다', '선한 일과 선행', '종교와 우주 개발'에는 교육과 문화, 노동과 과학에 대한 비평적 내용이 담겨 있다. 글 곳곳에서 그의 '전공'인 영문학자로서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나 <고통의 문제> 등 잘 알려진 많은 저술에서 그러했듯 이 작품에서도 좀처럼 '신학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대 그리스도인들이나 무신론자들이 의문을 갖거나 관심을 가진 주제들에 대해, 어떤 신학자보다 날카롭게 변증하고 있다.
이 같은 통찰력은 매일의 삶에서 사고하고 공부하고 느끼고 겪고 헤쳐나온 일들이 그의 글감과 주제가 되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그는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나 고정관념들에 반기를 들고, 다시 바라보고 끝까지 추적하여 역설과 반전의 메시지를 이끌어낸다. '완고한 무신론자'로서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의심하다 '맥빠진 회심'에 다다랐기에 나오는 사유일지도 모르겠다.
그는 '기도의 효력'에서 '기도의 효력이 있는가?'라는 질문 자체의 함정과 그 대안에 대해 살펴본다. 기도한 대로 일이 이뤄질 수 있지만 애초 그렇게 될 일이었을 수 있고, 그 일이 명백한 기적이라 해도 기도 때문이라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없다. 기도가 어김없이 '성공'을 거둔다 해도, 그것으로 기독교 교리가 입증되지 않는다.
'기도의 효력을 입증하기 위한 실험'은 그 자체로 난센스다. "그런 조건에서 어떻게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겠느냐"는 것. 그것은 기도가 아니고, 이 실험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다. 결국 우리가 과학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경험적 증거는 결코 얻을 수 없다. 기도는 마법이나 명령, 기계 장치나 하나님께 드리는 조언이 아닌 "요청"이기 때문이다.
기도는 미숙하고 불완전한 인격체들과 더없이 구체적인 인격자와의 인격적 접촉이다. 기도의 성격은 무엇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외침에서 잘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는데, 다른 누구도 아닌 그 사람이 가장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전혀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피조물들에게 위임할 수 있는 일을 절대 혼자서 처리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친히,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 느릿느릿 어설프게 하게 하십니다. ... 우리는 그저 받기만 하는 자 또는 구경만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경기에 참가할 특권을 받은 자, 그 안에서 협력하여 '작은 삼지창을 휘둘러야 하는' 자입니다."
'믿음의 고집에 대하여'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불신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의 생각처럼 아무런 증거나 확신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결과물이냐에 대해 따져본다. 영국의 시인이자 성직자였던 존 던의 시 첫 행에서 제목을 따 온 '세상의 마지막 밤'에서는 재림(再臨) 또는 종말의 교리가 두려움이나 이 생의 삶에 대한 포기로 귀결되는 게 아닌,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표출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논증하고 있다. 나머지 네 작품에서도 루이스는 그만의 독특한 역설의 세계를 펼쳐놓고 있다.
삶과는 다소 동떨어져 있지만 전문적인 영역들을 연구하고 발표하는 신학자들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21세기 이 땅의 언어로 성경적이면서도 어렵지 않게 신앙과 이 세계와 우리의 삶에 대해 유쾌하게 풀어놓을 수 있는 '한국의 C. S. 루이스'가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