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 집안에서 누나와 함께 가톨릭으로 개종(?)하는 등 '에큐메니칼하게' 살아왔다는 김 교수는, 이 책에서 개신교와 가톨릭의 교조주의·근본주의적이고 지나치게 성직자 중심적인 부분을 비판하고 있다. '복음서 제대로 읽기'를 통해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헤아리고 이해하며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작가는 '복음서 제대로 읽기'에 대해 "교회가 공허한 이념은 있지만, 그 실천 방식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는 것 같다"며 "신자들 스스로가 정말 복음서를 읽고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 저 성경을 읽고 교회에 들어온 후의 나와 예전의 나가 다르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말로만 영생을 믿고 구원을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했다.
그가 제안한 복음서 읽기 방식은 '텍스트(text)로서의 복음서'가 아니라, '컨텍스트(context)로서의 복음서'를 어떻게 읽어낼 것인가, 즉 '어떻게 내면화시키고 실천할 것인가'로 모아진다. 예수의 초월성을 부정하진 않지만, 예수의 인간적인 면모를 함께 보면서 '실천적 모범으로서 예수의 삶'을 읽어내자는 것.
"실제 삶으로 보여주시면서 '팔로잉'하라고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굳이 이 땅에까지 내려오실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성찰이 신앙인인 나, 그리고 내가 속한 교회에서 얼마나 깊이 이뤄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 탄생' 사건에서 우리는 대부분 예수와 동정녀 마리아, 동방박사와 목동들 같은 이야기만 보는데, 실제로 우리의 모습은 마리아가 예수를 낳던 여관방에 있었던 사람들과 같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분명 투숙객들 모두 '그 임산부'를 문을 열고서 목격하지 않았을까요? 누구든 '이리 들어오세요'라고 했어야 했는데, 누구도 자신의 방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는데 한밤중이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저 멀리서 동방박사가 왔는데도 그 누가 문을 열어봤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저는 '그게 나였구나'라는 걸 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단추가 잘못 꿰어지니, 예수님의 행적에서 항상 거울로서의 내 모습, '내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가 빠지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의 말씀을 회복하고, 나가서 다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의 역할이자 교회의 역할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측면으로만 봐서도 피곤하겠지만, 예수 믿고 복 받고 천국 간다는 것 말고 이런 측면으로는 거의 보지 않아요. 공동체적 연대성에 대한 복음서의 해석과 이해가 좀더 커져야 합니다. 가톨릭과 개신교가 합치면 1천만명은 될텐데, 세상이 이렇게까지 무례하고 황폐하고 비인격화된 것은 한쪽으로만 성경을 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듯 '악한 세상'이 교회에는 은총일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세상 기업이 마음대로 해고하고 노조활동했다고 해고한다고 해서 '왜 그러느냐?'고 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교회가 하는 학교나 병원에서는 이것이 가능할 수 있지요. 이왕이면 도덕적이고 상생할 수 있는, 복음의 실천을 통해 모범을 보일 기회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는 이유도, 정말 낮은 곳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모범을 보이던 모습이 적어졌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비판'을 당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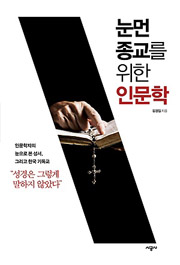
현재 교회 관련 비판 서적들은 그야말로 '포화 상태'임에도 '또 하나의 책'을 쓴 이유에 대해서는 "세습이니 대형교회 문제니 그런 제도나 구조를 백날 이야기해서 바뀌는 게 아니다"며 "진정 변화가 일어나려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 사람들이 스스로 변해야 하는데, 이는 신학적인 교리나 설교가 아니라 예수를 접하고 성경을 읽어서 내 삶이 어떻게 변하고 그래서 이 공동체가 얼마나 복음에 가까운지 고민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 책이 비판적으로 보인다면, 자꾸 다른 눈으로 분석하려 하고 교조적으로 컨트롤하려 하니 그런 것"이라고도 했다.
가톨릭 신도의 입장에서 개신교에 대한 바람도 전했다. "어딜 가든지 가톨릭은 보수적이고 교조적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더 보수적이고 교조적으로 변해서 가톨릭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것처럼 보인다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 경우처럼 우리나라 천주교가 돈 문제나 성 추문이 크게 연루된 적이 없긴 합니다. 이는 개신교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지요. '프로테스탄트', 진짜 민주적이고 개혁적이어야 할 사람들이 반대에 있다는 점은 좀 고민을 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책 속에 '인문학'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인문학을 단순히 19세기적 카테고리인 '문사철(文·史·哲)'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 대한 모든 성찰이 담겨져 있는 학문'이라 정의한다"며 "제가 책을 쓴 가장 큰 목적은 신학과 이론을 빼고, 예수께서 가장 쉬운 언어로 이야기하고 가장 질박한 방식으로 모범을 보인 그 자체를 보자는 것"이라고 응답했다. 모든 이설(理說)을 빼고, 성경을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로 순수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성경 읽기'를 추구한다는 말이었다.
"감히 '인문학'이라는 단어에 동의한 이유는, 복음서를 교조적 입장에서 따라 읽는 게 아니라, 예수가 사람인 내게 복음을 던지면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지' 하는 관점입니다. 사실 거창하게 인문학이라기보단, 복음서에 대한 실천적 해석학 쯤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