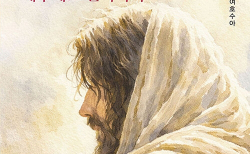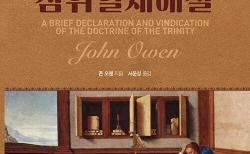(뉴욕=연합뉴스) 자동차 회사의 세일즈 매니저인 존 브룩스는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버락 오바마 당시 민주당 후보를 찍었다. 스스로 부동층이라 여겼던 그는 미국의 정치를 확 바꾸겠다는 오바마의 약속에 설득당했다고 회고한다. 이번 대선에서도 누구에게 표를 줄지 결정하지 못하는 그가 최근 다시 오바마 쪽으로 기울었다.
밋 롬니 공화당 대선 후보가 강경 보수파로 지목되는 폴 라이언 하원의원(42.위스콘신)을 부통령 후보로 낙점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한다. 그는 "최근까지만 해도 롬니를 진정한 중도파로 여겨 한표를 행사를 생각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라이언 의원을 선택한 것이 내 결정을 쉽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16일(현지시간) 브룩스의 사례를 들면서 롬니 후보가 라이언 의원을 러닝메이트로 지명한 이후 미국 대선전의 핵심 쟁점이 경제에서 이념으로 옮겨가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롬니는 라이언을 선택함으로써 생기가 없던 공화당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롬니 캠프에는 새로운 열정이 생겼고 유세장에는 더 많은 지지자가 몰린다. 하지만 브룩스와 같은 소극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이 확실하게 돌아서는 역효과도 몰고 왔다. 라이언의 긴축예산과 부자감세 정책이 롬니에 다소 호감을 보이던 사람들에게 정신이 번쩍 들도록 만들었다.
브룩스는 "롬니와 (라이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조합이었다면 `드림 팀'이 됐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롬니는 라이언을 낙점한 이후 정책이나 비전보다 `오바마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자신이 준비된 경제 대통령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부동층 흡수에 노력하는 대신 오바마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쏟아내면서 `반(反) 오바마 연대' 구축에만 열을 올리는 것이다.
선거 전략에 미묘하면서도 광범위한 수정이 가해졌음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쟁점을 흩트리지 않고 경제와 특히 일자리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이번 대선의 필승 전략이라고 보는 다수의 공화당 의원들은 이에 우려를 표시하기도 한다.
오바마 역시 `눈에는 눈' 전략으로 맞서는 모양새다.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부동층 공략보다는 `집토끼'를 지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양당 전문가들은 기존 대선전에서는 부동층 유권자와 열혈 지지자들을 모두 끌어안기 위한 절묘한 균형이 맞춰졌지만 이번에는 그런 원칙이 지켜지지 힘들 것으로 예상한다.
부동층이 승패를 결정지을 정도의 규모가 되지 못하는데다 선거 전략이 어떤 식으로 가더라도 말 그대로 무당파이기 때문에 결국 어느 쪽으로 붙을지 모른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경합주 6곳에서 실시된 일련의 여론조사에서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가 5%에 불과했다는 결과가 나온 것은 그런 판단이 나름대로 설득력을 가진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들 조사에서는 대선일 이전에 지지 후보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는 대답도 10%에 그쳤다. 4년 전 이맘때에는 4명중 1명 꼴로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