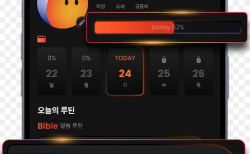나는 지금 이 칼럼을 캅 카운티에 있는 한 공공 도서관에서 쓰고 있다. 가끔 집에서 공부가 안될 때는 공공 도서관에 가면 집중이 잘될때가 있다.
특별히 내가 찾은 이 도서관은 최근 새로 개조한 곳으로 실내도 넓을 뿐 더러 시설이 정말로 깨끗하고 책상이라든지 컴퓨터들도 모두 새것이어서 공부할 맛을 더욱 부추긴다. 이런데 와서 공부 안된다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것이다.
언제나 이곳에 들를때 마다 내가 그 비싼 재산세를 내긴 잘 내었구나 하는 일종의 만족감을 느낀다. 그런가 하면 도서관을 한 번도 찾지않지만 재산세를 꾸준히 내는 사람들은 지역 사회에 자신이 커다란 공헌을 하고 있다는 만족감을 갖기 바란다. 왜냐하면 나와 같은 사람들을 도와서 이런 칼럼이라도 읽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사실 공공 도서관의 중요성을 인식한 사람들은 옛날에도 많았다. 하지만 정부가 일일이 필요한 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 여유가 없었기에 도서관의 건립은 옛날에는 종종 자선 사업가들의 몫이었다.
그 중에서 미국에서 가장 많은 도서관을 지어준 사람이 바로 카네기이다.카네기는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라 자수성가했지만 본인은 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런 아쉬움 때문인지는 몰라도 자신이 사업에 성공한 이후 많은 돈을 도서관 설립에 바쳤다.
전부 3천개의 도서관을 미국, 영국, 그리고 캐나다에 세웠다. 왜 카네기는 하필 도서관 짓기에 집중했을까? 답은 바로 그의 소위 “과학적 자선 (Scientific Philanthropy)”에 있다. 즉, 못사는 사람에게 필요할 때 마다 푼돈을 조금씩 쥐어줘봐야 이 사람들은 평생 그 가난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능력을 키우게 하면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그리하면 더 좋은 생활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된다는 개념이다. 바로 가난이나 빈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이다.
카네기의 아이디어는 그 뒤 많은 자선사업가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특히 빌 케이츠 재단의 짜임새있는 자선 사업은 눈여겨 볼 만하다.
이 재단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약 34억달러의 기금을 바탕으로 건강, 교육, 개발에 대한 근본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 남미에 있는 후진 지역사회를 상대로 말라리아 퇴치, 깨끗한 물 공급, 학교 건립, 교육 기자재 및 시설 지원, 도서관 건립 등이다. 만약 이들 후진 지역이 미래에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재단의 덕분일 것이다.
자선 사업은 이래서 중요한 것이다. 예산에 여유가 없을 때 정부는 사회가 아무리 필요한 것이라도 제공해 줄 수 없다. 더구나 미국 같은 사회는 보수적인 정치적 사상 때문에 늘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
어지간한 것은 민간 시민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정부는 치안과 같은 아주 공적인 일만 처리하면 된다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은 더 많은 민간의 활동, 즉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적극적 자선이 더욱 필요한 곳이다.
자선 활동은 꼭 돈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유는 시간이고, 어떤 사람에게 여유는 그들의 남다른 능력이나 기술이며, 어떤 사람에게 여유는 경험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 여유는 열정이기도 하다. 이런 여유들이 모여 우리 사회를 더욱 아름답고 윤택하게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만약 카네기가 도서관을 지어놓고 책까지 넣어주었지만 아무 발렌티어(Volunteer, 자원봉사자)도 오지않았다면 그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었을까? 사실 카네기의 큰 돈도 중요했지만 수많은 개미와 같은 발렌티어들의 시간과 열정없이는 카네기의 헌신이 빛나지 않았을 것이다.
나 자신에 대한 책망이기도 하지만 사실 미국에 와 있는 많은 우리 교포들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다.
미국에 온 지 이제 20년, 30년이 넘어 삶의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지만 지역 사회와 자신의 관계를 제대로 만들지 못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다. 쉽게 말해 지역사회를 둘러볼 때 나의 삶에 대한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이 지역 사회와는 상관이 없는 외톨이처럼 느껴지는 소외감이다. 영어의 한계도 문제가 안된다. 왜냐하면 영어가 필요없는 일도 무수히 많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 도서관에도 여러 명의 발렌티어가 있다. 정식 월급을 받는 사람은 단지 매니저 밖에 없다. 그나마 최근 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어쩌면 전원 발렌티어로 채워야할 지 모르는 실정이다. 어떤 발렌티어는 영어도 서툴러보인다. 하지만 그들은 부족한 영어를 밝은 미소로 충분히 만회하고 있다.
나는 이런 발렌티어가 더 마음에 든다. 자기도 부족하지만 남을 돕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발렌티어가 또 웃는다.
출처=케이아메리칸 포스트
특별히 내가 찾은 이 도서관은 최근 새로 개조한 곳으로 실내도 넓을 뿐 더러 시설이 정말로 깨끗하고 책상이라든지 컴퓨터들도 모두 새것이어서 공부할 맛을 더욱 부추긴다. 이런데 와서 공부 안된다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것이다.
언제나 이곳에 들를때 마다 내가 그 비싼 재산세를 내긴 잘 내었구나 하는 일종의 만족감을 느낀다. 그런가 하면 도서관을 한 번도 찾지않지만 재산세를 꾸준히 내는 사람들은 지역 사회에 자신이 커다란 공헌을 하고 있다는 만족감을 갖기 바란다. 왜냐하면 나와 같은 사람들을 도와서 이런 칼럼이라도 읽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사실 공공 도서관의 중요성을 인식한 사람들은 옛날에도 많았다. 하지만 정부가 일일이 필요한 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 여유가 없었기에 도서관의 건립은 옛날에는 종종 자선 사업가들의 몫이었다.
그 중에서 미국에서 가장 많은 도서관을 지어준 사람이 바로 카네기이다.카네기는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라 자수성가했지만 본인은 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런 아쉬움 때문인지는 몰라도 자신이 사업에 성공한 이후 많은 돈을 도서관 설립에 바쳤다.
전부 3천개의 도서관을 미국, 영국, 그리고 캐나다에 세웠다. 왜 카네기는 하필 도서관 짓기에 집중했을까? 답은 바로 그의 소위 “과학적 자선 (Scientific Philanthropy)”에 있다. 즉, 못사는 사람에게 필요할 때 마다 푼돈을 조금씩 쥐어줘봐야 이 사람들은 평생 그 가난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능력을 키우게 하면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그리하면 더 좋은 생활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된다는 개념이다. 바로 가난이나 빈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이다.
카네기의 아이디어는 그 뒤 많은 자선사업가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특히 빌 케이츠 재단의 짜임새있는 자선 사업은 눈여겨 볼 만하다.
이 재단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약 34억달러의 기금을 바탕으로 건강, 교육, 개발에 대한 근본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 남미에 있는 후진 지역사회를 상대로 말라리아 퇴치, 깨끗한 물 공급, 학교 건립, 교육 기자재 및 시설 지원, 도서관 건립 등이다. 만약 이들 후진 지역이 미래에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재단의 덕분일 것이다.
자선 사업은 이래서 중요한 것이다. 예산에 여유가 없을 때 정부는 사회가 아무리 필요한 것이라도 제공해 줄 수 없다. 더구나 미국 같은 사회는 보수적인 정치적 사상 때문에 늘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
어지간한 것은 민간 시민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정부는 치안과 같은 아주 공적인 일만 처리하면 된다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은 더 많은 민간의 활동, 즉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적극적 자선이 더욱 필요한 곳이다.
자선 활동은 꼭 돈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유는 시간이고, 어떤 사람에게 여유는 그들의 남다른 능력이나 기술이며, 어떤 사람에게 여유는 경험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 여유는 열정이기도 하다. 이런 여유들이 모여 우리 사회를 더욱 아름답고 윤택하게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만약 카네기가 도서관을 지어놓고 책까지 넣어주었지만 아무 발렌티어(Volunteer, 자원봉사자)도 오지않았다면 그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었을까? 사실 카네기의 큰 돈도 중요했지만 수많은 개미와 같은 발렌티어들의 시간과 열정없이는 카네기의 헌신이 빛나지 않았을 것이다.
나 자신에 대한 책망이기도 하지만 사실 미국에 와 있는 많은 우리 교포들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다.
미국에 온 지 이제 20년, 30년이 넘어 삶의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지만 지역 사회와 자신의 관계를 제대로 만들지 못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다. 쉽게 말해 지역사회를 둘러볼 때 나의 삶에 대한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이 지역 사회와는 상관이 없는 외톨이처럼 느껴지는 소외감이다. 영어의 한계도 문제가 안된다. 왜냐하면 영어가 필요없는 일도 무수히 많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 도서관에도 여러 명의 발렌티어가 있다. 정식 월급을 받는 사람은 단지 매니저 밖에 없다. 그나마 최근 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어쩌면 전원 발렌티어로 채워야할 지 모르는 실정이다. 어떤 발렌티어는 영어도 서툴러보인다. 하지만 그들은 부족한 영어를 밝은 미소로 충분히 만회하고 있다.
나는 이런 발렌티어가 더 마음에 든다. 자기도 부족하지만 남을 돕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발렌티어가 또 웃는다.
출처=케이아메리칸 포스트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