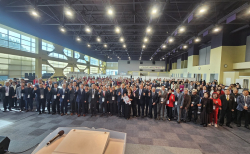2008년이란 시대의 열차는 긴 기적음을 내고 영원한 과거속으로 달려가고 있다. 무자(戊子)년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한 해를 보내고 나면 또 한 해를 맞이할 것이지만 연말은 늘 헛헛한 심정이 되어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게 된다. 키케로가 탄식했다던 '오 세월이여! 오 풍속이여!(O tempora! O mores!)'을 되뇌이지 않는다 하여도 세월의 덧없음과 무의미했음에 대한 자책이 없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이럴 때는 시인 아폴리네르의 시심(詩心)을 빌리는 것이 제격일 것이다.
“ 미라보 다리 아래 세느강은 흐르고 우리네 사랑도 흘러 내린다. 내 마음 속에 깊이 아로새기리라, 기쁨은 언제나 괴로움에 이어옴을. 밤이여 오라 종아 울려라. 세월은 가고 나는 머문다. 손에 손을 맞잡고 얼굴을 마주 보면 우리네 팔 아래 다리 밑으로 영원의 눈길을 한 지친 물살이 저렇듯이 천천히 흘러내린다. 밤이여 오라 종아 울려라. 세월은 가고 나는 머문다. 사랑은 흘러간다. 이 물결처럼, 우리네 사랑도 흘러만 간다. 어쩌면 삶이란 이다지도 지루한가. 희망이란 왜 이렇게 격렬한가. 밤이여 오라 종아 울려라. 세월은 가고 나는 머문다 나날은 흘러가고 달도 흐르고 지나간 세월도 흘러만 간다. 우리네 사랑은 오지 않는데 미라보 다리 아래 세느강이 흐른다. 밤이여 오라 종아 울려라. 세월은 가고 나는 남는다. ”
그러나 아폴리네르가 간과(看過) 한 것은 세월이 흘러감 속에 내가 남아 있다는 것이 꼭 축복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주위의 지인들이 하나 둘씩 소리없이 떠나감으로 내가 홀로 남겨져 있다는 것이야 말로 세월이 남겨준 고문(拷問)이다. 친구이자 주안에 형제인 정진환목사가 간간히 보내주는 이맬 편지속에는 그러한 흔적들이 물씬 적셔있다, 그 일절을 소개하면 "가을은 또 우수와 사색의 계절이다. 낙엽이 지고, 스산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면 왠지 서글퍼지고 멀리 있는 사람, 떠난 사람과 친구가 그립고, 많은 사람 중에 나만 홀로 던지운 느낌(Geworfenheit)에 심연을 헤매고 다니며,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에 생각으로 만리장성을 쌓다가 잠을 설치기도 한다. ... 무엇이 그리 급한지 순식간에 생을 마감하기도 한다. 꿈을 다 이루지 못하고, 아직 눈을 감지 못하겠는데 그렇게 아쉬운 이별을 고하는 경우도 있다. ...엊그제도 한 사람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 모진 고통 중에, 여기 저기 호스를 꽂고, 가래를 받아내고, 화장실도 못가고 누운 자리에서 처리를 하고, 진통제도 소용없이 몇 개월을 신음하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났다. ... 또 한 분은 미국에서 교수로 성공하고, 돈도, 명예도, 건강도 다 누리던 60대에 기억력이 사라지면서 교수직을 내 놓고, 점점 치매 상태가 되어 아무 분별도 못하는 가운데 10 여년을 투병하며 지내시다가 엊그제 결국 세상을 하직했다. ...모잠비크에서 말라리아로 순직한 이춘이 선교사, 평생을 강직한 모습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살다간 노광호 장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유연하고 충직했던 오세진, 젊은 꿈을 못 이루고 그냥 가슴에 묻고 사라진 40 대의 김범례 군, 딸 4을 두고! 차마 눈을 감지 못할 처지에 암으로 세상을 떠난 김대수 목사, 그 외에도 여러 사람이 눈 앞을 어른거린다. 남은 자의 외로움과 괴로움, 슬픔을 외인이 어찌 가늠할 수 있을까마는, 차라리 죽은 자가 산 자보다 낫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남은 자의 삶은 이전과 별 다름 없는, 아니 더 극한 인고(忍苦)의 나날이요, 보기에도 딱하다. "
이런 이야기들은 인생무상에 대한 준엄한 노트이다. 그러므로 엊그제 세상을 떠난 중견 텔런트 박광정씨가 임종의 최후까지 침착함 속에서 최후의 메시지로 모든 이에게 감사하고 고맙다란 말을 남겼듯 주어진 하루 하루를 감사의 장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될 때 나는 이렇게 읊을수 있으리라! 밤이여 오라 종아 울려라. 세월이 흘러 내가 떠난다 하여도 내가 세상의 머문 흔적은 감사함 뿐이었노라 !
“ 미라보 다리 아래 세느강은 흐르고 우리네 사랑도 흘러 내린다. 내 마음 속에 깊이 아로새기리라, 기쁨은 언제나 괴로움에 이어옴을. 밤이여 오라 종아 울려라. 세월은 가고 나는 머문다. 손에 손을 맞잡고 얼굴을 마주 보면 우리네 팔 아래 다리 밑으로 영원의 눈길을 한 지친 물살이 저렇듯이 천천히 흘러내린다. 밤이여 오라 종아 울려라. 세월은 가고 나는 머문다. 사랑은 흘러간다. 이 물결처럼, 우리네 사랑도 흘러만 간다. 어쩌면 삶이란 이다지도 지루한가. 희망이란 왜 이렇게 격렬한가. 밤이여 오라 종아 울려라. 세월은 가고 나는 머문다 나날은 흘러가고 달도 흐르고 지나간 세월도 흘러만 간다. 우리네 사랑은 오지 않는데 미라보 다리 아래 세느강이 흐른다. 밤이여 오라 종아 울려라. 세월은 가고 나는 남는다. ”
그러나 아폴리네르가 간과(看過) 한 것은 세월이 흘러감 속에 내가 남아 있다는 것이 꼭 축복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주위의 지인들이 하나 둘씩 소리없이 떠나감으로 내가 홀로 남겨져 있다는 것이야 말로 세월이 남겨준 고문(拷問)이다. 친구이자 주안에 형제인 정진환목사가 간간히 보내주는 이맬 편지속에는 그러한 흔적들이 물씬 적셔있다, 그 일절을 소개하면 "가을은 또 우수와 사색의 계절이다. 낙엽이 지고, 스산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면 왠지 서글퍼지고 멀리 있는 사람, 떠난 사람과 친구가 그립고, 많은 사람 중에 나만 홀로 던지운 느낌(Geworfenheit)에 심연을 헤매고 다니며, 인생의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에 생각으로 만리장성을 쌓다가 잠을 설치기도 한다. ... 무엇이 그리 급한지 순식간에 생을 마감하기도 한다. 꿈을 다 이루지 못하고, 아직 눈을 감지 못하겠는데 그렇게 아쉬운 이별을 고하는 경우도 있다. ...엊그제도 한 사람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 모진 고통 중에, 여기 저기 호스를 꽂고, 가래를 받아내고, 화장실도 못가고 누운 자리에서 처리를 하고, 진통제도 소용없이 몇 개월을 신음하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났다. ... 또 한 분은 미국에서 교수로 성공하고, 돈도, 명예도, 건강도 다 누리던 60대에 기억력이 사라지면서 교수직을 내 놓고, 점점 치매 상태가 되어 아무 분별도 못하는 가운데 10 여년을 투병하며 지내시다가 엊그제 결국 세상을 하직했다. ...모잠비크에서 말라리아로 순직한 이춘이 선교사, 평생을 강직한 모습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살다간 노광호 장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유연하고 충직했던 오세진, 젊은 꿈을 못 이루고 그냥 가슴에 묻고 사라진 40 대의 김범례 군, 딸 4을 두고! 차마 눈을 감지 못할 처지에 암으로 세상을 떠난 김대수 목사, 그 외에도 여러 사람이 눈 앞을 어른거린다. 남은 자의 외로움과 괴로움, 슬픔을 외인이 어찌 가늠할 수 있을까마는, 차라리 죽은 자가 산 자보다 낫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남은 자의 삶은 이전과 별 다름 없는, 아니 더 극한 인고(忍苦)의 나날이요, 보기에도 딱하다. "
이런 이야기들은 인생무상에 대한 준엄한 노트이다. 그러므로 엊그제 세상을 떠난 중견 텔런트 박광정씨가 임종의 최후까지 침착함 속에서 최후의 메시지로 모든 이에게 감사하고 고맙다란 말을 남겼듯 주어진 하루 하루를 감사의 장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될 때 나는 이렇게 읊을수 있으리라! 밤이여 오라 종아 울려라. 세월이 흘러 내가 떠난다 하여도 내가 세상의 머문 흔적은 감사함 뿐이었노라 !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