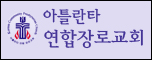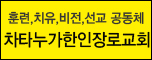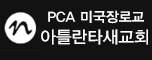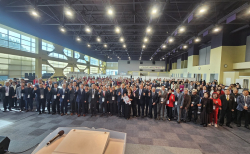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언제나 등을 기대고 쉴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만져 보지 안아도 존재만으로도 위안이 된다.
하지만, 모든 일이 다 그렇듯 영원할 것 같은 그 존재가 얼마나 약한 것인가를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는다.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그 사랑을 되갚을 길이 없이 늦은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낳아준 스승들도 그 가르침의 의미를 다 깨닫기도 전에 홀연히 사라진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으로 잘 알려진 시대의 스승이신 신영복 선생의 부고를 듣는 순간, 먹먹함이 밀려 온다. 신영복 선생은 스물 일곱 살에 육사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던 촉망받는 인재였다. 그러다가 이유도 모른 채 중앙정보부로 끌려가 ‘반국가 단체 구성죄’로 사형선고를 받는다. 그리고 20년 20일 동안 무기수로서 기나긴 수형생활을 한다. 그가 1988년 광복절 특사로 세상에 나왔을 때는 인생의 절반이 훌쩍 날아가 버린 중년이 되었다.
선생의 삶은 있을 법한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는 인생의 바닥이라고 여겨지는 감옥에서 배웠고 가르쳤다. 그 분의 회고에 따르면 그 인고의 시간은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인생의 ‘대학생활’이었다.
사형선고를 받고도, 청구동 동네 길거리에서 함께 놀아주던 아이들을 생각하고 휴지 뭉치에 동화를 써 주고 한 뼘 엽서에 보낸 글들이 엮어져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 되었다. 그리고 그의 글들은 감옥 같은 인생을 사는 시대의 수형자들에게 등불이 되었다.
요즘 들어 갑자기 떠들었던 인문학의 위기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젊은 사람들이 게임이나 하고, 고전을 읽지 않아서 상식이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다. 인생의 뼈대가 되는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잃고 가치 판단의 기준이 없어져 내 인생이 아닌 강요된 인생을 연기하듯 살 수 밖에 없는 존재의 위기를 말하는 것이다.
그 위기에 누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가? 심연의 감옥에 갇힌 것 같이 이전 세대와 단절되고, 짐을 같이 질 수 없는 경쟁 사회로 내몰린 삶에 위로와 회복이 가능한가, 그것도 책으로?
얼마전 펴낸 신영복의 마지막 강의라는 부제가 붙은 “담론”은 그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의 담론은 “관계론”이었다. 개인의 성찰을 넘어선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사회와의 관계를 통해 자본주의 사회에 짓눌린 우리에게 단절이 아니라 관계로 연결된 새로운 대안을 말했다.
신영복 선생이 시대의 스승으로 추앙 받는 것은 단지 남들과 다른 경험에만 있지 않다. 스승과 꼰대의 차이는 자신의 경험을 남에게 강요 하느냐에 있다. 선생은 나는 이렇게 고생했는데 거기에 비하면 너희의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을 돌아보고 글을 쓰고, 우리는 그것을 읽으며 스스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었다. 누구나 쉽게 펼칠 수 있는 책이었지만 쉽게 덮을 수 없는 그런 책들을 통해 인스턴트 힐링 메시지가 아니라 면역력을 높여 주는 가르침을 주었다.
신영복 선생의 글은 인생의 감옥에 비춰지는 햇살이었고,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 주는 심장의 고동 소리였다. 그 한사람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채 많은 것을 잃었고, 그 분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이어 살아가야 한다는 무거운 숙제를 떠 안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