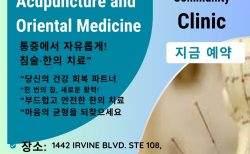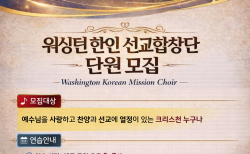맥주 지천이라는 뮌헨의 호프브로이 하우스에는
히틀러가 세계를 손아귀에 잡으려는 꼼수 판을 西歐 地圖 위에 그리려
수하들을 맥주병 앞에 모아놓고, 카랑카랑한 연설 몸짓을 해 댔던 뒷그림자로
아직도 남아있게 하는 독일인들의 회한의 흥취에
아끼는 사람들의 또 흥청거리는 이야기 바다 안 방안을
거리 뒤로 하고, 아우토반 100에 올라 서, 내 닫는다
뮌헨 올림픽에 이스라엘 선수들을 납치한 팔레스타인 테러사건이
아직껏 흔적자국으로 상처 남아, 흩날리는 데도
하얀 지붕과 그림 같은 新銳의 彫刻構造 사이에서
지금도 미각(美覺)의 극치 가까이, 비스듬한 지붕 傾斜가
바람 사이에서 반짝이고 서있었다.
미술의 거장 <뒤러>의 집 건너편으로
신성로마제국의 오토 1세 가문 중심인
독일제후의 황제로 올라서면서
왕의 제후(諸侯)를 잇는, 독일의 대 성채(城砦)를 세워
자리 잡아 내려 온 도시를 제압하고,
600년의 역사를 휘두르더니,
나폴레옹 제국의 백일천하로, 허물어졌다는데
뉘렌베르크는 ‘신성로마제국의 작은 보석상자’라는 별칭으로
사랑받는 수도의 뒷모습을 남겨서, 지금도 우뚝 서있는 巨城,
2차 세계대전에서 히틀러가 그리도 아꼈다던 도시의
할퀴임 때문에라도
전쟁을 마감하는 자리에서는 마침내
무서운 집중 포격 의 폐허로 두루 맞아
전범자의 감옥 그림자를 남기는,
처참한 재해(災害) 땅이 되어 버렸고
어느 날, 시민의 都市사랑 헌정(獻呈)으로
고대도시로 되찾아 살아 난
고풍향취 뒤 덥힌, 활기 찬 도시로 거듭 태어나,
그리도 조용하면서도
아름다운 古土의 묵직한 도시가 되었는데,
카이저부르크성채의 육중한 풍채 무계 안으로
힘 찬 페그니츠 강 을 차단하여 회자로 방어하고
성채다리 안으로 들어서면
깊이 60m의 우물이 얼굴을 감추네.
전해오는 말에
이 古城 안에, 황제의 자리를 그리스도의 높이만큼 上座에 차려놓고는
삼층 인간 계층 회랑을 만들어
도시 안을 다스렸다니
지금에 사, 그 人間 古風은
지나간 옛 이야기로만 애증(愛憎)을 즐기고 있나
고요한 도시 사람들의
사랑을 머금고, 보리수 녹음 아래서
끈적이는 流動의 녹색 짙은 저력으로, 그늘을 내려 덮으며
인간의 삶의 끝만큼 쯤이라고 만일 이야기 한다면
너도, 나도 몸 안에 저며져서 온 세월을 접어 안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또 저렇게 고요히 무계를 품으면서,
환하고도 조용하게 눈 감을 수 있을 걸가.
異國 뉘렌베르크의 아이스크림 밤하늘이, 입안에서 알지 못하는 사이,
가만히 녹아 가는데.
<아우토반100> 하면은 최소한의 속도를 100km이상을 놓으라는 유럽의 고속도로 교통규칙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을 얼마든지 속도를 놓아도 괜찮다는 규칙입니다. 정말 옆 차가 바람처럼 앞질러 달려 나갑니다. <호프부로이 하우스>는 한꺼번에 500명 이상이 테블 펼쳐 앉아 맥주를 들이키는 맥주집이고, 히틀러가 이 도시를 아껴 해서, 이곳에 가끔씩 자기 수하들을 모아놓고 연설하기를 좋아했던 맥주 집이었습니다. 둘러 구경하면서, 구석구석의 홀 안이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흥분하는 전쟁 부추김의 근원지여서인지, 이 뮌헨의 옆 도시, 뉘렌부르크 도시 안에는 지금 전범재판소가 자리하고 있을 법하다고 짐작을 해 보았습니다.
뉘렌부르크 도시의 멋, <카이저부르크城砦>는 독일 제후들의 거처로, 성 밖의 페그니츠 강으로부터 물을 끌어서 둘러, 성문 입구에만 쇠줄로 내리는 다리를 만들어, 독일의 모체인 신성로마제국, 즉 프로이쎈(푸러시아) 공국의 프레드리히 제후들이 이어 내려간 성채가 되는데, 그 성채의 모습이 그리도 장엄하고 멋져서, 성채 덩어리로 내 몸 위에 덮쳐 왔습니다. 뉘렌베르크 도시 한가운데를 흘러내려가는 피그니츠강은 도시 가운데로 시퍼렇게 물 살 힘차게 쏟아져 흐르는데, 이를 끌어다가 성채 밖 회로를 방어 회자로 두른 것이 또한 내게는 멋져 보였습니다. 도시 군데군데 마다, 끈끈한 녹색 보리수 잎 그늘 아래서, 입안에 녹아내리는 밤의 아이스크림은, 아무리 요란한 우리들 사회의 북적임과, 정쟁의 시끄러운 소리들이 도시거리를 흔들어 대 간다고 해도, 우리 삶의 긍정적인 아물음은 여전히 깊고 아름다움의 괘적(掛跡)으로 다듬어 내서, 우리 주변 사회에다 남겨 내 가야 하리라는 결의를 다짐하고 싶었습니다.
히틀러가 세계를 손아귀에 잡으려는 꼼수 판을 西歐 地圖 위에 그리려
수하들을 맥주병 앞에 모아놓고, 카랑카랑한 연설 몸짓을 해 댔던 뒷그림자로
아직도 남아있게 하는 독일인들의 회한의 흥취에
아끼는 사람들의 또 흥청거리는 이야기 바다 안 방안을
거리 뒤로 하고, 아우토반 100에 올라 서, 내 닫는다
뮌헨 올림픽에 이스라엘 선수들을 납치한 팔레스타인 테러사건이
아직껏 흔적자국으로 상처 남아, 흩날리는 데도
하얀 지붕과 그림 같은 新銳의 彫刻構造 사이에서
지금도 미각(美覺)의 극치 가까이, 비스듬한 지붕 傾斜가
바람 사이에서 반짝이고 서있었다.
미술의 거장 <뒤러>의 집 건너편으로
신성로마제국의 오토 1세 가문 중심인
독일제후의 황제로 올라서면서
왕의 제후(諸侯)를 잇는, 독일의 대 성채(城砦)를 세워
자리 잡아 내려 온 도시를 제압하고,
600년의 역사를 휘두르더니,
나폴레옹 제국의 백일천하로, 허물어졌다는데
뉘렌베르크는 ‘신성로마제국의 작은 보석상자’라는 별칭으로
사랑받는 수도의 뒷모습을 남겨서, 지금도 우뚝 서있는 巨城,
2차 세계대전에서 히틀러가 그리도 아꼈다던 도시의
할퀴임 때문에라도
전쟁을 마감하는 자리에서는 마침내
무서운 집중 포격 의 폐허로 두루 맞아
전범자의 감옥 그림자를 남기는,
처참한 재해(災害) 땅이 되어 버렸고
어느 날, 시민의 都市사랑 헌정(獻呈)으로
고대도시로 되찾아 살아 난
고풍향취 뒤 덥힌, 활기 찬 도시로 거듭 태어나,
그리도 조용하면서도
아름다운 古土의 묵직한 도시가 되었는데,
카이저부르크성채의 육중한 풍채 무계 안으로
힘 찬 페그니츠 강 을 차단하여 회자로 방어하고
성채다리 안으로 들어서면
깊이 60m의 우물이 얼굴을 감추네.
전해오는 말에
이 古城 안에, 황제의 자리를 그리스도의 높이만큼 上座에 차려놓고는
삼층 인간 계층 회랑을 만들어
도시 안을 다스렸다니
지금에 사, 그 人間 古風은
지나간 옛 이야기로만 애증(愛憎)을 즐기고 있나
고요한 도시 사람들의
사랑을 머금고, 보리수 녹음 아래서
끈적이는 流動의 녹색 짙은 저력으로, 그늘을 내려 덮으며
인간의 삶의 끝만큼 쯤이라고 만일 이야기 한다면
너도, 나도 몸 안에 저며져서 온 세월을 접어 안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또 저렇게 고요히 무계를 품으면서,
환하고도 조용하게 눈 감을 수 있을 걸가.
異國 뉘렌베르크의 아이스크림 밤하늘이, 입안에서 알지 못하는 사이,
가만히 녹아 가는데.
<아우토반100> 하면은 최소한의 속도를 100km이상을 놓으라는 유럽의 고속도로 교통규칙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을 얼마든지 속도를 놓아도 괜찮다는 규칙입니다. 정말 옆 차가 바람처럼 앞질러 달려 나갑니다. <호프부로이 하우스>는 한꺼번에 500명 이상이 테블 펼쳐 앉아 맥주를 들이키는 맥주집이고, 히틀러가 이 도시를 아껴 해서, 이곳에 가끔씩 자기 수하들을 모아놓고 연설하기를 좋아했던 맥주 집이었습니다. 둘러 구경하면서, 구석구석의 홀 안이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흥분하는 전쟁 부추김의 근원지여서인지, 이 뮌헨의 옆 도시, 뉘렌부르크 도시 안에는 지금 전범재판소가 자리하고 있을 법하다고 짐작을 해 보았습니다.
뉘렌부르크 도시의 멋, <카이저부르크城砦>는 독일 제후들의 거처로, 성 밖의 페그니츠 강으로부터 물을 끌어서 둘러, 성문 입구에만 쇠줄로 내리는 다리를 만들어, 독일의 모체인 신성로마제국, 즉 프로이쎈(푸러시아) 공국의 프레드리히 제후들이 이어 내려간 성채가 되는데, 그 성채의 모습이 그리도 장엄하고 멋져서, 성채 덩어리로 내 몸 위에 덮쳐 왔습니다. 뉘렌베르크 도시 한가운데를 흘러내려가는 피그니츠강은 도시 가운데로 시퍼렇게 물 살 힘차게 쏟아져 흐르는데, 이를 끌어다가 성채 밖 회로를 방어 회자로 두른 것이 또한 내게는 멋져 보였습니다. 도시 군데군데 마다, 끈끈한 녹색 보리수 잎 그늘 아래서, 입안에 녹아내리는 밤의 아이스크림은, 아무리 요란한 우리들 사회의 북적임과, 정쟁의 시끄러운 소리들이 도시거리를 흔들어 대 간다고 해도, 우리 삶의 긍정적인 아물음은 여전히 깊고 아름다움의 괘적(掛跡)으로 다듬어 내서, 우리 주변 사회에다 남겨 내 가야 하리라는 결의를 다짐하고 싶었습니다.
 | |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