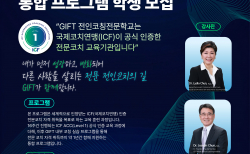점점 기억력이 흐려져 가시는 어머님께 어느 날 전화를 올렸다.
“엄니, 저여유. 영봉이.”
“응, 우리 아들인감? 니가 몇째지?”
“둘째지. 이젠 그것두 몰르남.”
“그려, 내가 아들 넷 낳았응게. 첫째가 승봉이구, 영봉이는 둘째지. 넌 애들 몇이나 낳았냐?”
“저두 넷 낳았지.”
“너, 에미 시절되었다구 놀리는구나. 바른대로 말혀.”
“둘이유. 민우허구 애린이.”
“맞다. 민우, 애린이. 우리 애기덜 잘 지내지?”
“그럼유. 잘 지내유.”
“근디, 너 에미헌티 잘 허지? 눈 부릅뜨구, 빽 소리 지르구, 그러지 않지?”
“안 그려유. 그랬다가 큰 일 나게?”
“에미 좀 바꿔라.”
아내가 수화기를 넘겨받는다.
“어머니, 저 현주예요. 안녕하세요?”
“그려, 나 잘 있어. 그런디, 애비, 너헌티 잘 허지?”
“예, 어머니, 잘 해요. 요새는 제가 무섭대요.”
“잘 허능거여. 그리야여. 말 안 들으먼 한 대 갈겨라, 잉?”
아내가 뒤집어진다.
“아이구, 귀한 아들을 제가 어떻게 갈겨요. 교인들 알면 저 큰 일 나요.”
“괜찮어. 내 말만 들어. 마누라 말 안 듣는 놈은 다 그리야여.”
내가 수화기를 다시 잡는다.
“아니, 엄니가 돼서 아들 편을 들으야지 왜 며느리 편만 드신대?”
“소용 읍서. 나는 여자 편이여.”
“그래두 그렇지, 아들을 때리라구 허먼 돼?”
“마누라 말 안 듣는 놈은 맞아도 싸. 다 너 복 받으라구 그러능겨.”
“걱정 마셔. 잘 허구 있응게. 그런디, 지금 혼자서 뭐 허구 계셨어?”
“혼저 찬송 부르구 있었다. 왜, 같이 헐래?”
“좋지. 무슨 찬송인디. 같이 부르지 뭐. 몇 장인디?”
“내가 알간? 암것두 물러. 나, 시절이다.”
어머니가 갑자기 수화기를 잡고 한 참을 웃으신다.
“엄니, 안녕히 계셔. 또 전화 허께.”
“그려, 내 새끼. 고맙다. 시간 있으먼 한 번 댕겨 가. 나는 가지 못허니께.”
“내가 어디 사는지 알기나 허남?”
“그거 알먼 내가 박사게?”
“그거, 몰라두 되니께, 부르던 찬송이나 계속 부르셔. 전화 끊으께.” (2011년 10월 2일)
“엄니, 저여유. 영봉이.”
“응, 우리 아들인감? 니가 몇째지?”
“둘째지. 이젠 그것두 몰르남.”
“그려, 내가 아들 넷 낳았응게. 첫째가 승봉이구, 영봉이는 둘째지. 넌 애들 몇이나 낳았냐?”
“저두 넷 낳았지.”
“너, 에미 시절되었다구 놀리는구나. 바른대로 말혀.”
“둘이유. 민우허구 애린이.”
“맞다. 민우, 애린이. 우리 애기덜 잘 지내지?”
“그럼유. 잘 지내유.”
“근디, 너 에미헌티 잘 허지? 눈 부릅뜨구, 빽 소리 지르구, 그러지 않지?”
“안 그려유. 그랬다가 큰 일 나게?”
“에미 좀 바꿔라.”
아내가 수화기를 넘겨받는다.
“어머니, 저 현주예요. 안녕하세요?”
“그려, 나 잘 있어. 그런디, 애비, 너헌티 잘 허지?”
“예, 어머니, 잘 해요. 요새는 제가 무섭대요.”
“잘 허능거여. 그리야여. 말 안 들으먼 한 대 갈겨라, 잉?”
아내가 뒤집어진다.
“아이구, 귀한 아들을 제가 어떻게 갈겨요. 교인들 알면 저 큰 일 나요.”
“괜찮어. 내 말만 들어. 마누라 말 안 듣는 놈은 다 그리야여.”
내가 수화기를 다시 잡는다.
“아니, 엄니가 돼서 아들 편을 들으야지 왜 며느리 편만 드신대?”
“소용 읍서. 나는 여자 편이여.”
“그래두 그렇지, 아들을 때리라구 허먼 돼?”
“마누라 말 안 듣는 놈은 맞아도 싸. 다 너 복 받으라구 그러능겨.”
“걱정 마셔. 잘 허구 있응게. 그런디, 지금 혼자서 뭐 허구 계셨어?”
“혼저 찬송 부르구 있었다. 왜, 같이 헐래?”
“좋지. 무슨 찬송인디. 같이 부르지 뭐. 몇 장인디?”
“내가 알간? 암것두 물러. 나, 시절이다.”
어머니가 갑자기 수화기를 잡고 한 참을 웃으신다.
“엄니, 안녕히 계셔. 또 전화 허께.”
“그려, 내 새끼. 고맙다. 시간 있으먼 한 번 댕겨 가. 나는 가지 못허니께.”
“내가 어디 사는지 알기나 허남?”
“그거 알먼 내가 박사게?”
“그거, 몰라두 되니께, 부르던 찬송이나 계속 부르셔. 전화 끊으께.” (2011년 10월 2일)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