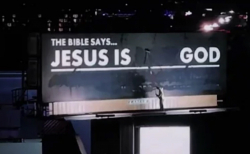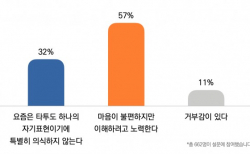이정록이라는 분이 <서시>라는 제목으로, “마을이 가까울수록 / 나무는 흠집이 많다. // 내 몸이 너무 성하다.”라고 오래 전에 내었던 시를 요즘에 읽었습니다.
어려서 뒷동산에서 뛰놀던 생각이 납니다. 뒷동산에는 참나무들이 많았고 거기에는 도토리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어린 우리 팔로 한 아름되는 나무를 흔들 수 없기에, 큰 돌로 나무 허리를 탕탕 치노라면 도토리가 우수수 떨어집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또래는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어찌 나무에 흠집이 없겠습니까? 다음 해에 보면 나무 허리마다 커다란 혹들이 생겨서 흉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나무라 빗댄다면 마을은 사람들일 터이고, 흠집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상처와 아픔도 많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은근히 시가 나를 위로해 주는 기분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염치없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인은 다음 구절에서 “내 몸이 너무 성하다.”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뭇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깐깐하게 자신을 지켜가는 모습이 비치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살라고 이 시를 썼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너무 외람되게 내 중심적으로 해석을 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를 그런 뜻으로 쓴 것은 그 사람의 몫이고, 그 시를 읽고 해석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내가 나의 경험에 의해 그렇게 인식되는 것을 그 사람이 무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저는 이 시에 대하여 또 다른 해석을 해 봅니다. 요즘 교회를 보는 세상의 시각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몇 몇 교회나 몇 몇 성직자들이 잘못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성직자들도 사람이고 보면 어찌 온전하기만 할 수 있겠습니까? 변명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가지는 특수성은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본질에 속하는 것입니다. 말씀(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 살아야 하고 세상에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기독교입니다. 그러니 이리저리 치이면서 어찌 흠집이 없겠습니까? 흠집이 있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 그 본질을 벗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수도사들처럼 산 속에 들어가 세상을 등지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몸이 너무 성하다.”는 시인의 깐깐한 오기가 부럽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흠집으로 인하여 자위하거나 변명하기보다는 성한 몸을 지키려는 마음가짐입니다. 말씀의 진리로 사는 것을 진정한 능력으로 여기고, 그것을 사랑으로 실천하는 수고를 최선으로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한 때, “예수 때문에 먹고 살면 최소한 예수에 대한 의리라도 지키고 살고 싶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몸 성하게 사는 비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려서 뒷동산에서 뛰놀던 생각이 납니다. 뒷동산에는 참나무들이 많았고 거기에는 도토리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어린 우리 팔로 한 아름되는 나무를 흔들 수 없기에, 큰 돌로 나무 허리를 탕탕 치노라면 도토리가 우수수 떨어집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또래는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어찌 나무에 흠집이 없겠습니까? 다음 해에 보면 나무 허리마다 커다란 혹들이 생겨서 흉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나무라 빗댄다면 마을은 사람들일 터이고, 흠집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상처와 아픔도 많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은근히 시가 나를 위로해 주는 기분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염치없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인은 다음 구절에서 “내 몸이 너무 성하다.”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뭇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깐깐하게 자신을 지켜가는 모습이 비치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살라고 이 시를 썼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너무 외람되게 내 중심적으로 해석을 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를 그런 뜻으로 쓴 것은 그 사람의 몫이고, 그 시를 읽고 해석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내가 나의 경험에 의해 그렇게 인식되는 것을 그 사람이 무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저는 이 시에 대하여 또 다른 해석을 해 봅니다. 요즘 교회를 보는 세상의 시각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몇 몇 교회나 몇 몇 성직자들이 잘못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성직자들도 사람이고 보면 어찌 온전하기만 할 수 있겠습니까? 변명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가지는 특수성은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본질에 속하는 것입니다. 말씀(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 살아야 하고 세상에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기독교입니다. 그러니 이리저리 치이면서 어찌 흠집이 없겠습니까? 흠집이 있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 그 본질을 벗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수도사들처럼 산 속에 들어가 세상을 등지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몸이 너무 성하다.”는 시인의 깐깐한 오기가 부럽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흠집으로 인하여 자위하거나 변명하기보다는 성한 몸을 지키려는 마음가짐입니다. 말씀의 진리로 사는 것을 진정한 능력으로 여기고, 그것을 사랑으로 실천하는 수고를 최선으로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한 때, “예수 때문에 먹고 살면 최소한 예수에 대한 의리라도 지키고 살고 싶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몸 성하게 사는 비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