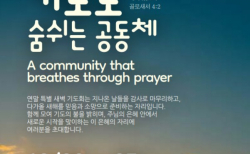내가 결혼식보다도 더 꼭 참석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장례식이다. 장례식에서 나는 삶의 지혜를 배우고 죽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우리는 언젠가 모두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학교에 근무중인 한 교수와 이야기하던 중 어떻게 죽고 싶냐는 질문을 그분에게 던졌다. 느닷없는 질문이었음에도 그 분은 마치 늘 그 물음에 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듯 쉽게 답을 주었다. “갑자기 죽고 싶어요. 중병으로 오랜 시간 고생하다가 죽는 그런 죽음 말고 잘 지내다가 어느날 쉽게 죽고 싶어요.” 나는 그 분의 말을 듣다가 섬뜻한 느낌을 받았다. 나의 할머니도 아무 병이 없이 잘 지내시다가 어느날 아침 돌아가신 것이 발견된 경우다.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 할머니가 참 복스럽게 돌아가셨다는 말을 장례식 때 들었더랬다. 그러나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복있게 세상을 뜰 수 있을까? 나와 이야기를 나눈 그 교수의 소원처럼 갑자기 죽는 경우는 대개 세가지가 아닌가? 길을 가다가 사고로 죽든지, 자살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 명이 다해서 죽든지.
“죽는다는 것이 두렵지 않으세요?” 나의 질문에 그 분은 죽으면 끝인데 뭘 하셨다. 그 분의 아내는 암으로 오랜 시간 투병 중이다. 혹 아픈 아내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와 만일 자신에게 그런 운명이 다가오면 아내처럼 어렵게 시달리느니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하직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 분은 마치 죽음이라는 것이 눈 앞에 보이는 하나의 빌딩의 문을 열고 쑥 들어가는 것처럼 쉽게 묘사하고 있었다.
과연 우리는 죽음이 주는 막연한 두려움에서 자유한가. 신앙이 돈독하신 분들에게 이 질문은 혹시 모욕이 될는지도 모르겠다. 아이티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대략 이십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수일을 굶주린 채 도움만 기다리고 있던 거리의 시민들 중 일부는 약탈을 하고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구조품이 도착했을 때 우리는 모두 보았다.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의 물품을 강제로 뺏는 것을. 그 과정에서 살인도 일어났다. 살아 남기 위한 몸부림이다. 삶을 유지하기 위한 처절한 노력이다. 죽음을 필사적으로 피하고자 하는 무의식 중의 의지의 표현이다.
1년 전 쯤 한 선교사님께서 아프가니스탄으로 잠시 들어가신다고 하셨을 때 나는 ‘거기 위험하지 않나요? 저는 못 갈것 같아요’ 라고 했다. 내 말을 들은 그 분의 질문은 “얼마나 오래 살고 싶은데요?” 였다. 나는 정말 삶을 끈질기게 사모하는가?
지난 월요일 마틴 루터 킹의 생일을 맞아 하루 휴일을 가졌다. 직장 동료들과 파네라에 모여 아침을 먹으면서 한가한 수다를 떨고 있는데 동료 중 한 명이 나에게 서너개의 잡지를 건넸다. 그 친구와 나는 크리스챤으로 직장에서도 가끔 쉬는 시간에 믿음의 교제를 나누곤 하였다. 그 친구가 건네 준 잡지의 제목들은 세계의 순교자들, 그리고 핍박의 현장 이었다. 처참하고 어두운 배경의 풍경이 커버를 장식하고 있었다. 평소에 정기구독하고 있는 잡지들인데 지난 주에 한 개씩이 덤으로 오자 누구 줄 사람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내가 떠오르더란다. 쉽고 부담없이 읽을 수 있는 여성 동아나 무슨 한겨례 21 같은 잡지도 아닌 핍박과 순교자들을 다루고 있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 잡지를 나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건네준 그 친구의 얼굴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마침내 잡지를 받아 들고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다. 내 머리는 순간 백지가 되었다. 순교자. 나는 내게 기회가 주어지면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내 마음에 휘몰아치고 있는 이상한 동요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져온 것이 아니었나 싶다. 크리스챤으로서 모두 죽음을 환영하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우리들인데 그 죽음이라는 단어를 가까이 가져 올려고 하니 정작 기쁨 보다는 두려움이 앞서는 이유는 뭔가?
우리는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김성희(볼티모어 한인장로교회의 집사이자 요한전도회 문서부장. 경영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메릴랜드 주립대학 의과대학에서 연구 행정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같은 학교에 근무중인 한 교수와 이야기하던 중 어떻게 죽고 싶냐는 질문을 그분에게 던졌다. 느닷없는 질문이었음에도 그 분은 마치 늘 그 물음에 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듯 쉽게 답을 주었다. “갑자기 죽고 싶어요. 중병으로 오랜 시간 고생하다가 죽는 그런 죽음 말고 잘 지내다가 어느날 쉽게 죽고 싶어요.” 나는 그 분의 말을 듣다가 섬뜻한 느낌을 받았다. 나의 할머니도 아무 병이 없이 잘 지내시다가 어느날 아침 돌아가신 것이 발견된 경우다.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 할머니가 참 복스럽게 돌아가셨다는 말을 장례식 때 들었더랬다. 그러나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복있게 세상을 뜰 수 있을까? 나와 이야기를 나눈 그 교수의 소원처럼 갑자기 죽는 경우는 대개 세가지가 아닌가? 길을 가다가 사고로 죽든지, 자살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 명이 다해서 죽든지.
“죽는다는 것이 두렵지 않으세요?” 나의 질문에 그 분은 죽으면 끝인데 뭘 하셨다. 그 분의 아내는 암으로 오랜 시간 투병 중이다. 혹 아픈 아내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와 만일 자신에게 그런 운명이 다가오면 아내처럼 어렵게 시달리느니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하직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 분은 마치 죽음이라는 것이 눈 앞에 보이는 하나의 빌딩의 문을 열고 쑥 들어가는 것처럼 쉽게 묘사하고 있었다.
과연 우리는 죽음이 주는 막연한 두려움에서 자유한가. 신앙이 돈독하신 분들에게 이 질문은 혹시 모욕이 될는지도 모르겠다. 아이티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대략 이십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수일을 굶주린 채 도움만 기다리고 있던 거리의 시민들 중 일부는 약탈을 하고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구조품이 도착했을 때 우리는 모두 보았다.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의 물품을 강제로 뺏는 것을. 그 과정에서 살인도 일어났다. 살아 남기 위한 몸부림이다. 삶을 유지하기 위한 처절한 노력이다. 죽음을 필사적으로 피하고자 하는 무의식 중의 의지의 표현이다.
1년 전 쯤 한 선교사님께서 아프가니스탄으로 잠시 들어가신다고 하셨을 때 나는 ‘거기 위험하지 않나요? 저는 못 갈것 같아요’ 라고 했다. 내 말을 들은 그 분의 질문은 “얼마나 오래 살고 싶은데요?” 였다. 나는 정말 삶을 끈질기게 사모하는가?
지난 월요일 마틴 루터 킹의 생일을 맞아 하루 휴일을 가졌다. 직장 동료들과 파네라에 모여 아침을 먹으면서 한가한 수다를 떨고 있는데 동료 중 한 명이 나에게 서너개의 잡지를 건넸다. 그 친구와 나는 크리스챤으로 직장에서도 가끔 쉬는 시간에 믿음의 교제를 나누곤 하였다. 그 친구가 건네 준 잡지의 제목들은 세계의 순교자들, 그리고 핍박의 현장 이었다. 처참하고 어두운 배경의 풍경이 커버를 장식하고 있었다. 평소에 정기구독하고 있는 잡지들인데 지난 주에 한 개씩이 덤으로 오자 누구 줄 사람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내가 떠오르더란다. 쉽고 부담없이 읽을 수 있는 여성 동아나 무슨 한겨례 21 같은 잡지도 아닌 핍박과 순교자들을 다루고 있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 잡지를 나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건네준 그 친구의 얼굴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마침내 잡지를 받아 들고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다. 내 머리는 순간 백지가 되었다. 순교자. 나는 내게 기회가 주어지면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내 마음에 휘몰아치고 있는 이상한 동요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져온 것이 아니었나 싶다. 크리스챤으로서 모두 죽음을 환영하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우리들인데 그 죽음이라는 단어를 가까이 가져 올려고 하니 정작 기쁨 보다는 두려움이 앞서는 이유는 뭔가?
우리는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김성희(볼티모어 한인장로교회의 집사이자 요한전도회 문서부장. 경영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메릴랜드 주립대학 의과대학에서 연구 행정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