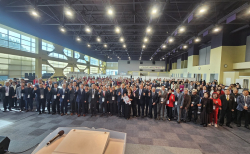“더도 말고 덜고 말고 오늘만 같아라....”는 추석입니다. 미국에 살면서 웬 추석타령이냐고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고국에 살거나 고향에 살면 오히려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고국을 떠나서 살다 보니, 마치 고향을 떠나 객지에서 사는 이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더 진하듯이 이렇게 미국에서 사노라니 고향이 그립고 추석과 같은 명절이 더 그리워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추석이야 선물 꾸러미를 양손 가득 들고 고향으로 향하는 붐비는 귀성열차를 타야 제 맛이 나고, 아니면 거의 주차장처럼 자동차로 꽉 들어찬 고속도로에서 고생고생을 하며 고향을 다녀와야 실감이 나겠지만 사실 고국에 산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꼭 그렇게 추석을 맞이하는 것도 아니고, 조상 선친들의 묘를 찾아 성묘를 하면 후손으로 해야 할 도리를 한 것 같아 마음의 위로가 되겠지만 모두가 다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온 가족이 둘러앉아 송편을 빚지 않는다고 해서 추석을 생각하지 못할 이유는 없는 듯 합니다. 추석이 와도 추석을 추석답게 지내지 못하는 형편이다 보니 오히려 생각만큼은 더 아련해 지는 듯 합니다.
그래서 추석에 대한 그리움에 젖어 보지만 막상 구체적으로 추석을 떠올릴만한 추억은 그리 많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추석은 설날과 더불어 일년 중 가장 큰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설날에 비하면 먹는 음식에서부터 즐기는 놀이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딱히 ‘그래 이게 바로 추석이야’ 라고 하면서 손꼽을만한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추석을 생각하면 설날보다 오히려 더 고향 생각에 포근하게 젖어 들게 하고, 추석이란 말을 듣기만 해도 그 말이 마음에 더 깊이 파고듭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이제 흐릿해지기는 했지만 옛날 어렸을 적 시골에서 지낸 추석에 대한 기억 몇 가지를 더듬어라도 봐야 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언제부터 인가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을 연상하게 되고 그것이 명절을 맞이하는 대표적 관심이 되었지만 그것도 사회가 도시중심으로 변한 이후의 풍경입니다. 우리나라가 산업사회로 변화된 이후부터 고향을 떠나 도시에 나와 사는 이들이 많아져서 일 년에 한두 차례 명절이 돼서야 겨우 고향을 찾는 이들이 많고 그들이 오면서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들이 고향 사람들에게 명절 기분이 나게 해줍니다.
그러나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가족 중에서 고향을 떠나는 경우는 아들이 군대에 가거나, 딸이 읍내로 출가하는 정도가 고작이었기 때문에 명절이라고 해서 객지에서 사는 가족이 명절이 되어 고향을 찾아온다는 것은 꿈도 꿔보지 못했습니다. 해서 명절이라고 객지에서부터 누가 찾아오는 집은 동네에서도 손을 꼽을 만큼 없는 터라 추석 선물이라고 부를만한 무엇을 주는 이도 받는 이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도 설날에는 설빔이라고 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집안 형편이 아주 어렵지 않으면 명절 전 대목장에서 사온 새 옷 한 벌은 얻어 입은 데 비해, 추석에는 대부분의 집들이 아직 추수를 끝마치지 못해 생활 형편이 어려운 탓에 명절이라도 고작해야 새 양말 몇 켤레 얻어 신거나 어쩌다 새 신발 하나 얻어 신으면 횡재한 듯 좋았습니다.
이렇게 추석은 설날에 비해 모든 것이 여유롭지 못했지만 그래도 추석을 생각하며 설날보다 더 풍성하게 기억되는 것은 아마도 추석이 가을녁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때쯤 되어야 봄부터 여름내내 지내면서 먹기는커녕 구경하기도 어려웠던 하얀 쌀밥을 먹을 수 있었고, 게다가 지금은 어쩌다 한번 먹어도 시큰둥하는 송편을 그날만큼은 마음껏 먹을 수 있었기에 설날에 비해 그리 넉넉한 상차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더 넉넉하게 보듬어 준 듯 합니다.
그래도 추석을 앞둔 며칠 전 뒷동산에 있는 소나무에 올라가 송편을 찔 때 쓸 솔잎을 따고, 시오리길은 족히 넘게 있는 사과 과수원으로 보리쌀을 짊어지고 가서 주인에게 가져간 보리를 쏟아주고 보리 담아 갔던 자루에 한 가득 사과를 담아 짊어지고 오면서 사과담은 자루가 무거운 것을 핑계삼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러 번을 쉬면서 자루에 담긴 사과를 하나씩 둘씩 빼먹던 기억은 언제 생각해도 정겹습니다.
새로 수확한 햅쌀(추석이 이른 해는 묵은 쌀이지만)을 방앗간서 빻아다가 반죽해서 그 안에 녹두가루며, 콩,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깨를 흑설탕에 비벼 만든 고물을 넣고 맵시 있는 버선코 모양으로 송편을 빚는 어른들 옆에서 송편 근처도 못하는 모양으로 몇 개를 빚는 척하고 있으면 먼저 빚은 송편을 쪄서 내옵니다. 그러면 속안에 달콤한 깨설탕 고물을 넣은 송편을 먹으려는 욕심으로 이 송편 저 송편을 먹다보면 한배가 그득해 지곤 했던 기억을 더듬으면 어느새 마음도 불러 집니다.
옛날이 자꾸 그리워지는 걸보면 가을이 온 탓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나 봅니다.
추석이야 선물 꾸러미를 양손 가득 들고 고향으로 향하는 붐비는 귀성열차를 타야 제 맛이 나고, 아니면 거의 주차장처럼 자동차로 꽉 들어찬 고속도로에서 고생고생을 하며 고향을 다녀와야 실감이 나겠지만 사실 고국에 산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꼭 그렇게 추석을 맞이하는 것도 아니고, 조상 선친들의 묘를 찾아 성묘를 하면 후손으로 해야 할 도리를 한 것 같아 마음의 위로가 되겠지만 모두가 다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온 가족이 둘러앉아 송편을 빚지 않는다고 해서 추석을 생각하지 못할 이유는 없는 듯 합니다. 추석이 와도 추석을 추석답게 지내지 못하는 형편이다 보니 오히려 생각만큼은 더 아련해 지는 듯 합니다.
그래서 추석에 대한 그리움에 젖어 보지만 막상 구체적으로 추석을 떠올릴만한 추억은 그리 많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추석은 설날과 더불어 일년 중 가장 큰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설날에 비하면 먹는 음식에서부터 즐기는 놀이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딱히 ‘그래 이게 바로 추석이야’ 라고 하면서 손꼽을만한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추석을 생각하면 설날보다 오히려 더 고향 생각에 포근하게 젖어 들게 하고, 추석이란 말을 듣기만 해도 그 말이 마음에 더 깊이 파고듭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이제 흐릿해지기는 했지만 옛날 어렸을 적 시골에서 지낸 추석에 대한 기억 몇 가지를 더듬어라도 봐야 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언제부터 인가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을 연상하게 되고 그것이 명절을 맞이하는 대표적 관심이 되었지만 그것도 사회가 도시중심으로 변한 이후의 풍경입니다. 우리나라가 산업사회로 변화된 이후부터 고향을 떠나 도시에 나와 사는 이들이 많아져서 일 년에 한두 차례 명절이 돼서야 겨우 고향을 찾는 이들이 많고 그들이 오면서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들이 고향 사람들에게 명절 기분이 나게 해줍니다.
그러나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가족 중에서 고향을 떠나는 경우는 아들이 군대에 가거나, 딸이 읍내로 출가하는 정도가 고작이었기 때문에 명절이라고 해서 객지에서 사는 가족이 명절이 되어 고향을 찾아온다는 것은 꿈도 꿔보지 못했습니다. 해서 명절이라고 객지에서부터 누가 찾아오는 집은 동네에서도 손을 꼽을 만큼 없는 터라 추석 선물이라고 부를만한 무엇을 주는 이도 받는 이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도 설날에는 설빔이라고 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집안 형편이 아주 어렵지 않으면 명절 전 대목장에서 사온 새 옷 한 벌은 얻어 입은 데 비해, 추석에는 대부분의 집들이 아직 추수를 끝마치지 못해 생활 형편이 어려운 탓에 명절이라도 고작해야 새 양말 몇 켤레 얻어 신거나 어쩌다 새 신발 하나 얻어 신으면 횡재한 듯 좋았습니다.
이렇게 추석은 설날에 비해 모든 것이 여유롭지 못했지만 그래도 추석을 생각하며 설날보다 더 풍성하게 기억되는 것은 아마도 추석이 가을녁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때쯤 되어야 봄부터 여름내내 지내면서 먹기는커녕 구경하기도 어려웠던 하얀 쌀밥을 먹을 수 있었고, 게다가 지금은 어쩌다 한번 먹어도 시큰둥하는 송편을 그날만큼은 마음껏 먹을 수 있었기에 설날에 비해 그리 넉넉한 상차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더 넉넉하게 보듬어 준 듯 합니다.
그래도 추석을 앞둔 며칠 전 뒷동산에 있는 소나무에 올라가 송편을 찔 때 쓸 솔잎을 따고, 시오리길은 족히 넘게 있는 사과 과수원으로 보리쌀을 짊어지고 가서 주인에게 가져간 보리를 쏟아주고 보리 담아 갔던 자루에 한 가득 사과를 담아 짊어지고 오면서 사과담은 자루가 무거운 것을 핑계삼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러 번을 쉬면서 자루에 담긴 사과를 하나씩 둘씩 빼먹던 기억은 언제 생각해도 정겹습니다.
새로 수확한 햅쌀(추석이 이른 해는 묵은 쌀이지만)을 방앗간서 빻아다가 반죽해서 그 안에 녹두가루며, 콩,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깨를 흑설탕에 비벼 만든 고물을 넣고 맵시 있는 버선코 모양으로 송편을 빚는 어른들 옆에서 송편 근처도 못하는 모양으로 몇 개를 빚는 척하고 있으면 먼저 빚은 송편을 쪄서 내옵니다. 그러면 속안에 달콤한 깨설탕 고물을 넣은 송편을 먹으려는 욕심으로 이 송편 저 송편을 먹다보면 한배가 그득해 지곤 했던 기억을 더듬으면 어느새 마음도 불러 집니다.
옛날이 자꾸 그리워지는 걸보면 가을이 온 탓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나 봅니다.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