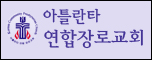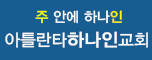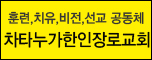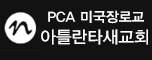어느 공동체든지 있을 땐 몰랐어도, 없으면 아쉬운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다. 평소에 누구보다도 묵묵히 허드렛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소리 없이 해결하고, 지저분한 일을 잘도 감당해 내면서도 생색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잘 보면 가까이서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튀질 않아서, 그 가치와 귀함을 사람들은 느끼질 못하다가 멀리 떠나 버리고 나면 오랫동안 뇌리에서 잊히지 않는 사람으로 있다. 그리곤 이런 사람이 있던 자리는 으레 빈자리의 공간감을 느끼게 만든다. 그래서 “나도 이런 사람으로 존재 할 수 있을까?“ 질문해 볼 때가 종종 있다. 그만큼 소리가 요란하고 모든 일을 자신이 주도해야 하고 큰 열매를 맺을 것처럼 까불다가 머쓱해 져서 사라질 경우 어렵지 않게 보아온 터라 큰 소리 내는 만큼 기대도 사라지는 현상을 발견하곤 한다. 물론 이런 인간의 군상들이야 꼭 남만 탓할 수 없는, 자화상도 같은 일임을 부인 할 수 없다.
살면서 지워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있을 땐 몰랐다가 없을 땐 정말 허전한 느낌을 주는 사람이 있다. 세월이 흘러서 강산이 몇 번 변하고서도 가슴속에 진국처럼 남아 있는 사람은 눈앞에 자주 어른 거렸던 사람은 아니었다. 함께 있을 땐 그 가치를 모르다가 철이 들어가면서 그 사람의 진가가 계속 우러나올 때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생각을 감출 수 없이 흘러나옴을 주체 할 수 없도록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든 찾고 싶고 인생의 반환점을 넘은 시점에서 함께 인생의 여로를 하고 싶은 사람이다.
사실, 기독교에서 인간론이란 주제는 또는 교리는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구원론이나 종말론에 치중하다 보니 사람을 왜곡되게 만든 경우들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또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발견하곤 한다. 처음 예수 믿을 땐 신선하고, 인간적이어서 친근감이 있던 사람도 시간이 흐르면서 교조적인 사람이 되어 이리저리 사람들을 정죄하고, 부정적인 입술이 더 많아진 경우를 보면서 묘해진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그래서 스스로 내안에 저런 모습이 되었지 않았을까 조심스런 생각이 들게 된다.
이런 생각은 어떨까? 즉 신론에 대한 이해이다. 구원 받은 사람이라면 모든 인식의 근원은 신론에서 출발함을 모르지 않는다. 여기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분의 창조, 그리고 섭리와 작정 등은 인간의 머리로 계측할 수 없는 지식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시하신 지식이다. 이것은 사람의 감성과 지혜를 충만하게 만드는 지식임을 칼빈의 기독교 강요 1권만 읽어도 고백되어 진다. 중요한 것은 가슴, 즉 신앙고백이 없는 지식의 축적으로, 분별은 있는 것 같은데 냉소적인 사람이 되어서 어디를 가나 부담스런 존재가 되어 버린다면, 귀한 지식도 독이 되었지 않았을까 여겨본다. 여기엔 인간성의 미숙아 현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보단 게토화된 공동체를 지향하게 되고 교회는 세상에서 섬처럼, 아니면 성처럼 될까 두려워 진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론의 문제와 깊은 관계를 갖지 않을까 어쭙잖은 생각이지만 하게 된다.
다시 이런 생각을 가져 본다. 즉 하나님의 사람과 자연인과의 공동분모가 분명 있기에 공감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 따듯함, 아름다움, 진지함, 온유, 인내, 관용등등 이런 인격적인 바탕은 타인으로 하여금 공감을 느끼게 만든다. 물론 그리스도인과 자연인과의 구원론적 차이는 있다. 정체성의 변화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원 안에 있는 고상한 인간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목적을 품고 있다면 인간론에 대한 관심과 스스로 진보를 나타내려는 애씀이 있게 되는데, 이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와 관계가 있다.
소원하기는, 있을 땐 모르나 없을 때 빈공간의 아쉬움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간구해 본다. 세월이 지나도 누군가 우리를 경험하고 철이 들었음에도 잊히지 않고, 진한 국물의 맛을 느끼게 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맛보게 하는 것 신자로 불림 받은 하나님의 소원이 아닐까 큰 도전을 받는다.
이런 사람들은 튀질 않아서, 그 가치와 귀함을 사람들은 느끼질 못하다가 멀리 떠나 버리고 나면 오랫동안 뇌리에서 잊히지 않는 사람으로 있다. 그리곤 이런 사람이 있던 자리는 으레 빈자리의 공간감을 느끼게 만든다. 그래서 “나도 이런 사람으로 존재 할 수 있을까?“ 질문해 볼 때가 종종 있다. 그만큼 소리가 요란하고 모든 일을 자신이 주도해야 하고 큰 열매를 맺을 것처럼 까불다가 머쓱해 져서 사라질 경우 어렵지 않게 보아온 터라 큰 소리 내는 만큼 기대도 사라지는 현상을 발견하곤 한다. 물론 이런 인간의 군상들이야 꼭 남만 탓할 수 없는, 자화상도 같은 일임을 부인 할 수 없다.
살면서 지워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있을 땐 몰랐다가 없을 땐 정말 허전한 느낌을 주는 사람이 있다. 세월이 흘러서 강산이 몇 번 변하고서도 가슴속에 진국처럼 남아 있는 사람은 눈앞에 자주 어른 거렸던 사람은 아니었다. 함께 있을 땐 그 가치를 모르다가 철이 들어가면서 그 사람의 진가가 계속 우러나올 때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생각을 감출 수 없이 흘러나옴을 주체 할 수 없도록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든 찾고 싶고 인생의 반환점을 넘은 시점에서 함께 인생의 여로를 하고 싶은 사람이다.
사실, 기독교에서 인간론이란 주제는 또는 교리는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구원론이나 종말론에 치중하다 보니 사람을 왜곡되게 만든 경우들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또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발견하곤 한다. 처음 예수 믿을 땐 신선하고, 인간적이어서 친근감이 있던 사람도 시간이 흐르면서 교조적인 사람이 되어 이리저리 사람들을 정죄하고, 부정적인 입술이 더 많아진 경우를 보면서 묘해진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그래서 스스로 내안에 저런 모습이 되었지 않았을까 조심스런 생각이 들게 된다.
이런 생각은 어떨까? 즉 신론에 대한 이해이다. 구원 받은 사람이라면 모든 인식의 근원은 신론에서 출발함을 모르지 않는다. 여기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분의 창조, 그리고 섭리와 작정 등은 인간의 머리로 계측할 수 없는 지식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시하신 지식이다. 이것은 사람의 감성과 지혜를 충만하게 만드는 지식임을 칼빈의 기독교 강요 1권만 읽어도 고백되어 진다. 중요한 것은 가슴, 즉 신앙고백이 없는 지식의 축적으로, 분별은 있는 것 같은데 냉소적인 사람이 되어서 어디를 가나 부담스런 존재가 되어 버린다면, 귀한 지식도 독이 되었지 않았을까 여겨본다. 여기엔 인간성의 미숙아 현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보단 게토화된 공동체를 지향하게 되고 교회는 세상에서 섬처럼, 아니면 성처럼 될까 두려워 진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론의 문제와 깊은 관계를 갖지 않을까 어쭙잖은 생각이지만 하게 된다.
다시 이런 생각을 가져 본다. 즉 하나님의 사람과 자연인과의 공동분모가 분명 있기에 공감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 따듯함, 아름다움, 진지함, 온유, 인내, 관용등등 이런 인격적인 바탕은 타인으로 하여금 공감을 느끼게 만든다. 물론 그리스도인과 자연인과의 구원론적 차이는 있다. 정체성의 변화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원 안에 있는 고상한 인간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목적을 품고 있다면 인간론에 대한 관심과 스스로 진보를 나타내려는 애씀이 있게 되는데, 이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와 관계가 있다.
소원하기는, 있을 땐 모르나 없을 때 빈공간의 아쉬움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간구해 본다. 세월이 지나도 누군가 우리를 경험하고 철이 들었음에도 잊히지 않고, 진한 국물의 맛을 느끼게 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맛보게 하는 것 신자로 불림 받은 하나님의 소원이 아닐까 큰 도전을 받는다.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