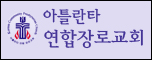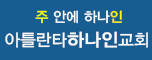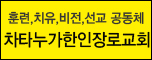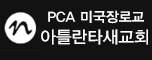오늘날 회자 되는 수 없이 많은 말 중에 웰빙, 신토불이, 먹거리, 맛, 건강 등등의 단어가 많이 들려지는 어휘들 이다. 과거 같으면 이런 단어를 언급함이 뭔가 이기적이고 1차원적인 사람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은근히 피하는 말이었었다. 그만큼 못 먹는 시대에 건강을 생각해서 아니면 식도락가의 입장이 되어서 먹을거리를 찾고 챙기는 것이 시대의 격에 안 맞아서 그랬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라도 이런 단어를 잘도 사용한다. 왜냐하면 먹거리의 풍성함과 평준화 때문에 그렇기도 하다. 아울러 건강에 관한 이야기라면 귀가 솔깃해 지고 무슨 중요한 정보라도 있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귀동냥한다. 그래서 입담이 좋은 사람은 건강에 관계된 이야기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곤 하는데, 무엇을 먹으면 건강에 좋다는 말이 주류를 이룰 만큼 먹을 것도 선택해 먹는 잘사는 시대가 된 셈이다.
글쎄 목회를 잘하는 것이란, 앞으로 교회에서 제공하는 교제의 거의 모든 식탁엔 어김없이 유기농으로 된 진수성찬이 등장하는 것, 아마 목회에 중요한 변수가 될 시대가 도래 할 것 같은 위기감도 은근히 있다. 그만큼 목회에서 신경 쓰이는 영역이 점점 복잡하고 넓어진다는 생각 갖게 된다. 신앙과 건강, 그리곤 먹거리의 질적 차원이 높아진 입으로 까다로운 시대, 교회라도 예외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과거 같았으면 잘못된 시대정신을 바로 잡는 것이 교회였고 지도자의 역할이었지만, 지금은 시대정신이 문화의 산물이 되고, 이런 문화는 어김없이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시대이다. 그러기에 문화의 옷을 입고 있어야 사람들이 오는 시대, 문화의 옷 가운데 먹거리의 첨단이 교회와 같이하는 시대가 된 셈이다. 어쩌면 교회나 개인 예산에서 먹거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점점 높아져 갈 것 같은 부담을 느낀다. 그런 면에서 교회가 본질 보단 비 본질에 투자되고 낭비되는 물질과 시간 그리고 에너지의 소비가 크겠다는 생각해본다.
사실, 필자에겐 작은 밭이라도 있어서 아내의 수고로 친교의 밥상엔 으레 유기농 먹거리가 자주 오른다. 상추, 고추, 깻잎, 호박, 파 등등 거의 유기농 들이다. 그래서 텃밭의 크기가 점점 커간다는 느낌이 있다. 물론 성도 분들을 섬기려는 즐거움이 있어서, 또는 나눔이 있어서 기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것 생각해 볼만 하다. 그만큼 교회가 갖는 여러 봉사중 친교에 차지하는 부담과 소비, 즉 지난주에 비해서 더 좋은 친교의 식탁이 되었으면 하는 초기의 즐거움이 부담의 반복이 되어선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헌신된 분들이 계셔서 즐거움으로 섬기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담감으로 작용한다면 교회가 본질에 에너지를 쓰지 못하는 거룩치 못한 근심이 될까 부담스럽다. 그런 의미에서 군대처럼 식판에 일식 삼찬도 괜찮다는 생각도 들고, 이를 통한 먹거리에 대한 훈련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시대에 역행할 정도로 검소한 식탁이 되는 것, 물론 많은 교회에선 이미 실천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오래전 CCC 청년들의 수련회땐 어김없이 금식 수련이 있었던 적이 있다. 기간은 거의 한 주일(?)을 강사나 대학생들 모두가 금식 했었던 아름다운 집회 이었었다. ‘가서 제자 삼으라‘는 노래 가사에 보면, “미루나무 우거진 숲 속에서 주님 젊은 제자들 다시 부르시사“ 즉 금강의 강가에서 청년 대학생들이 몇 천 명씩 모여서 금식 수련하던 모습에 세상이 놀랬던 적이 매년 계속 된 적이 있었다. 기독교의 저력과 능력을 세상이 바라보았던 때가 있었다. 혹시라도 교회 집회와 먹을거리의 연속성의 유무에 따라 은혜의 유무 또는 상관관계로 작용된다면 엥겔 지수성 신자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매는 아닐까? 특히 음식물 쓰레기로 골머리 앓는 시대에 교회라도 은은한 모범이 되었으면 싶다.
글쎄 목회를 잘하는 것이란, 앞으로 교회에서 제공하는 교제의 거의 모든 식탁엔 어김없이 유기농으로 된 진수성찬이 등장하는 것, 아마 목회에 중요한 변수가 될 시대가 도래 할 것 같은 위기감도 은근히 있다. 그만큼 목회에서 신경 쓰이는 영역이 점점 복잡하고 넓어진다는 생각 갖게 된다. 신앙과 건강, 그리곤 먹거리의 질적 차원이 높아진 입으로 까다로운 시대, 교회라도 예외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과거 같았으면 잘못된 시대정신을 바로 잡는 것이 교회였고 지도자의 역할이었지만, 지금은 시대정신이 문화의 산물이 되고, 이런 문화는 어김없이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시대이다. 그러기에 문화의 옷을 입고 있어야 사람들이 오는 시대, 문화의 옷 가운데 먹거리의 첨단이 교회와 같이하는 시대가 된 셈이다. 어쩌면 교회나 개인 예산에서 먹거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점점 높아져 갈 것 같은 부담을 느낀다. 그런 면에서 교회가 본질 보단 비 본질에 투자되고 낭비되는 물질과 시간 그리고 에너지의 소비가 크겠다는 생각해본다.
사실, 필자에겐 작은 밭이라도 있어서 아내의 수고로 친교의 밥상엔 으레 유기농 먹거리가 자주 오른다. 상추, 고추, 깻잎, 호박, 파 등등 거의 유기농 들이다. 그래서 텃밭의 크기가 점점 커간다는 느낌이 있다. 물론 성도 분들을 섬기려는 즐거움이 있어서, 또는 나눔이 있어서 기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것 생각해 볼만 하다. 그만큼 교회가 갖는 여러 봉사중 친교에 차지하는 부담과 소비, 즉 지난주에 비해서 더 좋은 친교의 식탁이 되었으면 하는 초기의 즐거움이 부담의 반복이 되어선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헌신된 분들이 계셔서 즐거움으로 섬기면 문제가 다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담감으로 작용한다면 교회가 본질에 에너지를 쓰지 못하는 거룩치 못한 근심이 될까 부담스럽다. 그런 의미에서 군대처럼 식판에 일식 삼찬도 괜찮다는 생각도 들고, 이를 통한 먹거리에 대한 훈련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시대에 역행할 정도로 검소한 식탁이 되는 것, 물론 많은 교회에선 이미 실천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오래전 CCC 청년들의 수련회땐 어김없이 금식 수련이 있었던 적이 있다. 기간은 거의 한 주일(?)을 강사나 대학생들 모두가 금식 했었던 아름다운 집회 이었었다. ‘가서 제자 삼으라‘는 노래 가사에 보면, “미루나무 우거진 숲 속에서 주님 젊은 제자들 다시 부르시사“ 즉 금강의 강가에서 청년 대학생들이 몇 천 명씩 모여서 금식 수련하던 모습에 세상이 놀랬던 적이 매년 계속 된 적이 있었다. 기독교의 저력과 능력을 세상이 바라보았던 때가 있었다. 혹시라도 교회 집회와 먹을거리의 연속성의 유무에 따라 은혜의 유무 또는 상관관계로 작용된다면 엥겔 지수성 신자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매는 아닐까? 특히 음식물 쓰레기로 골머리 앓는 시대에 교회라도 은은한 모범이 되었으면 싶다.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