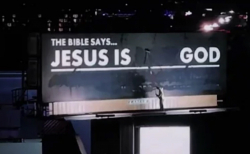500여년 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독일은 기독교, 특히 개신교의 나라다. 이후에는 계몽주의와 고전주의, 낭만주의가 이어지며 ‘교양있는 나라’의 위상을 확고히 해 왔다. 그러나 400여년 후, 그곳에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 등장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것이다. 특히 당시 독일교회도 나치의 실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일부가 협력했다.
기독교 문화운동가 추태화 교수(안양대)가 쓴 <권력과 신앙(Macht und Glaube·씨코북스)>은 나치가 기독교를 어떻게 정치에 이용했는지, 일부 교회는 나치의 ‘사이비 기독교 정책’을 어떻게 오해했는지,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교회와 신앙을 어떻게 지켜냈는지 등을 살피면서, 최종적으로 한국교회가 이런 역사적 교훈에서 배울 점들을 찾고 있다.
추태화 교수는 나치 시대를 단적으로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탄압한 시대”였다고 표현한다. 나치의 옷을 입은 기독교와 나치에 부역한 ‘제국기독교인’들이, 나치에 반대하고 저항한 ‘고백교회 목사와 교인’들을 탄압했다는 것. 저자는 “국가적으로 거의 모든 국민들이 기독교를 믿고 있는 독일에서, 나치의 기독교 정책이 얼마나 교활했는지를 알 수 있는 단면”이라고 이를 분석한다.
히틀러에게 기독교는 정권 유지를 위한 도구일 뿐이었다. 그는 기독교 신자인 척하면서 정치에 기독교를 이용했지만, 기독교를 대하는 그의 평소 태도는 반기독교적이었다. 히틀러의 철저한 이중성은 종교 지도자들까지 그가 기독교 신자라고 믿게 만들었다. 하지만 나치에게 기독교는 궁극적으로 제거의 대상이었고, 그 추종자들은 기독교와 유대교를 몰아내고 새로운 종교, 즉 ‘게르만 신앙’을 세우려 했다.
나치는 민족주의에 호소하며 ‘국가교회’를 세워 독일을 지배하려 했고, ‘강력한 국가’를 원하던 일부 목회자들이 여기에 동조했다. 그들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태초에 민족이 있었다. 이 민족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하나님은 곧 민족이다’로 바꿔버렸다. 그들의 ‘독일신앙운동(DGB)’은 민족 전통 안에 스며있는 종교적 신비성과 상징을 기초로 정치적 신비화를 꾀하고, 독일 국민의 삶 깊숙이 배어있는 기독교 전통을 토착적 요소로 교체하려 했다. 이들에게 ‘민족’은 곧 하나님이었다.
그들은 적대국 종교이지만 정치와 종교를 동시에 장악해 세계를 제패한 ‘영국국교회’를 모델로 삼고, 가톨릭과 개신교를 공격했다. 제국기독교인들은 독일교회가 너무 교리적이고 체계에 굳어있어 민족을 위한 사랑의 실천과 영적 지도를 하기 어렵다며 ‘개혁’을 부르짖었지만, 히틀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로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서슴없이 이야기했다. 그들은 공동체적 삶을 ‘교회’가 아닌 ‘나치당’에서 찾으려 했다.
신학적 영역에서도 ‘기독교-독일신앙운동’을 통해 침투해 들어왔다. 기독론과 성령론, 종말론이 나치를 위해 마음대로 사용됐고, 부활절과 성탄절, 성령강림절까지 훼손시켜 버렸다.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편견에 사로잡힌 망상가로 폄하됐고, 종교개혁가 루터는 ‘독일인’이라는 프레임에 가둬놓고 유대인 학살에 활용했다.
제국기독교가 아닌, 복음주의 기독교는 결국 탄압받기 시작했다. 히틀러를 위시한 나치당과 내무부·법무부 등 내각, 경찰과 제국기독교인들까지 여기에 앞장섰다. 교단은 장악당했고, 신학대 교수와 학생들은 친나치 단체 가입을 강요당했으며, 목회자들에게는 ‘충성 서약’을 시켰다. 그러자 저항도 시작됐다. 교계에서 니묄러와 디벨리우스, 나치에 의한 최초의 순교자 쉬나이더에 이어 신학계에서 우리가 잘 아는 칼 바르트와 폴 틸리히, 디트리히 본회퍼와 헬무트 틸리케 등이 나섰다. 가톨릭도 저항과 순교로 맞섰다.
특히 쉬나이더 목사는 나치의 기독교 정책을 비판하고 이에 항의하다 네 차례 투옥됐다. 그는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수감자들을 위로했지만, 나치 깃발에 경례를 거부하다 독방에 감금됐고, 약물로 독살됐다. 그의 순교는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밑거름이 됐고, 본회퍼에게 깊은 영향을 끼쳤다.
바르트는 나치에 저항한 고백교회 결성과 바르멘 신학선언 작성에 지대한 영향을 줬고, 히틀러에 대해 충성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다 대학에서 해임되고 추방당했다. 1933년 그의 글 ‘오늘의 신학적 실존’은 고백교회의 신학적·정신적 기초가 됐고, 교회의 타협·무기력·침묵을 깨우는 선지자적 역할을 했다. “교회는 결코 사람과 독일 민족을 섬겨야 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에 속한 공동체는 혈통과 인종이 아니라, 성령과 세례에 의해 구별된다.”
이러한 저항 끝에 연합국의 승리로 나치는 항복했고, 독일 기독교계는 나치에 지배당한 제국기독교총회(DEK)의 이름을 바꾸는 일부터 참회와 자체 정화 작업을 전개해 나갔다.
저자는 “교회는 시대와 소통하지만, 시대의 산물이 아니다”며 “성경의 진리는 변하지 않고 시대를 관통하고 있으므로, 교회는 성경에서 생명력을 끌어올릴 때 가장 교회답다”고 정리한다. 정치세력이 기독교를 왜곡할 때 교회의 대응과, 구체적 정치권력 앞에서 기독교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는 우리의 몫으로 남겨놓았다. 연말 대선을 앞둔 기독교인들에게 던져진 숙제다.
기독교 문화운동가 추태화 교수(안양대)가 쓴 <권력과 신앙(Macht und Glaube·씨코북스)>은 나치가 기독교를 어떻게 정치에 이용했는지, 일부 교회는 나치의 ‘사이비 기독교 정책’을 어떻게 오해했는지,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교회와 신앙을 어떻게 지켜냈는지 등을 살피면서, 최종적으로 한국교회가 이런 역사적 교훈에서 배울 점들을 찾고 있다.
추태화 교수는 나치 시대를 단적으로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탄압한 시대”였다고 표현한다. 나치의 옷을 입은 기독교와 나치에 부역한 ‘제국기독교인’들이, 나치에 반대하고 저항한 ‘고백교회 목사와 교인’들을 탄압했다는 것. 저자는 “국가적으로 거의 모든 국민들이 기독교를 믿고 있는 독일에서, 나치의 기독교 정책이 얼마나 교활했는지를 알 수 있는 단면”이라고 이를 분석한다.
히틀러에게 기독교는 정권 유지를 위한 도구일 뿐이었다. 그는 기독교 신자인 척하면서 정치에 기독교를 이용했지만, 기독교를 대하는 그의 평소 태도는 반기독교적이었다. 히틀러의 철저한 이중성은 종교 지도자들까지 그가 기독교 신자라고 믿게 만들었다. 하지만 나치에게 기독교는 궁극적으로 제거의 대상이었고, 그 추종자들은 기독교와 유대교를 몰아내고 새로운 종교, 즉 ‘게르만 신앙’을 세우려 했다.
나치는 민족주의에 호소하며 ‘국가교회’를 세워 독일을 지배하려 했고, ‘강력한 국가’를 원하던 일부 목회자들이 여기에 동조했다. 그들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태초에 민족이 있었다. 이 민족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하나님은 곧 민족이다’로 바꿔버렸다. 그들의 ‘독일신앙운동(DGB)’은 민족 전통 안에 스며있는 종교적 신비성과 상징을 기초로 정치적 신비화를 꾀하고, 독일 국민의 삶 깊숙이 배어있는 기독교 전통을 토착적 요소로 교체하려 했다. 이들에게 ‘민족’은 곧 하나님이었다.
그들은 적대국 종교이지만 정치와 종교를 동시에 장악해 세계를 제패한 ‘영국국교회’를 모델로 삼고, 가톨릭과 개신교를 공격했다. 제국기독교인들은 독일교회가 너무 교리적이고 체계에 굳어있어 민족을 위한 사랑의 실천과 영적 지도를 하기 어렵다며 ‘개혁’을 부르짖었지만, 히틀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로 보냄받은 사람이라고 서슴없이 이야기했다. 그들은 공동체적 삶을 ‘교회’가 아닌 ‘나치당’에서 찾으려 했다.
신학적 영역에서도 ‘기독교-독일신앙운동’을 통해 침투해 들어왔다. 기독론과 성령론, 종말론이 나치를 위해 마음대로 사용됐고, 부활절과 성탄절, 성령강림절까지 훼손시켜 버렸다.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편견에 사로잡힌 망상가로 폄하됐고, 종교개혁가 루터는 ‘독일인’이라는 프레임에 가둬놓고 유대인 학살에 활용했다.
제국기독교가 아닌, 복음주의 기독교는 결국 탄압받기 시작했다. 히틀러를 위시한 나치당과 내무부·법무부 등 내각, 경찰과 제국기독교인들까지 여기에 앞장섰다. 교단은 장악당했고, 신학대 교수와 학생들은 친나치 단체 가입을 강요당했으며, 목회자들에게는 ‘충성 서약’을 시켰다. 그러자 저항도 시작됐다. 교계에서 니묄러와 디벨리우스, 나치에 의한 최초의 순교자 쉬나이더에 이어 신학계에서 우리가 잘 아는 칼 바르트와 폴 틸리히, 디트리히 본회퍼와 헬무트 틸리케 등이 나섰다. 가톨릭도 저항과 순교로 맞섰다.
특히 쉬나이더 목사는 나치의 기독교 정책을 비판하고 이에 항의하다 네 차례 투옥됐다. 그는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수감자들을 위로했지만, 나치 깃발에 경례를 거부하다 독방에 감금됐고, 약물로 독살됐다. 그의 순교는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밑거름이 됐고, 본회퍼에게 깊은 영향을 끼쳤다.
바르트는 나치에 저항한 고백교회 결성과 바르멘 신학선언 작성에 지대한 영향을 줬고, 히틀러에 대해 충성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다 대학에서 해임되고 추방당했다. 1933년 그의 글 ‘오늘의 신학적 실존’은 고백교회의 신학적·정신적 기초가 됐고, 교회의 타협·무기력·침묵을 깨우는 선지자적 역할을 했다. “교회는 결코 사람과 독일 민족을 섬겨야 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에 속한 공동체는 혈통과 인종이 아니라, 성령과 세례에 의해 구별된다.”
이러한 저항 끝에 연합국의 승리로 나치는 항복했고, 독일 기독교계는 나치에 지배당한 제국기독교총회(DEK)의 이름을 바꾸는 일부터 참회와 자체 정화 작업을 전개해 나갔다.
저자는 “교회는 시대와 소통하지만, 시대의 산물이 아니다”며 “성경의 진리는 변하지 않고 시대를 관통하고 있으므로, 교회는 성경에서 생명력을 끌어올릴 때 가장 교회답다”고 정리한다. 정치세력이 기독교를 왜곡할 때 교회의 대응과, 구체적 정치권력 앞에서 기독교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는 우리의 몫으로 남겨놓았다. 연말 대선을 앞둔 기독교인들에게 던져진 숙제다.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