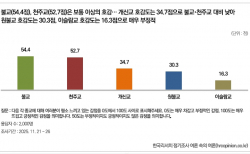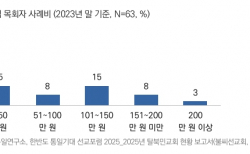남의 자서전 따위를 대신 써주는 사람을 우리말로는'대필 작가'라고 부른다. 미국인들에겐 그러나 '유령 작가(ghost writer)'가 더 친숙한 표현이다.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까닭이다. 미국에선 이 '유령'이 엄청난 비즈니스다.
정치인은 물론이고 대기업의 회장을 단골로 확보하면 건당 10만달러 쯤은 쉽게 챙긴다. 리서치에 드는 경비는 당연히 고객 부담이다. 순수익 100%가 되는 알짜배기 장사다.
그래서 베스트셀러작가도 무명시절엔 '유령'을 몇차례 해본 경험이 있다고 한다. 지식을 파는 직업이어서 흠이 될 법도 하지만 자본주의가 몸에 밴 때문인지 이를 탓하는 분위기도 아니다.
'유령'은 백악관 출신이 시쳇말로 '인기 캡'이다. 대통령의 스피치라이터(speech writer), 바로 연설문 작성자다. 흔치 않지만 백악관을 떠난뒤 '유령'이 돼 톡톡히 재미를 본 사람도 있다. 웹사이트를 만들어 인터넷에 띄우면 접속이 끊이지 않는다.
백악관에는 5∼6명의 스피치라이터가 있다. 대부분 저널리스트 출신이다. 국내문제와 경제, 외교·국방 등 전공별로 나뉘어 대통령의 연설문을 쓰게 된다. 글재주는 물론이고 맡은 분야에도 해박한 지식이 필요해 언론인이 아니면 해내기 어려운 일이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한해 평균 연설한 횟수는 600여 차례나 된다. 50년 전 해리 트루먼의 80여회에 비교하면 엄청나게 늘어난 숫자다.
가장 곤욕을 치렀을 스피치라이터는 아마 클린턴 시절이 아닌가 싶다. 섹스 스캔들로 날이 저물줄 몰라 연설문 작성자들도 무척 황당했을 것이다.
주인의 마음과 일치가 안되면 글이 제대로 나올리 없다. 그래서 연설문작성자를 일컬어 흔히 '생각하는 모자(thinking cap)'라고 부른다.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읽어 자신의 머리에 그대로 옮겨야 하기 때문이다. 보스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모자를 써야 명 연설문이 나온다는 뜻이다.
대통령의 스피치라이터에 대한 예우는 깍듯하다. 경조사는 물론이고 가끔 집에 전화를 걸어 배우자들을 다독거려 준다.
남을 위해 글을 써야하니 백악관의 스피치라이터도 '유령'이긴 마찬가지다. 한밤중 텅빈 백악관을 지키고 있어야 해 진짜 유령같은 생활을 해야 한다. 하루가 멀다하고 연설문을 써내야 하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51초 침묵' 연설이 세계적인 화제가 되고 있다. 애리조나주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했던 투산을 12일 방문한 오바마는 추모연설을 했다.
연설 말미에 최연소 희생자인 크리스티나 그린(9)을 거론한 오바마는 "나는 우리 민주주의가 크리스티나가 상상한 것과 같이 좋았으면 한다"고 언급한 뒤 51초간 침묵했다. 이후 어금니를 깨물고는 연설을 이어갔다. 국민과 소통한 극적인 순간이었다.
"우리를 분열시키는 힘은 우리를 단결시키는 힘보다 강하지 않다"고 역설한 대목이 연설의 하이라이트였다. 보수와 진보 가릴 것 없이 찬사가 쏟아졌다.
연설문 작성자는 올해 30세에 불과한 코디 키넌. 대통령의 초안을 받아든 그는 오바마의 '생각하는 모자'가 돼 글을 고치고 또 고쳐 명 연설문을 만들어냈다.
한국사회도 보수와 진보의 첨예한 이념대결로 국론이 분열돼 있어 이번 오바마의 연설은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이명박 대통령도 국민과의 소통을 늘 강조하고는 있지만 그의 주변엔 키넌 처럼 '생각하는 모자'가 없다. 그저 상대를 비난할 뿐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담아내는 참모들이 눈에 띄지 않는다.
'생각하는 모자'는 '열린 대통령'과 '열린 사회'에서나 가능하다. '꼭 닫힌 대통령' 밑에서는 키넌 같은 참모가 나오기 어렵다. 오바마의 연설이 왜 미국인들의 심금을 울렸는지 MB도 한번 쯤 곱씹어 봐야 할 것 같다.
박현일 기자, ukopia.com
정치인은 물론이고 대기업의 회장을 단골로 확보하면 건당 10만달러 쯤은 쉽게 챙긴다. 리서치에 드는 경비는 당연히 고객 부담이다. 순수익 100%가 되는 알짜배기 장사다.
그래서 베스트셀러작가도 무명시절엔 '유령'을 몇차례 해본 경험이 있다고 한다. 지식을 파는 직업이어서 흠이 될 법도 하지만 자본주의가 몸에 밴 때문인지 이를 탓하는 분위기도 아니다.
'유령'은 백악관 출신이 시쳇말로 '인기 캡'이다. 대통령의 스피치라이터(speech writer), 바로 연설문 작성자다. 흔치 않지만 백악관을 떠난뒤 '유령'이 돼 톡톡히 재미를 본 사람도 있다. 웹사이트를 만들어 인터넷에 띄우면 접속이 끊이지 않는다.
백악관에는 5∼6명의 스피치라이터가 있다. 대부분 저널리스트 출신이다. 국내문제와 경제, 외교·국방 등 전공별로 나뉘어 대통령의 연설문을 쓰게 된다. 글재주는 물론이고 맡은 분야에도 해박한 지식이 필요해 언론인이 아니면 해내기 어려운 일이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한해 평균 연설한 횟수는 600여 차례나 된다. 50년 전 해리 트루먼의 80여회에 비교하면 엄청나게 늘어난 숫자다.
가장 곤욕을 치렀을 스피치라이터는 아마 클린턴 시절이 아닌가 싶다. 섹스 스캔들로 날이 저물줄 몰라 연설문 작성자들도 무척 황당했을 것이다.
주인의 마음과 일치가 안되면 글이 제대로 나올리 없다. 그래서 연설문작성자를 일컬어 흔히 '생각하는 모자(thinking cap)'라고 부른다.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읽어 자신의 머리에 그대로 옮겨야 하기 때문이다. 보스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모자를 써야 명 연설문이 나온다는 뜻이다.
대통령의 스피치라이터에 대한 예우는 깍듯하다. 경조사는 물론이고 가끔 집에 전화를 걸어 배우자들을 다독거려 준다.
남을 위해 글을 써야하니 백악관의 스피치라이터도 '유령'이긴 마찬가지다. 한밤중 텅빈 백악관을 지키고 있어야 해 진짜 유령같은 생활을 해야 한다. 하루가 멀다하고 연설문을 써내야 하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51초 침묵' 연설이 세계적인 화제가 되고 있다. 애리조나주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했던 투산을 12일 방문한 오바마는 추모연설을 했다.
연설 말미에 최연소 희생자인 크리스티나 그린(9)을 거론한 오바마는 "나는 우리 민주주의가 크리스티나가 상상한 것과 같이 좋았으면 한다"고 언급한 뒤 51초간 침묵했다. 이후 어금니를 깨물고는 연설을 이어갔다. 국민과 소통한 극적인 순간이었다.
"우리를 분열시키는 힘은 우리를 단결시키는 힘보다 강하지 않다"고 역설한 대목이 연설의 하이라이트였다. 보수와 진보 가릴 것 없이 찬사가 쏟아졌다.
연설문 작성자는 올해 30세에 불과한 코디 키넌. 대통령의 초안을 받아든 그는 오바마의 '생각하는 모자'가 돼 글을 고치고 또 고쳐 명 연설문을 만들어냈다.
한국사회도 보수와 진보의 첨예한 이념대결로 국론이 분열돼 있어 이번 오바마의 연설은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이명박 대통령도 국민과의 소통을 늘 강조하고는 있지만 그의 주변엔 키넌 처럼 '생각하는 모자'가 없다. 그저 상대를 비난할 뿐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담아내는 참모들이 눈에 띄지 않는다.
'생각하는 모자'는 '열린 대통령'과 '열린 사회'에서나 가능하다. '꼭 닫힌 대통령' 밑에서는 키넌 같은 참모가 나오기 어렵다. 오바마의 연설이 왜 미국인들의 심금을 울렸는지 MB도 한번 쯤 곱씹어 봐야 할 것 같다.
박현일 기자, ukopia.com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