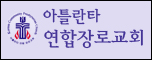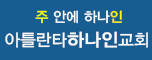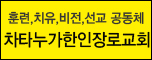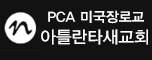민들레와 영성
잔디를 깎을 때면 언제나 거스른 존재가 있기 마련이다. 달래, 잡초, 그리고 민들레다. 그중에 민들레란 놈은 빨리 티를 내어서 주인의 게으름을 잘도 일러바치는 거추장스런 놈이다. 그래서 민들레가 쏘옥 피어오를 땐 마음이 급해 진다. 빨리 잔디를 깎아야 한다는 급한 마음, 그래서 민들레는 감상의 대상이 되기보단 귀찮은 존재로 여겨지곤 한다. 노란 자태의 고풍스러움을 보고 느껴 귀하게 여길 마음의 여유도 갖지 못한 채 구박 당하고, 천대 받아 무딘 잔디 칼날의 잔혹한 휘둘림에 사라지고 만다.
그런데 잔디 기계의 칼날이 미치지 못하는 어느 후미진 길옆에 피어 있는 민들레를 보노라면, 참 꽃의 진면목을 잘도 나타내 준다. 노란색깔의 원조, 아름다운 꽃술의 왕관도 같은 속살들의 겹겹, 굳굳한 꽃대의 팽팽한 지탱은 본래 민들레가 귀족의 꽃이라는 시위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모든 꽃들이 다 귀하지만, 민들레처럼 천대 받는 꽃은 없을 것이다. 흔하다는 이유와 값이 없다는 이유로 그런 것일까? 높은 산 고봉에서 피우는 꽃이 아니라서, 또는 비닐하우스에서 애지중지 정성을 받아 피우는 꽃이 아니라, 아무대서 아무렇게 잘도 피워주어서 천대를 받는 것은 아닐까? 마치 사람도 소유와 지식의 유무에 따라, 자신이 보기에 내 사람같이 보이는 사람, 그리곤 뭔가 보탬직한 사람에겐 좋은 대접을 주기는 사람이 살아가는 그 어떤 사회에서도 쉽게 발견해 보는 현상이다.
이런 사회적 시류에 믿음의 가치도 실종된 채 세속의 가치에 휩쓸리는 현상이란, 대접 받을 사람과 그렇지 못할 사람으로 본능적으로 분류하는 속화된 인간성이란 필자에게도 조차 경계치 아니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주님이 사람을 생각하는 존중이란 가르침에서 벗어난 인간들끼리의 양극화 현상이란 교회가 클수록 쉽게 발견해 보는 일들이다. 그만큼 소외라는 현상은 인간의 힘으로 극복하지 못할 것만 같은 위기감을 느껴 본다.
언젠가는 한국에서 내놓으라는 강남의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심방을 갔었는데, 무슨 여고의 오십 몇 회 동창회 모임을 위한 심방을 갔었다고 한다. 교회가 얼마나 큰지, 그 교회 안에서 일류여고의 동창회 모임에 심방을 가실 정도로 교회 안에서 세속의 가치로 이리저리 쪼개진 현상이란, 교회 안에서 귀족 같은 귀한 꽃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하고 어디에도 끼질 못하는 민들레 같은 존재가 있다는 사실 앞에 얼마나 많은 회개가 있어야 할까?
그럼에도, 교회를 섬기고, 네 이웃을 자기 몸처럼 섬기며 사랑하는 신자의 몫이란 민들레처럼 존귀를 못 받아도 해야 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인정과 대접을 받기 보단, 오히려 상처를 받고 무시를 당하여도 주님을 생각하며 주의 교회를 섬김이 민들레처럼 아름다움을 끌고 가는 여유 있는 신자의 모습이 아닐까? 그러함으로 낙하산처럼 온 세상에 주님의 진리와 사랑의 씨를 뿌리는 민들레와도 같은 영성을 지닌 신자의 몫이 있지 않을까 여겨본다.
조금은 오래전 청소년과 주일학교를 섬기면서 발견한 현상 하나가 있었다면 부엌일에 헌신하시는 분들 가운데 흑인 분들과 결혼한 성도들이 더 있었다는 사실이 잊히지 않는다. 우리의 문화 현상의 고정관념이 이들을 부엌으로 몰고 가게 된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진리보다 문화적 정서가 앞선 현상이 교회 안에서도 그 힘을 발휘하고 있다면, 역시 회개할 기도 제목이 아닐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교회에 그루터기는 민들레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시는 분들의 몫인 것 같다. 교회의 허드렛일을 도맡고도 빛을 보지 못하는, 마치 민들레가 사람들의 시선을 오랫동안 고정시키지 못함처럼 말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분들의 희생과 눈물로 이뤄지는 주님의 경륜을 인간의 지혜로 다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이런 분들의 영성에 풍성한 지혜로 응답하심에 큰 위로를 삼는다.
잔디를 깎을 때면 언제나 거스른 존재가 있기 마련이다. 달래, 잡초, 그리고 민들레다. 그중에 민들레란 놈은 빨리 티를 내어서 주인의 게으름을 잘도 일러바치는 거추장스런 놈이다. 그래서 민들레가 쏘옥 피어오를 땐 마음이 급해 진다. 빨리 잔디를 깎아야 한다는 급한 마음, 그래서 민들레는 감상의 대상이 되기보단 귀찮은 존재로 여겨지곤 한다. 노란 자태의 고풍스러움을 보고 느껴 귀하게 여길 마음의 여유도 갖지 못한 채 구박 당하고, 천대 받아 무딘 잔디 칼날의 잔혹한 휘둘림에 사라지고 만다.
그런데 잔디 기계의 칼날이 미치지 못하는 어느 후미진 길옆에 피어 있는 민들레를 보노라면, 참 꽃의 진면목을 잘도 나타내 준다. 노란색깔의 원조, 아름다운 꽃술의 왕관도 같은 속살들의 겹겹, 굳굳한 꽃대의 팽팽한 지탱은 본래 민들레가 귀족의 꽃이라는 시위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모든 꽃들이 다 귀하지만, 민들레처럼 천대 받는 꽃은 없을 것이다. 흔하다는 이유와 값이 없다는 이유로 그런 것일까? 높은 산 고봉에서 피우는 꽃이 아니라서, 또는 비닐하우스에서 애지중지 정성을 받아 피우는 꽃이 아니라, 아무대서 아무렇게 잘도 피워주어서 천대를 받는 것은 아닐까? 마치 사람도 소유와 지식의 유무에 따라, 자신이 보기에 내 사람같이 보이는 사람, 그리곤 뭔가 보탬직한 사람에겐 좋은 대접을 주기는 사람이 살아가는 그 어떤 사회에서도 쉽게 발견해 보는 현상이다.
이런 사회적 시류에 믿음의 가치도 실종된 채 세속의 가치에 휩쓸리는 현상이란, 대접 받을 사람과 그렇지 못할 사람으로 본능적으로 분류하는 속화된 인간성이란 필자에게도 조차 경계치 아니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주님이 사람을 생각하는 존중이란 가르침에서 벗어난 인간들끼리의 양극화 현상이란 교회가 클수록 쉽게 발견해 보는 일들이다. 그만큼 소외라는 현상은 인간의 힘으로 극복하지 못할 것만 같은 위기감을 느껴 본다.
언젠가는 한국에서 내놓으라는 강남의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심방을 갔었는데, 무슨 여고의 오십 몇 회 동창회 모임을 위한 심방을 갔었다고 한다. 교회가 얼마나 큰지, 그 교회 안에서 일류여고의 동창회 모임에 심방을 가실 정도로 교회 안에서 세속의 가치로 이리저리 쪼개진 현상이란, 교회 안에서 귀족 같은 귀한 꽃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하고 어디에도 끼질 못하는 민들레 같은 존재가 있다는 사실 앞에 얼마나 많은 회개가 있어야 할까?
그럼에도, 교회를 섬기고, 네 이웃을 자기 몸처럼 섬기며 사랑하는 신자의 몫이란 민들레처럼 존귀를 못 받아도 해야 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인정과 대접을 받기 보단, 오히려 상처를 받고 무시를 당하여도 주님을 생각하며 주의 교회를 섬김이 민들레처럼 아름다움을 끌고 가는 여유 있는 신자의 모습이 아닐까? 그러함으로 낙하산처럼 온 세상에 주님의 진리와 사랑의 씨를 뿌리는 민들레와도 같은 영성을 지닌 신자의 몫이 있지 않을까 여겨본다.
조금은 오래전 청소년과 주일학교를 섬기면서 발견한 현상 하나가 있었다면 부엌일에 헌신하시는 분들 가운데 흑인 분들과 결혼한 성도들이 더 있었다는 사실이 잊히지 않는다. 우리의 문화 현상의 고정관념이 이들을 부엌으로 몰고 가게 된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진리보다 문화적 정서가 앞선 현상이 교회 안에서도 그 힘을 발휘하고 있다면, 역시 회개할 기도 제목이 아닐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교회에 그루터기는 민들레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시는 분들의 몫인 것 같다. 교회의 허드렛일을 도맡고도 빛을 보지 못하는, 마치 민들레가 사람들의 시선을 오랫동안 고정시키지 못함처럼 말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분들의 희생과 눈물로 이뤄지는 주님의 경륜을 인간의 지혜로 다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이런 분들의 영성에 풍성한 지혜로 응답하심에 큰 위로를 삼는다.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