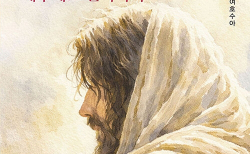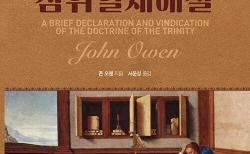오랜 만에 누군가를 만나는 일은 가슴 떨리는 기쁨이면서 동시에 괜한 부담이 되곤 합니다. 어떻게 변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기대 때문에 가슴이 떨리고, 또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는 것 때문에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예기치 못한 이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대학입학 30주년을 기념하는 모임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1977년에 대학에 들어갔으니 올해로 30주년이 되는 해가 됩니다.
목회 길에 들어서면서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니 대학 동창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4년을 함께 지냈던 그 친구들 소식과 이제 50대에 접어든 모습들을 보니 지난 세월이 참 빠르다 싶었습니다. 나이는 머리에서부터 온다고 하더니 비록 사진이긴 하지만 머리가 다 벗겨져 머리털을 심어야 할 정도가 된 친구들, 벌써 백발이 성성해진 친구들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겉모습은 중년에 한층 가까워 졌지만 이제는 보란 듯한 사회의 중진이 되어 있었습니다. 약력들을 보니 대학의 교수로 있는 친구들이 20여명, 대기업의 임원으로 있는 동기들이 30여명, IT 기업의 CEO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동기들이 20여명, 이 친구들이 어느 새 이렇게 되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 자신을 돌아보니 참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괜히 우울해집니다.
다음 날 새벽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내가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여전히 다른 이들과 비교하면서 살고 있구나. 아직도 ‘나’라는 게 살아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침울해하고, 힘들어하는구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버렸다더니 여전히 내 속에 이것들이 남아 있구나... 목사로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인 줄 알고 지금껏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런 일들로 우울해하고 침울해 하나니...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문득 바울 사도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 바울 사도에게도 믿음 지키는 일이 그리도 힘들었던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바울 사도가 그렇게 교회를 위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했습니까? 왜 그토록 힘겹게 달려야 했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다 달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좀더 솔직하게 말한다면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고전 9:27).”바울도 끊임없이 자신의 몸을 쳤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쳤다는 말은 ‘상할 정도로 아프게 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아직 제가 덜 맞은 모양입니다. 얼마나 더 맞아야 복종하게 될는지, 상할 정도로 아프게 때려야 할텐 데 살살 만지기만 하는건지...
최근 예기치 못한 이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대학입학 30주년을 기념하는 모임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1977년에 대학에 들어갔으니 올해로 30주년이 되는 해가 됩니다.
목회 길에 들어서면서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니 대학 동창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4년을 함께 지냈던 그 친구들 소식과 이제 50대에 접어든 모습들을 보니 지난 세월이 참 빠르다 싶었습니다. 나이는 머리에서부터 온다고 하더니 비록 사진이긴 하지만 머리가 다 벗겨져 머리털을 심어야 할 정도가 된 친구들, 벌써 백발이 성성해진 친구들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겉모습은 중년에 한층 가까워 졌지만 이제는 보란 듯한 사회의 중진이 되어 있었습니다. 약력들을 보니 대학의 교수로 있는 친구들이 20여명, 대기업의 임원으로 있는 동기들이 30여명, IT 기업의 CEO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동기들이 20여명, 이 친구들이 어느 새 이렇게 되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 자신을 돌아보니 참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괜히 우울해집니다.
다음 날 새벽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내가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여전히 다른 이들과 비교하면서 살고 있구나. 아직도 ‘나’라는 게 살아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침울해하고, 힘들어하는구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버렸다더니 여전히 내 속에 이것들이 남아 있구나... 목사로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인 줄 알고 지금껏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런 일들로 우울해하고 침울해 하나니...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문득 바울 사도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 바울 사도에게도 믿음 지키는 일이 그리도 힘들었던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바울 사도가 그렇게 교회를 위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했습니까? 왜 그토록 힘겹게 달려야 했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다 달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좀더 솔직하게 말한다면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고전 9:27).”바울도 끊임없이 자신의 몸을 쳤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쳤다는 말은 ‘상할 정도로 아프게 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아직 제가 덜 맞은 모양입니다. 얼마나 더 맞아야 복종하게 될는지, 상할 정도로 아프게 때려야 할텐 데 살살 만지기만 하는건지...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