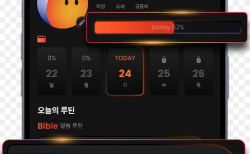내가 교회에 처음 나간 것은 초등학교 5학년 무렵이었다. 그 무렵 나는 이리(지금의 익산)에 살고 있었다. 당시 이리는 교통의 요지였다. 하지만 교회에 열심히 다닌 것은 아니었고, 그저 그런 수준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는 빗나가기 시작했다. 이리가 교통의 요지인지라 불량배들도 많았는데, 나는 자연스럽게 이런 류들과 어울려 다니게 됐다. 자연스레 교회와는 점점 멀어지게 됐다.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기에, 나는 뭔가 해야 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것은 권투였다. 권투와는 어울리지 않는 작달막한 체구였던 나는 가장 낮은 체급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는 도(전라북도) 대표로 나가 뛸 만큼 실력도 괜찮았다.
2학년이 돼서 참가한 전국대회, 1차전은 충남 대표와의 일전이었다. 결과는 판정승. 하지만 서울 대표와의 다음 시합에서는 끝내 패하고 말았다. 지방 출신의 한계를 절감하고, 나는 큰 좌절을 겪었다.
그후 이사를 하게 됐다. 6•25 직후였던 그때, 우리가 이사간 곳은 나중에 알게 됐지만, <탁류>를 썼던 소설가 채만식 선생이 살던 집이었다. 우리는 갈 곳이 없어 초가삼간으로 도망치듯 이사간 것이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의 운명 같은 것이었다. 당시만 해도 나는 소설가가 되리라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글 쓰는 걸 싫어하는 것은 아니었다.
소설가가 살던 집이라 그런지 남아 있는 책이 많았다. 심심해서 한 권씩 꺼내보았다. 처음에는 두 장을 채 넘기지 못하고 덮어버렸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여 두 권을 읽게 됐다. 그러자 마치 나는 눈을 다시 뜬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작가가 되어서 밥 벌어먹고 살자’는 생각이 든 것도 이때였다. 지금 생각해 보면, 문학이 나를 구원한 것이었다. 하지만 내 영혼은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었고, 교회는 나에게 너무나 먼 존재였다. 그런 나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왔다.
일이 있어 군산을 찾아가는데, 내 귓가에 교회 종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늘 울리는 종소리가 그날엔 유난히 내 귀를 관통하듯 크게 울리고 있었다. 교회 이름은 신광교회였다. ‘군산으로 갈까? 아니면 교회를 가야 하나’ 내 마음은 갈등하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앞을 가렸다. <계속>
그러던 어느 날,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는 빗나가기 시작했다. 이리가 교통의 요지인지라 불량배들도 많았는데, 나는 자연스럽게 이런 류들과 어울려 다니게 됐다. 자연스레 교회와는 점점 멀어지게 됐다.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기에, 나는 뭔가 해야 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것은 권투였다. 권투와는 어울리지 않는 작달막한 체구였던 나는 가장 낮은 체급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는 도(전라북도) 대표로 나가 뛸 만큼 실력도 괜찮았다.
2학년이 돼서 참가한 전국대회, 1차전은 충남 대표와의 일전이었다. 결과는 판정승. 하지만 서울 대표와의 다음 시합에서는 끝내 패하고 말았다. 지방 출신의 한계를 절감하고, 나는 큰 좌절을 겪었다.
그후 이사를 하게 됐다. 6•25 직후였던 그때, 우리가 이사간 곳은 나중에 알게 됐지만, <탁류>를 썼던 소설가 채만식 선생이 살던 집이었다. 우리는 갈 곳이 없어 초가삼간으로 도망치듯 이사간 것이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의 운명 같은 것이었다. 당시만 해도 나는 소설가가 되리라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글 쓰는 걸 싫어하는 것은 아니었다.
소설가가 살던 집이라 그런지 남아 있는 책이 많았다. 심심해서 한 권씩 꺼내보았다. 처음에는 두 장을 채 넘기지 못하고 덮어버렸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여 두 권을 읽게 됐다. 그러자 마치 나는 눈을 다시 뜬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작가가 되어서 밥 벌어먹고 살자’는 생각이 든 것도 이때였다. 지금 생각해 보면, 문학이 나를 구원한 것이었다. 하지만 내 영혼은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었고, 교회는 나에게 너무나 먼 존재였다. 그런 나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왔다.
일이 있어 군산을 찾아가는데, 내 귓가에 교회 종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늘 울리는 종소리가 그날엔 유난히 내 귀를 관통하듯 크게 울리고 있었다. 교회 이름은 신광교회였다. ‘군산으로 갈까? 아니면 교회를 가야 하나’ 내 마음은 갈등하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앞을 가렸다. <계속>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