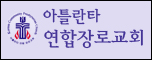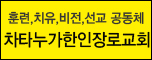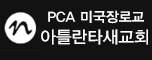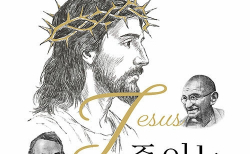수 많은 글들이 비처럼 쏟아졌다. 입 있는 모든 사람이, 손 있는 모든 사람이 마음을 쏟아 놓았다. 비난과 원망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려내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었다. 안타깝고 억울한 이들의 한 맺힌 절규를 알기에 삶에서 웃음을 지웠다.
그 배에서, 나는 우리 아이들의 희망을 보았다. 학원 폭력, 게임 중독으로 철 없고 버릇없는 아이들인 줄만 알았다. 그러나 차가운 바닷물이 목까지 차오르는 순간에도 질서를 지키는 모습, 어린 아이 먼저, 어르신 먼저 구해 내자고 자신의 구명조끼를 풀어 내주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미래 세대를 보았다.
나는 평범한 소시민이 영웅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았다. 죽음 앞에서는 체면이나 나이 따위 생각지 않고 다들 저 먼저 살려고 아비규환을 이룰 줄 알았다. 당연히 그럴 줄 알았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목숨을 내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직도 이 땅에, 이 나라에 있다는 것을 보았다.
그 배에서 책임을 저버린 사람을 보았다. 저 먼저 살겠다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을 때 얼마나 큰 재앙이 일어나는지 보았다. 선장과 선원들이 배와 함께 장렬히 최후를 마치는 영화 같은 장면을 보기를 원했던 것은 아니다. 그들도 탈출할 수 있고, 살 권리가 있다. 그러나 탈출하기 전까지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했으면 이렇게 원망스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자리를 지키라고 명령하며, 있어야 할 자리에서 제일 먼저 떠났다.
또한 위로 받아야 할 실종자 가족들이 구조 전문가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착잡하게 바라 보았다. 그들은 시간과 싸우며 더불어 구조 당국과 싸워야 했다. 바다가 뭔지도 모르는 가족들이 구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오징어 잡이 어선으로 불을 밝혀달라, 바지선을 대서 구조요원들을 쉬게 해 달라, 표면 공기 공급방식의 잠수 장비를 사용해 달라 요구했다. 당연한 요구조건을 허락받기 위해서 밤새 총리의 차를 막아 서야만 했고,청와대까지 걸어가려고 했다. 정부는 그들이 마음껏 목 놓아 울 수 있게도 해 주지 못했다.
그리고 실종자, 유가족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국민을 보았다. 더 이상 쌓아 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끊임없이 밀려드는 구호품 택배 박스를 보았고, 생업을 포기하고 먼 길을 한걸음에 내달려온 자원봉사자의 모습을 보았다. 안타까운 소식들에 밤을 지새고 빨간 눈으로 출근하는 이름 모를 직장인들을 보았다.
나는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책임지는 자리가 아니라 준엄한 심판대에 올라 앉아 다른 이들의 책임을 묻겠다고 호통치는 모습을 보았다. 아직 생명의 불이 꺼지지 않은 그날 밤, 사고대책 상황실에서 치킨을 뜯어 먹고 있는 안전 행정부 장관의 기름진 입을 보았다.
의료물품이 가득한 테이블을 치우고 실종자 가족들 옆에서 라면을 먹고 있는 교육부 장관과 그 라면에 계란이 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가 중요한 청와대 대변인을 보았다. 사망자 명단 앞에서 인증 사진을 찍으려는 고위 공직자와 국민의 절규가 아니라 대통령의 한 마디가 무서워 덜덜 떠는 공무원을 보았다.
나는 그 곳에서 약자를 물어뜯는 하이에나 같은 언론을 보았다. 시청률을 위해서라면 기자윤리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는 언론, 정부가 뿌려주는 보도 자료를 그대로 베껴 쓰는 복사기 언론을 보았다. 실낱간은 희망을 붙잡은 가족들에게 사망자의 보험금 액수와 물에 빠진 휴대폰은 20만원을 보상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는 친절한 언론을 보았다.
또한 그럴 줄 알았지만 정말 그런 정치인을 보았다. 자신의 정당에 피해가 올까 봐 지방 선거에 불리해 질까 봐 편가르기, 종북 선동세력을 운운하는 정치인을 보았다. 바닥에서부터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나선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당선도 아니고 후보자로 지명되었다는 것에 감격하여 헹가래를 치고 폭탄주를 마시는 모습을 보았다.
지난 겨울이 그렇게 춥더니, 침묵의 봄이 찾아 왔다. 잊지 않으면 살아 있는 것이지? 그저 볼 수만 없는 것뿐이지? 기억할 것이다, 그들이 가장 행복해 했던 그 순간을. 마음에 쓰면 세월의 물에 씻겨 흐를까 봐 이렇게 글로 적어 놓는다.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는 침묵의 봄을 강요 받지 않기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