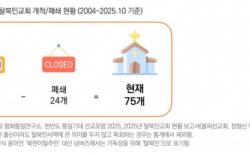(대구=연합뉴스) 대구 스타디움을 밝게 비춰줘야 할 숱한 별들이 잇달아 유성처럼 떨어지는 이변이 30일 밤에도 계속됐다. 제13회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막 나흘째인 이날 최대 비운의 주인공은 옐레나 이신바예바(29·러시아)였다. 세계기록을 27차례나 갈아치우고 5m6까지 기록을 끌어올린 이신바예바는 여자 장대높이뛰기 결승에서 4m65를 넘는 데 그쳐 6위로 대회를 마감했다.
 2009년 베를린 세계대회에서 한 번도 바를 넘지 못하고 실격당했던 이신바예바는 이번 대회에서 명예회복을 노렸으나 4m65만 한 차례 넘었을 뿐 승부수를 던졌던 4m75와 4m80에서 모두 실패해 쓸쓸히 짐을 쌌다. 이신바예바는 마지막 시도에서는 바도 넘지 못하고 그대로 매트에 착지한 뒤 관중에게 손을 흔드는 것으로 애써 아쉬움을 달랬다. 2009년 충격적인 실패를 겪은 이후 내리막을 탔던 이신바예바는 기량이 급속히 쇠퇴해 최근에는 5m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다. 자신을 지금의 대스타로 키운 예브게니 트로피모프 코치의 품에 4년 만에 돌아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자세로 이번 대회를 준비했지만 한번 떨어진 기량을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009년 베를린 세계대회에서 한 번도 바를 넘지 못하고 실격당했던 이신바예바는 이번 대회에서 명예회복을 노렸으나 4m65만 한 차례 넘었을 뿐 승부수를 던졌던 4m75와 4m80에서 모두 실패해 쓸쓸히 짐을 쌌다. 이신바예바는 마지막 시도에서는 바도 넘지 못하고 그대로 매트에 착지한 뒤 관중에게 손을 흔드는 것으로 애써 아쉬움을 달랬다. 2009년 충격적인 실패를 겪은 이후 내리막을 탔던 이신바예바는 기량이 급속히 쇠퇴해 최근에는 5m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다. 자신을 지금의 대스타로 키운 예브게니 트로피모프 코치의 품에 4년 만에 돌아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자세로 이번 대회를 준비했지만 한번 떨어진 기량을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신바예바의 부진은 그가 풍미했던 한 시대의 종언을 의미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다른 선수와의 경쟁보다는 자신과의 싸움을 즐겼던 이신바예바가 더는 신기록을 써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2013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를 끝으로 은퇴하겠다고 못을 박은 이신바예바가 내년 런던올림픽에서는 상처받은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기대를 걸었던 '단거리 황제' 우사인 볼트(25·자메이카)와 이신바예바가 각각 남자 100m에서 실격과 성적 부진으로 참담한 성적표를 안으면서 대회 흥행에도 큰 차질이 빚어졌다. 라이벌인 제러미 워리너가 발가락 부상으로 불참하면서 대회 2연패에 한 발짝 다가섰던 라숀 메리트(25·미국)도 남자 400m에서 19살 신예 키러니 제임스(그레나다)에게 일격을 당했다.
주니어 무대에서 200m와 400m를 휩쓸었던 제임스는 처음 출전하는 성인 메이저대회인 이번 대회에서 메리트에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며 세대교체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임스는 4코너 직선 주로 초반까지 메리트에게 뒤졌으나 결승선을 50m 남겨둔 지점부터 불꽃 스퍼트를 뿜어내 막판에 체력이 떨어진 메리트를 0.03초 차로 제치고 1위로 골인했다. 대회 직전까지 제임스는 44초60의 시즌 최고 기록을 보유했으나 메리트가 이번 대회 1회전에서 44초35로 기록을 단축하며 제임스를 앞서는 듯했다. 그러나 제임스는 결승에서 일찍부터 속도를 낸 메리트와 달리 막판 직선 주로에서 승부수를 던졌고 보기 좋게 역전드라마를 썼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통해 볼트가 세계 최고 스프린터로 성장했듯 제임스 역시 이번 대회를 발판 삼아 400m의 새 강자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종목별 절대 강자가 사라지면서 이번 대회 금메달의 주인공은 전면 새 얼굴로 교체됐다. 이날까지 전체 금메달 47개 중 20개의 주인공이 결정된 가운데 대회 2연패 또는 연속 우승에 성공한 선수는 한 손에 꼽을 정도다.
남자 경보 20㎞의 발레리 보르친(러시아), 남자 원반던지기의 로베르트 하르팅(독일)과 남자 10종 경기의 트레이 하디(미국), 여자 멀리뛰기의 브리트니 리즈(미국)와 3연패를 달성한 여자 포환던지기의 발레리 애덤스(뉴질랜드)가 거센 도전을 이겨내고 대구에서도 영광을 이어갔다.
반면 새로운 신데렐라가 탄생하면서 세계선수권대회 첫 금메달이라는 선물을 안은 나라도 많다. 그레나다를 필두로 브라질(여자 장대높이뛰기), 보츠와나(여자 400m)가 육상에서도 금맥을 캔 국가의 반열에 올라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