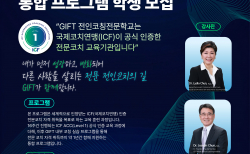유태인에게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다.(주위에서 자기는 누구의 몇대손이니 하면서 은근히 아니꼽게 구는 작자가 있으면 한번 응용해 보라.)
어느날 집안(혈통)이 좋은 여우와 천한 여우가 길에서 만났다. 집안이 좋은 여우가 자기 집안 자랑을 장황히 늘어 놓았다. 그러자 다른 여우가 대답했다. “당신의 집안은 당신으로서 끝이지만 우리 집안은 내가 시작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어느 집안에서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 물론 생물학적인 “우등”과 “열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간은 동물과 달라서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잡힌바 되고 개인적인 노력에 의해 얼마든지 인생역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출생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기에 더욱 그러하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 왔는가 하는 현재의 사는 모습이 훨씬 중요하다.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기독교인의 실제의 삶은 세상나라와 하늘에 속한 나라 두 가지의 세계를 동시에 충실하게 사는 생활인 것이다. Alex Vidler는 이런 스타일의 삶을 가리켜 “거룩한 세속성(Holy Worldliness)”이라고 표현하였다. 기독교인의 삶의 특성은 세상으로부터의 초연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개입을 지닌 동전의 양면과 같은 생활을 지녀야 하는 특성을 가졌다는 말이다. 즉 세상에 대한 욕구를 덜 가지는 동시에 비기독교인보다는 더 깊은 영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오늘의 기독교인의 공동체인 교회는 이 세상에 대하여 넉넉히 초연하지도 못하고 더불어 충분히 관심을 가지지도 못한다. 교회의 이러한 부실은 교회가 세상과 너무 동일시되어서 세상에 대해 아무 말도 못하고, 또 세상에서 너무 떨어져 있기에 역시 세상에 대해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대로 지내야 하는가? 물론 아니다.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만물의 역사와 인간 생활의 모든 분야는 하나님의 절대통치 안에 있다. 그리고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사역에 협력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세상의 복음화와 세상 문명, 이 두가지에 관심을 갖고 주어진 역활에 충실하여야 한다. 결국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하나님나라 건설의 기지이고 기독교인은 도구이기에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그 세상에 봉사하는 일, 즉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순수한 것들을 제공하는 일과 그들에게 한잔의 물을 떠 주는 일과의 사이에서 항상 긴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것을 분리해서는 안되며 분리할 수도 없다. 때문에 올바른 사역 장소를 위해 부단히 살피는 노력이 요구된다.
부활절을 보내면서 새로이 삶의 각오를 다져본다. 부활은 새 창조의 벽두에 서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을 새로이 개시한다는 “새 출발”의 의미이다. 기독교인은 부활 이전에 시작된 모든 것들을 소제하고 소망과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시시각각으로 부활하여야 한다. 사랑의 행위, 동정심을 발휘하는 행위, 희생하는 행위 이 모든 것은 부활의 행위요, 게으른 행위, 이기주의적 행위, 기회주의적 행위, 탐심의 행위 등은 죽음의 행위이다. 우리는 항시 부활이냐 죽음이냐 하는 행위를 순간 순간마다 선택하며 살아가야만 한다. 쉽지 않은 삶이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여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삶은 어제보다 좀더 나은 어떤 삶이 아니라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이다. 그의 나라는 진보된 나라가 아니라 변화된 나라다. 보다 살기 좋아진 나라가 아니라 뿌리채 달라진 세상이다. 즉 “좋아진 것”이 아니라 “달라진 것”이다.
“선생님” 정도로 생각했던 예수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제자들은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었다. 우리도 2011년 “부활절”을 통해서 변화된 심령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갔으면 한다.
어느날 집안(혈통)이 좋은 여우와 천한 여우가 길에서 만났다. 집안이 좋은 여우가 자기 집안 자랑을 장황히 늘어 놓았다. 그러자 다른 여우가 대답했다. “당신의 집안은 당신으로서 끝이지만 우리 집안은 내가 시작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어느 집안에서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 물론 생물학적인 “우등”과 “열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간은 동물과 달라서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잡힌바 되고 개인적인 노력에 의해 얼마든지 인생역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출생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기에 더욱 그러하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 왔는가 하는 현재의 사는 모습이 훨씬 중요하다.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기독교인의 실제의 삶은 세상나라와 하늘에 속한 나라 두 가지의 세계를 동시에 충실하게 사는 생활인 것이다. Alex Vidler는 이런 스타일의 삶을 가리켜 “거룩한 세속성(Holy Worldliness)”이라고 표현하였다. 기독교인의 삶의 특성은 세상으로부터의 초연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개입을 지닌 동전의 양면과 같은 생활을 지녀야 하는 특성을 가졌다는 말이다. 즉 세상에 대한 욕구를 덜 가지는 동시에 비기독교인보다는 더 깊은 영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오늘의 기독교인의 공동체인 교회는 이 세상에 대하여 넉넉히 초연하지도 못하고 더불어 충분히 관심을 가지지도 못한다. 교회의 이러한 부실은 교회가 세상과 너무 동일시되어서 세상에 대해 아무 말도 못하고, 또 세상에서 너무 떨어져 있기에 역시 세상에 대해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대로 지내야 하는가? 물론 아니다.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만물의 역사와 인간 생활의 모든 분야는 하나님의 절대통치 안에 있다. 그리고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사역에 협력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세상의 복음화와 세상 문명, 이 두가지에 관심을 갖고 주어진 역활에 충실하여야 한다. 결국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하나님나라 건설의 기지이고 기독교인은 도구이기에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그 세상에 봉사하는 일, 즉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순수한 것들을 제공하는 일과 그들에게 한잔의 물을 떠 주는 일과의 사이에서 항상 긴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것을 분리해서는 안되며 분리할 수도 없다. 때문에 올바른 사역 장소를 위해 부단히 살피는 노력이 요구된다.
부활절을 보내면서 새로이 삶의 각오를 다져본다. 부활은 새 창조의 벽두에 서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을 새로이 개시한다는 “새 출발”의 의미이다. 기독교인은 부활 이전에 시작된 모든 것들을 소제하고 소망과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시시각각으로 부활하여야 한다. 사랑의 행위, 동정심을 발휘하는 행위, 희생하는 행위 이 모든 것은 부활의 행위요, 게으른 행위, 이기주의적 행위, 기회주의적 행위, 탐심의 행위 등은 죽음의 행위이다. 우리는 항시 부활이냐 죽음이냐 하는 행위를 순간 순간마다 선택하며 살아가야만 한다. 쉽지 않은 삶이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여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삶은 어제보다 좀더 나은 어떤 삶이 아니라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이다. 그의 나라는 진보된 나라가 아니라 변화된 나라다. 보다 살기 좋아진 나라가 아니라 뿌리채 달라진 세상이다. 즉 “좋아진 것”이 아니라 “달라진 것”이다.
“선생님” 정도로 생각했던 예수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제자들은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었다. 우리도 2011년 “부활절”을 통해서 변화된 심령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갔으면 한다.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