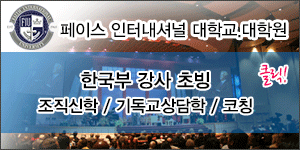이어령 박사는 다양한 각도에서 인문학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의 강연은 예수님과 신앙의 이야기로 자연스레 옮겨가고 있었다. 그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인문학 이야기하다 왜 자꾸 예수님을 얘기합니까? 하늘의 말씀과 땅의 말씀이 있는데, 경영학이나 정치학 이런 건 땅의 말이지요. 하늘의 말씀과 가장 가까운 게 인문학입니다. 은유(metaphor)를 씁니다. 사랑, 믿음과 같이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건 반드시 인문학적 방식을 쓰죠.”
그가 무신론자로 살아왔던 건, 엄혹한 세월을 거쳤기 때문이다. “6·25가 끝나고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당신이 만든 하늘, 당신이 만든 햇빛, 저 찬란한 별들, 보는 것만으로도 기적인데 왜 저 아이의 숨을 거둬 가십니까?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그래서 어린 시절 ‘지적인 교만’으로 목사님들을 골려주기도 했단다.
광야의 시험과 오병이어의 ‘모순’?
이어령 박사는 우리가 종교를 아주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고 했다. 마귀가 돌을 내놓으면서 빵으로 만들어보라고 한, 마지막 유혹 이야기다. “예수님이 그때 ‘좋다, 만들어 볼께’ 했다면, 예수님은 오늘날 무슨 바이오 연구가나 경제학자가 됐겠지요. 돌을 갖고 부가가치인 빵을 만들어낸 사람으로….”
예수는 먹고 다시 배고픈 빵이 아니라, 먹으면 죽지 않는 빵을 주고자 했다. 부자 되고 배부른 얘기가 아니라 먹으면 죽지 않는 영원의 빵, 말씀을 말씀하고 계셨지만, 가장 아끼던 제자들조차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꾸 와서 이 많은 사람들 먹일 음식이 없다고 걱정했다.
“교회에서 제발 오병이어 말하지 말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쓸쓸하시겠어요. 자꾸 빵 먹자고 하니, 이런 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데, 돌 갖고 빵 만드는 건 하수 중의 하수인데, ‘좋다, 가져와라’ 하신 거에요. 5천명을 먹이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를 잘못 해석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돌덩어리로 5천명을 먹이는 권능을 가진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사인(sign)이지요. 목적은 그 빵이 아니라 죽지 않는 빵,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던 사람은 다 죽었다. 생명의 떡이 여기 있는데, 왜 너희들은 먹고 죽을 떡만 찾아다니느뇨.’”
말씀을 인문학으로 바꿔 보자. 자본주의, 실용적인 건 돌을 빵으로 만드는 거지만, 인문학은 죽지 않는 최고의 빵을 만드는 사람이다. ‘오병이어’의 기적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몰려들었지만, 예수님은 ‘저들이 왕 되라 할까 무섭다’며 산으로 피하셨다.
인문학은 예수님 손의 ‘못자국’ 같은 것
마귀는 모든 왕국을 주겠다고 한 번만 경배하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셨다. 그런데, 오늘은 오히려 거꾸로 됐다. 지상의 왕국을 준다고 하면 경배하려 한다. 그런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학생들 여러분이 살고 있다. 크리스천이 되고, 독실해지라는 얘기 하려는 게 아니다.
그런 패러다임, 죽는 빵과 죽지 않는 빵만 안다면 인문학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인문학적 공학가, 정치가, CEO 될 수 있다. 그러면 원치 않아도 돈이 생기고 축복이 온다. 열두 제자들을 보라. 왕한테는 안 빌어도, 그들한테는 모두 와서 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
인문학은 머리로 생각하고, 온리 원(Only One)이고, 생명가치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믿고 따랐는데 도마가 ‘증명할 수 있느냐’고 하자 손을 내미셨다. 마리아가 만지려 했을 땐 ‘인간의 손으로 더럽히지 마라’신 예수님이 ‘만져보라’ 하셨다. 손에 못자국이 남아있었다. 그때 도마가 엎드리고, 당신을 믿는다고 했다. 그 순간은 논리고 뭐고 필요없다. 엎드리고 모든 걸 내던져 복음을 전했다.
지적으로 약삭빠르고 매사 따지기 좋아하던 도마가 어떻게 변화돼 열두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처절하게 순교했겠는가. 그렇듯 인문학자들은 과학자들보다 삶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다. 모든 수난과 어려움을 물리칠 수 있다. 인문학자들에게는 그분의 못자국처럼 누구나 그런 상처가 있다. 구체적인 상흔이 있어 도마라도 만져볼 수 있다. 어렵지 않다. 시를 읽고, 소설을 읽고, 인문학을 읽었을 때 감동이 없다면 학문이 아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랍비나 제사장, 레위 족속들처럼 살았다면 지금 2천년 이상 이어져 온 새 종교는 시작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종교로 보지 않고 예수로 봤을 때 ‘하나 밖에 없던 사람’ 이렇게 본다면, 종교 하나만이 아니라 인문학자가 되건 뭐가 되건 결국 ‘인문학자’가 되는 길입니다. 어려운 길이지만….”
“인문학 이야기하다 왜 자꾸 예수님을 얘기합니까? 하늘의 말씀과 땅의 말씀이 있는데, 경영학이나 정치학 이런 건 땅의 말이지요. 하늘의 말씀과 가장 가까운 게 인문학입니다. 은유(metaphor)를 씁니다. 사랑, 믿음과 같이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건 반드시 인문학적 방식을 쓰죠.”
그가 무신론자로 살아왔던 건, 엄혹한 세월을 거쳤기 때문이다. “6·25가 끝나고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당신이 만든 하늘, 당신이 만든 햇빛, 저 찬란한 별들, 보는 것만으로도 기적인데 왜 저 아이의 숨을 거둬 가십니까?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그래서 어린 시절 ‘지적인 교만’으로 목사님들을 골려주기도 했단다.
광야의 시험과 오병이어의 ‘모순’?
이어령 박사는 우리가 종교를 아주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고 했다. 마귀가 돌을 내놓으면서 빵으로 만들어보라고 한, 마지막 유혹 이야기다. “예수님이 그때 ‘좋다, 만들어 볼께’ 했다면, 예수님은 오늘날 무슨 바이오 연구가나 경제학자가 됐겠지요. 돌을 갖고 부가가치인 빵을 만들어낸 사람으로….”
예수는 먹고 다시 배고픈 빵이 아니라, 먹으면 죽지 않는 빵을 주고자 했다. 부자 되고 배부른 얘기가 아니라 먹으면 죽지 않는 영원의 빵, 말씀을 말씀하고 계셨지만, 가장 아끼던 제자들조차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꾸 와서 이 많은 사람들 먹일 음식이 없다고 걱정했다.
“교회에서 제발 오병이어 말하지 말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쓸쓸하시겠어요. 자꾸 빵 먹자고 하니, 이런 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데, 돌 갖고 빵 만드는 건 하수 중의 하수인데, ‘좋다, 가져와라’ 하신 거에요. 5천명을 먹이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를 잘못 해석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돌덩어리로 5천명을 먹이는 권능을 가진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사인(sign)이지요. 목적은 그 빵이 아니라 죽지 않는 빵,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던 사람은 다 죽었다. 생명의 떡이 여기 있는데, 왜 너희들은 먹고 죽을 떡만 찾아다니느뇨.’”
말씀을 인문학으로 바꿔 보자. 자본주의, 실용적인 건 돌을 빵으로 만드는 거지만, 인문학은 죽지 않는 최고의 빵을 만드는 사람이다. ‘오병이어’의 기적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몰려들었지만, 예수님은 ‘저들이 왕 되라 할까 무섭다’며 산으로 피하셨다.
인문학은 예수님 손의 ‘못자국’ 같은 것
마귀는 모든 왕국을 주겠다고 한 번만 경배하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셨다. 그런데, 오늘은 오히려 거꾸로 됐다. 지상의 왕국을 준다고 하면 경배하려 한다. 그런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학생들 여러분이 살고 있다. 크리스천이 되고, 독실해지라는 얘기 하려는 게 아니다.
그런 패러다임, 죽는 빵과 죽지 않는 빵만 안다면 인문학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인문학적 공학가, 정치가, CEO 될 수 있다. 그러면 원치 않아도 돈이 생기고 축복이 온다. 열두 제자들을 보라. 왕한테는 안 빌어도, 그들한테는 모두 와서 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
인문학은 머리로 생각하고, 온리 원(Only One)이고, 생명가치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믿고 따랐는데 도마가 ‘증명할 수 있느냐’고 하자 손을 내미셨다. 마리아가 만지려 했을 땐 ‘인간의 손으로 더럽히지 마라’신 예수님이 ‘만져보라’ 하셨다. 손에 못자국이 남아있었다. 그때 도마가 엎드리고, 당신을 믿는다고 했다. 그 순간은 논리고 뭐고 필요없다. 엎드리고 모든 걸 내던져 복음을 전했다.
지적으로 약삭빠르고 매사 따지기 좋아하던 도마가 어떻게 변화돼 열두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처절하게 순교했겠는가. 그렇듯 인문학자들은 과학자들보다 삶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다. 모든 수난과 어려움을 물리칠 수 있다. 인문학자들에게는 그분의 못자국처럼 누구나 그런 상처가 있다. 구체적인 상흔이 있어 도마라도 만져볼 수 있다. 어렵지 않다. 시를 읽고, 소설을 읽고, 인문학을 읽었을 때 감동이 없다면 학문이 아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랍비나 제사장, 레위 족속들처럼 살았다면 지금 2천년 이상 이어져 온 새 종교는 시작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종교로 보지 않고 예수로 봤을 때 ‘하나 밖에 없던 사람’ 이렇게 본다면, 종교 하나만이 아니라 인문학자가 되건 뭐가 되건 결국 ‘인문학자’가 되는 길입니다. 어려운 길이지만….”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