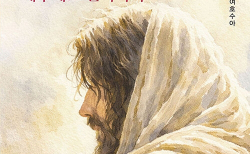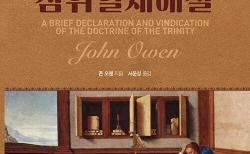그 날 밤에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밤잠을 설친 나는 어머니가 지어주신 새벽밥을 먹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겨울 바람을 맞으며 읍내로 향했다. 얼마 전에 치른 중학교 입시 합격자 발표 날이었기 때문이다.
시린 겨울 추위로 코끝이 빨갛게 된 채 학교에 도착하니 합격자 명단이 붙은 게시판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 중에 어떤 학부모들은 합격자 명단에서 아들의 이름을 발견해서인지 서로 끌어안고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나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친구와 함께 어른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내 수험번호를 찾기 시작했다.
298, 300, 301, 303,......, 317,3 18, 321... 나는 긴장된 눈으로 수험번호를 더듬어 내려갔다. 수험번호 322번 박완주. 너무도 분명한 내 이름 석 자가 거기에 있었다. 나는 너무 너무 좋아서 상기된 얼굴로 같이 간 친구를 찾았다. 그런데 그 친구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친구의 수험번호와 이름을 찾아보니 합격자 명단에 그의 이름이 없었다. 그 친구는 합격자 명단에 자기 이름이 없자 슬그머니 혼자서 집으로 가버린 것이었다.
그후로 대학 입시 때와 대학원 입시 때도 나는 똑같은 경험을 했었다. 확실히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있다는 사실은 어렸을 때나 커서나 똑같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작명가를 찾아가서 많은 돈을 주고 이름을 짓기도 한다. 이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옛날 우리 조상들은 귀한 자손을 볼수록 어렸을 때 천한 이름을 지어줘서 부르게 했다. 개똥이니 쇠돌이니 하는 천한 이름일수록 오래 산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어렸을 때 우리 이웃 집에 사는 애의 이름은 “골목개”였다. 그 애 부모는 내리 딸만 다섯을 낳고 늙으막에 아들을 낳았기에 무병장수하라는 뜻으로 골목개라는 천한 이름을 지어줬다. 사실 그는 아주 좋은 본명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그 본명을 부르면 그의 부모는 저승 사자라도 들을까 봐서인지 호통을 치면서 꼭 “골목개” 혹은 “동네개”라고 부르라고 했다. 그의 아버지는 술이라도 한 잔 하고 들어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동구밖에서부터 “골목개야!”라고 하며 자랑스러운듯이 온 동네가 떠나가게 아들 이름을 불러댔다. 그렇지만 정작 골목개 본인은 그 이름을 너무 너무 싫어해서 다른 애들이 골목개라고 부르면 쫓아가서 때리곤 했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이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고, 네 아내는 사래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고 하셨다.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에게는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하셨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는 그의 약혼녀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다.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셨으며, 사도 요한에게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야곱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신 것이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신 것은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나는 예전에 합격자 명단에서 내 이름 석자를 보고 전율했던 것이 생각날 때마다 그 때 그 희열과 그 감격을 다시 한 번 체험할 날이 내게 남아있음을 감사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그 날을 기다린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 하나님의 보좌 앞에 펼쳐진 생명책에서 내 이름 석자를 발견하게 될 때에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클까? 그 기쁨과 그 감격은 합격자 명단에서 내 이름을 발견했을 때 느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으리! 그러나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합격자 명단에 자기 이름이 없자 기운빠진 모습으로 혼자 줄행랑을 쳐버렸던 예전의 내 친구처럼 슬픔과 탄식이 있으리라.
우리 속담에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는 말이 있다.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들은 다 두고 갈지라도 자기 이름만은 가지고 간다. 한국이고 미국이고,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서류를 작성할 때 제일 먼저 이름을 묻는다. 마찬 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도 제일 먼저 이름을 물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름은 그만큼 귀하고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귀하고 중요한 이름을 서로 다정하게 불러주고 늘 기억해 준다면 세상은 훨씬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에 무고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그 인육까지 먹었다고 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존파 사건의 범인들이 심문을 받으면서 한 말이다. 이제껏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들을 부를 때에 항상 “야 임마!”라고 했다 한다. 분명히 자기들에게도 고유한 이름이 있는데 사람들이 “야 임마!”라고 부를 때에는 너무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죽이고 싶었었다는 고백을 했다.
“야 임마!”라는 말 대신에 그들의 귀한 이름을 불러 주었더라면 지존파라는 무서운 이름은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며,(1994년 목회일기 중에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세월의 고갯마루에서 그 동안에 잊고 살았던 다정한 이름들을 되뇌어 본다. 그리고 순백의 성탄 카드에 그 귀한 이름들을 써본다. 다가올 그 날, 생명책에 기록된 그 명단에서 내 이름 석 자와 함께 그분들의 이름도 발견되기를 소망하며...
시린 겨울 추위로 코끝이 빨갛게 된 채 학교에 도착하니 합격자 명단이 붙은 게시판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 중에 어떤 학부모들은 합격자 명단에서 아들의 이름을 발견해서인지 서로 끌어안고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나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친구와 함께 어른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내 수험번호를 찾기 시작했다.
298, 300, 301, 303,......, 317,3 18, 321... 나는 긴장된 눈으로 수험번호를 더듬어 내려갔다. 수험번호 322번 박완주. 너무도 분명한 내 이름 석 자가 거기에 있었다. 나는 너무 너무 좋아서 상기된 얼굴로 같이 간 친구를 찾았다. 그런데 그 친구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친구의 수험번호와 이름을 찾아보니 합격자 명단에 그의 이름이 없었다. 그 친구는 합격자 명단에 자기 이름이 없자 슬그머니 혼자서 집으로 가버린 것이었다.
그후로 대학 입시 때와 대학원 입시 때도 나는 똑같은 경험을 했었다. 확실히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있다는 사실은 어렸을 때나 커서나 똑같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작명가를 찾아가서 많은 돈을 주고 이름을 짓기도 한다. 이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옛날 우리 조상들은 귀한 자손을 볼수록 어렸을 때 천한 이름을 지어줘서 부르게 했다. 개똥이니 쇠돌이니 하는 천한 이름일수록 오래 산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어렸을 때 우리 이웃 집에 사는 애의 이름은 “골목개”였다. 그 애 부모는 내리 딸만 다섯을 낳고 늙으막에 아들을 낳았기에 무병장수하라는 뜻으로 골목개라는 천한 이름을 지어줬다. 사실 그는 아주 좋은 본명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그 본명을 부르면 그의 부모는 저승 사자라도 들을까 봐서인지 호통을 치면서 꼭 “골목개” 혹은 “동네개”라고 부르라고 했다. 그의 아버지는 술이라도 한 잔 하고 들어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동구밖에서부터 “골목개야!”라고 하며 자랑스러운듯이 온 동네가 떠나가게 아들 이름을 불러댔다. 그렇지만 정작 골목개 본인은 그 이름을 너무 너무 싫어해서 다른 애들이 골목개라고 부르면 쫓아가서 때리곤 했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이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고, 네 아내는 사래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고 하셨다.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에게는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하셨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는 그의 약혼녀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다.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셨으며, 사도 요한에게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야곱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신 것이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신 것은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나는 예전에 합격자 명단에서 내 이름 석자를 보고 전율했던 것이 생각날 때마다 그 때 그 희열과 그 감격을 다시 한 번 체험할 날이 내게 남아있음을 감사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그 날을 기다린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 하나님의 보좌 앞에 펼쳐진 생명책에서 내 이름 석자를 발견하게 될 때에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클까? 그 기쁨과 그 감격은 합격자 명단에서 내 이름을 발견했을 때 느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으리! 그러나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합격자 명단에 자기 이름이 없자 기운빠진 모습으로 혼자 줄행랑을 쳐버렸던 예전의 내 친구처럼 슬픔과 탄식이 있으리라.
우리 속담에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는 말이 있다.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들은 다 두고 갈지라도 자기 이름만은 가지고 간다. 한국이고 미국이고,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서류를 작성할 때 제일 먼저 이름을 묻는다. 마찬 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도 제일 먼저 이름을 물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름은 그만큼 귀하고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귀하고 중요한 이름을 서로 다정하게 불러주고 늘 기억해 준다면 세상은 훨씬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에 무고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그 인육까지 먹었다고 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존파 사건의 범인들이 심문을 받으면서 한 말이다. 이제껏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들을 부를 때에 항상 “야 임마!”라고 했다 한다. 분명히 자기들에게도 고유한 이름이 있는데 사람들이 “야 임마!”라고 부를 때에는 너무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죽이고 싶었었다는 고백을 했다.
“야 임마!”라는 말 대신에 그들의 귀한 이름을 불러 주었더라면 지존파라는 무서운 이름은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며,(1994년 목회일기 중에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세월의 고갯마루에서 그 동안에 잊고 살았던 다정한 이름들을 되뇌어 본다. 그리고 순백의 성탄 카드에 그 귀한 이름들을 써본다. 다가올 그 날, 생명책에 기록된 그 명단에서 내 이름 석 자와 함께 그분들의 이름도 발견되기를 소망하며...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