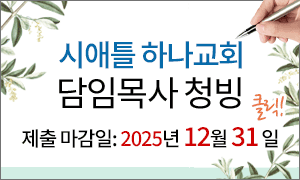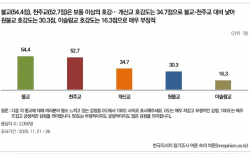신학대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은 머슴도 안 살아봤나?(다산글방, 한희철)>는 책을 만났습니다. ‘단강’이라는 시골 마을에서 목회하는 선배 목사님의 따스한 글은 진리에 목마른 신학생에게 잔잔한 파도를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아! 글과 삶이 모두 너무 아름답다. 나도 이런 목회를 하면 좋겠다.’ 많지 않은 성도들이지만 ‘편안함’이 아닌 ‘평안함’을 구하는 그 모습이, ‘화려함’을 버리고 ‘신실함’을 추구하는 아름다운 목회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서점에서 <작은 교회 이야기>라는 제목을 대하게 되었는데, 저자가 ‘한희철’ 목사님인 겁니다. 너무 반가운 마음에 책을 읽었고, 그 세심하고 따스한 글이 변치 않았다는 것과 신학생 시절 반가웠던 글씨체와 문서들을 보며 옛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이 책을 통해 ‘단강’의 위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한강을 두고 강원도와 충청북도와 경기도가 서로 만나는 외진 곳. 창립예배를 마치고 작은 골방 문 위에 이렇게 글을 써 붙입니다. “소유는 적으나, 존재는 넉넉하게.”
주일 예배를 10시에 드립니다. 그 시간에 새참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일하다 새참 시간이 되면 새참을 먹지 않고 예배당으로 달려와 예배드리는 교우들이 있답니다. 흙투성이 몸으로 차마 예배당(그래야 작은 방이지만)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문 밖에 선 채로 잠깐 예배에 참석하는 교우들! 피곤한 몸으로 ‘주일 예배 빼먹은 죄인’임을 고백하며 저녁예배에 오지만, 밀려드는 졸음을 쫓기 위해 허벅지를 꼬집고, 그러다 주르르 코피라도 흐르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걸레를 가져다가 코피를 닦는 성도! 그때마다 한희철 목사님은 멍해졌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웃의 아픔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전부일까?’
한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흙물 풀물이 배고 군살이 박힌 손으로 쓰기 시작한 이야기,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한 것은 나 자신을 지키는 자구책이기도 했고, 나를 지지해주는 버팀목이기도 했으며, 안간힘이기도 했습니다. 농촌에 남은 희망이 무엇이냐 묻는 이들에게 절망하지 않는 것이 희망이라 대답했던 것은 그런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깊게 다가온 이유는 지금의 목회지 사역을 시작할 때 저도 그런 다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선후배 목사님들은 “이제 담임목사 되었으니 자유롭겠네.”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 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부목사 사역할 때보다 더 시간을 지키고, 부지런히 사역하겠습니다. 틈틈이 홈페이지에 북 리뷰를 쓰던 것, 이제는 매 주일 주보에 실어서 성도들과 나누겠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책이 아니라, 설교를 위해 제가 매 주일 성경 본문은 물론이고 책을 읽으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2년째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주간에는 너무 풍성해서 책을 선택해야 할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어렵게 그 글을 썼던 것을 기억하며, 한희철 목사님도 그런 힘든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담배 꽃은 참 불행하다. 피기가 무섭게 잘리고 만다. 칼로 낫으로 툭툭 잘리고 만다. 담배에서 필요한 건 오직 잎인지라, 꽃을 잘라 꽃으로 갈 양분을 모두 잎으로 돌리기 위해서이다. 여느 꽃처럼 언제 한번 자세히 보아주는 경우도 없고, 예쁘다고 향내 맡으며 칭찬해주는 사람도 없다. 어느 주일엔가 제단 화병에 담배 꽃이 놓인 적이 있었다. 중학생 경림이와 은희가 꽂아둔 것이었다. 제단에 있는 담배 꽃이라, 왠지 아이러니컬해 보이는 그 모습에 예배를 드리며 자꾸 눈이 그리로 갔는데 그때 불현 듯 마음을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다. ‘잎을 위해 꺾인 꽃’ 어쩜 그리도 담배 꽃은 이 땅 농민들을 닮았는지,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고난 받는 종의 참모습 아닌가. 그렇다. 주님은 꺾이는 모습으로 이 땅에 남아 있었다. 크게 일어나 부흥하고 성장하고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너무도 쉽게 꺾이고 잘리고 만 불쌍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남아 있다. 담배 꽃처럼 잘려 버려진 사람들 곁에, 주님은 바로 그들과 함께 꺾인 모습으로 계셨던 것이다. 꺾인 담배 꽃으로 계신 주님, 단강의 주님이 계신 자리가 바로 그곳이었고, 그 자리야말로 버려진 이웃과 함께 선 뜨거운 자리였다.” 살아가는 모든 모습에 의미를 두며, 은혜를 구하는 한 목사님의 묵상이 참 도전이 됩니다.
이 책은 참 예쁩니다. 어린 시절 시골의 추억을 맛보는 것 같습니다. 1987년 손으로 직접 글을 쓴 주보도 그대로 실려 있고, 아기자기한 단강의 사진들이 계속 펼쳐지고, 사람이 살아가는 땀 냄새도 느껴집니다. “퇴근하는 신 집사님 마음이 무거웠다. 전날 땔감이 떨어졌고, 광이 비어 있는 것을 아침 일찍 출근하면서 확인했기 때문이다. 까짓것 저녁이야 해놓은 찬밥으로 아들 병관이와 대강 먹으면 됐지만 천상 냉방에서 자게 생겼으니, 며칠째 몸이 좋지 않아 힘이 없는 병관이가 더욱 맘에 걸린다. 그러나 어쩌랴. 퇴근길은 이미 땅거미 진 어둘 녘, 밤중에 나무를 할 순 없는 일이었다. 힘없이 집으로 들어선 집사님이 깜짝 놀라고 말았다. 텅 비어 있던 광에 웬걸, 나무가 가득 채워져 있지 않은가. 도깨비에 홀린 듯싶어 껌벅껌벅 눈을 껌벅여 다시 확인해보았지만 분명히 광엔 나무가 가득하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싶어 앞집 안 집사님께 달려가 물으니 사연인즉슨 이러했다. 정경희 씨가 주보를 읽다 신 집사님네 사정을 알게 됐다. 그녀는 작년 말부터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교우이다. 일하러 다니느라 나무할 시간이 없다는 걸 안 정경희 씨가 일부러 신 집사님 집에 들려본 것이다. 역시 그녀의 예상대로 광은 비어 있었다. 남편에게 사정 얘기를 했다. 단강리 반장인 남편 구광태 씨도 부인을 따라 지난 송구영신 때부터 교회에 나오고 있었다. 구광태 씨는 기꺼이 산에 올라 나무를 했고, 지게에 나르기에는 양이 많아 지나가는 경운기를 불러 세웠다. 봄 농사 준비하느라 퇴비를 나르고 돌아가던 길, 운전하던 성일이 삼촌도 기꺼이 일을 도왔다. 두 장정이 일을 하니 까짓 광 하나 채우는 게 어려운 일이겠는가. 금방 광엔 나무가 가득해졌다. 병관이 중학교 입학 준비하러 부론 장에 갔다 오는 길에 신 집사님은 특별히 양말 두 켤레를 샀다. 거듭거듭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구광태 씨에게 전했다. 아름다운 이야기들. 이렇게 알려지면 오히려 당황하게 될 테지만, 작지만 소중한 아름다운 이야기들.”
한희철 목사님, 구광태 씨와 성일이 삼촌 그리고 신 집사님이 조금 당황스럽더라도, 이런 소식은 많이 들려주셔야 합니다. 저와 같은 어리석은 목사가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한 백신들이 순간순간 필요하거든요.
출판을 위해 깨끗하게 인쇄된 글씨체, 한희철 목사님의 주보 손 글씨를 그대로 스캔해 표현한 부분, 목사님과 단강교회를 통해 따스함과 하나님을 느낀 많은 사람들의 고백 글!
아름답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는 우리 하늘뜻섬김교회 가족들도 강남 한복판에서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신실한 삶을 살기를 다시 한 번 소망해 봅니다.
이훈 목사(하늘뜻섬김교회 담임) www.servingod.org
그러다가 최근에 서점에서 <작은 교회 이야기>라는 제목을 대하게 되었는데, 저자가 ‘한희철’ 목사님인 겁니다. 너무 반가운 마음에 책을 읽었고, 그 세심하고 따스한 글이 변치 않았다는 것과 신학생 시절 반가웠던 글씨체와 문서들을 보며 옛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이 책을 통해 ‘단강’의 위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한강을 두고 강원도와 충청북도와 경기도가 서로 만나는 외진 곳. 창립예배를 마치고 작은 골방 문 위에 이렇게 글을 써 붙입니다. “소유는 적으나, 존재는 넉넉하게.”
주일 예배를 10시에 드립니다. 그 시간에 새참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일하다 새참 시간이 되면 새참을 먹지 않고 예배당으로 달려와 예배드리는 교우들이 있답니다. 흙투성이 몸으로 차마 예배당(그래야 작은 방이지만)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문 밖에 선 채로 잠깐 예배에 참석하는 교우들! 피곤한 몸으로 ‘주일 예배 빼먹은 죄인’임을 고백하며 저녁예배에 오지만, 밀려드는 졸음을 쫓기 위해 허벅지를 꼬집고, 그러다 주르르 코피라도 흐르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걸레를 가져다가 코피를 닦는 성도! 그때마다 한희철 목사님은 멍해졌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웃의 아픔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전부일까?’
한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흙물 풀물이 배고 군살이 박힌 손으로 쓰기 시작한 이야기,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한 것은 나 자신을 지키는 자구책이기도 했고, 나를 지지해주는 버팀목이기도 했으며, 안간힘이기도 했습니다. 농촌에 남은 희망이 무엇이냐 묻는 이들에게 절망하지 않는 것이 희망이라 대답했던 것은 그런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깊게 다가온 이유는 지금의 목회지 사역을 시작할 때 저도 그런 다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선후배 목사님들은 “이제 담임목사 되었으니 자유롭겠네.”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 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부목사 사역할 때보다 더 시간을 지키고, 부지런히 사역하겠습니다. 틈틈이 홈페이지에 북 리뷰를 쓰던 것, 이제는 매 주일 주보에 실어서 성도들과 나누겠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책이 아니라, 설교를 위해 제가 매 주일 성경 본문은 물론이고 책을 읽으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2년째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주간에는 너무 풍성해서 책을 선택해야 할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어렵게 그 글을 썼던 것을 기억하며, 한희철 목사님도 그런 힘든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담배 꽃은 참 불행하다. 피기가 무섭게 잘리고 만다. 칼로 낫으로 툭툭 잘리고 만다. 담배에서 필요한 건 오직 잎인지라, 꽃을 잘라 꽃으로 갈 양분을 모두 잎으로 돌리기 위해서이다. 여느 꽃처럼 언제 한번 자세히 보아주는 경우도 없고, 예쁘다고 향내 맡으며 칭찬해주는 사람도 없다. 어느 주일엔가 제단 화병에 담배 꽃이 놓인 적이 있었다. 중학생 경림이와 은희가 꽂아둔 것이었다. 제단에 있는 담배 꽃이라, 왠지 아이러니컬해 보이는 그 모습에 예배를 드리며 자꾸 눈이 그리로 갔는데 그때 불현 듯 마음을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다. ‘잎을 위해 꺾인 꽃’ 어쩜 그리도 담배 꽃은 이 땅 농민들을 닮았는지,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고난 받는 종의 참모습 아닌가. 그렇다. 주님은 꺾이는 모습으로 이 땅에 남아 있었다. 크게 일어나 부흥하고 성장하고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너무도 쉽게 꺾이고 잘리고 만 불쌍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남아 있다. 담배 꽃처럼 잘려 버려진 사람들 곁에, 주님은 바로 그들과 함께 꺾인 모습으로 계셨던 것이다. 꺾인 담배 꽃으로 계신 주님, 단강의 주님이 계신 자리가 바로 그곳이었고, 그 자리야말로 버려진 이웃과 함께 선 뜨거운 자리였다.” 살아가는 모든 모습에 의미를 두며, 은혜를 구하는 한 목사님의 묵상이 참 도전이 됩니다.
이 책은 참 예쁩니다. 어린 시절 시골의 추억을 맛보는 것 같습니다. 1987년 손으로 직접 글을 쓴 주보도 그대로 실려 있고, 아기자기한 단강의 사진들이 계속 펼쳐지고, 사람이 살아가는 땀 냄새도 느껴집니다. “퇴근하는 신 집사님 마음이 무거웠다. 전날 땔감이 떨어졌고, 광이 비어 있는 것을 아침 일찍 출근하면서 확인했기 때문이다. 까짓것 저녁이야 해놓은 찬밥으로 아들 병관이와 대강 먹으면 됐지만 천상 냉방에서 자게 생겼으니, 며칠째 몸이 좋지 않아 힘이 없는 병관이가 더욱 맘에 걸린다. 그러나 어쩌랴. 퇴근길은 이미 땅거미 진 어둘 녘, 밤중에 나무를 할 순 없는 일이었다. 힘없이 집으로 들어선 집사님이 깜짝 놀라고 말았다. 텅 비어 있던 광에 웬걸, 나무가 가득 채워져 있지 않은가. 도깨비에 홀린 듯싶어 껌벅껌벅 눈을 껌벅여 다시 확인해보았지만 분명히 광엔 나무가 가득하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싶어 앞집 안 집사님께 달려가 물으니 사연인즉슨 이러했다. 정경희 씨가 주보를 읽다 신 집사님네 사정을 알게 됐다. 그녀는 작년 말부터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교우이다. 일하러 다니느라 나무할 시간이 없다는 걸 안 정경희 씨가 일부러 신 집사님 집에 들려본 것이다. 역시 그녀의 예상대로 광은 비어 있었다. 남편에게 사정 얘기를 했다. 단강리 반장인 남편 구광태 씨도 부인을 따라 지난 송구영신 때부터 교회에 나오고 있었다. 구광태 씨는 기꺼이 산에 올라 나무를 했고, 지게에 나르기에는 양이 많아 지나가는 경운기를 불러 세웠다. 봄 농사 준비하느라 퇴비를 나르고 돌아가던 길, 운전하던 성일이 삼촌도 기꺼이 일을 도왔다. 두 장정이 일을 하니 까짓 광 하나 채우는 게 어려운 일이겠는가. 금방 광엔 나무가 가득해졌다. 병관이 중학교 입학 준비하러 부론 장에 갔다 오는 길에 신 집사님은 특별히 양말 두 켤레를 샀다. 거듭거듭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구광태 씨에게 전했다. 아름다운 이야기들. 이렇게 알려지면 오히려 당황하게 될 테지만, 작지만 소중한 아름다운 이야기들.”
한희철 목사님, 구광태 씨와 성일이 삼촌 그리고 신 집사님이 조금 당황스럽더라도, 이런 소식은 많이 들려주셔야 합니다. 저와 같은 어리석은 목사가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한 백신들이 순간순간 필요하거든요.
출판을 위해 깨끗하게 인쇄된 글씨체, 한희철 목사님의 주보 손 글씨를 그대로 스캔해 표현한 부분, 목사님과 단강교회를 통해 따스함과 하나님을 느낀 많은 사람들의 고백 글!
아름답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는 우리 하늘뜻섬김교회 가족들도 강남 한복판에서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신실한 삶을 살기를 다시 한 번 소망해 봅니다.
이훈 목사(하늘뜻섬김교회 담임) www.servingod.org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