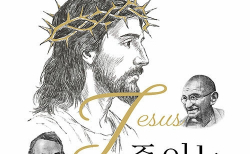(뉴욕=연합뉴스) 미국에서 네바다주(州)는 주택시장의 거품이 빠지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지역이다. 집값이 50개주에서 가장 가파른 속도로 떨어지면서 주택 압류율과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다.
아이오와주는 상황이 좀 다르다. 호경기의 재미는 덜했지만 불경기의 충격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집값은 안정세를 유지했고 실업률은 전국에서 5번째로 낮아졌다.
오하이오주의 경우 경기 침체기에는 일자리 감소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지만, 이후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면서 지금은 실업률이 다시 전국 평균 이하로 떨어졌다.
이들 3개주는 올 연말 미국 대선에서 승패를 결정지을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swing state, 경합주) 9곳에 속하지만 이처럼 각주의 경기 회복 단계는 조금씩 다르다.
뉴욕타임스(NYT)는 6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대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대선 주자로 사실상 확정된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이들 9개 지역에서 얼마나 선전하느냐에 따라 다음 백악관 주인이 결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나머지 6곳은 콜로라도와 플로리다, 뉴햄프셔,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 위스콘신주 등이다. 지난 대선에서는 오바마가 이들 9개주에서 모두 승리했다.
그러나 오바마가 취임한 이후 4년간 경제난 등으로 이 지역 유권자들의 상당수가 민주당에 등을 돌리는 등 정치 지형이 달라지면서 이번에는 과거 어느때보다도 표심의 향방을 잃기가 어려워졌다.
오바마 대통령이 주말인 지난 5일 첫 유세지로 오하이오와 버지니아주(州)를 선택했고, 특히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지금 중산층이 흥망의 기로에 서있다"며 지지를 호소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라고 타임스는 지적했다.
미국 경제의 회복 상황이 이번 대선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좌우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들 9개 지역이 가장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9개 지역의 경제가 4년 전에 비해서는 못하다는 점을 주목한다. 사라진 일자리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공화당에 유리한 환경이라는 인식이다.
다른 측면에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과거를 보면 유권자들이 선거가 치러지는 해 또는 그로부터 1년 전의 최근 경제상황에 지배되는 경향이 뚜렷한데 최근 9개 지역 모두 전국 평균 이상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선거가 치러지는 올 가을까지 이들 지역의 경제가 조금씩이라도 계속 좋아지거나 최소한 악화되지 않는다면 오바마가 다시 한번 승리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낙관은 여전히 금물이라는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불경기가 워낙 심했고 장기화된데다 회복세 또한 완연하지 않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행동 모델이 과거와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취 청 선임 분석가는 이번 대선에서는 `실망한 유권자 효과'(the grumpy voter effect)를 새 변수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는 경제가 개선되더라도 근본적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면 유권자들이 개선에 대해 평가절하할 것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