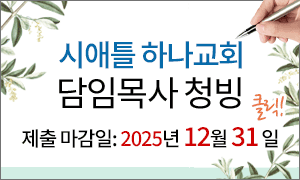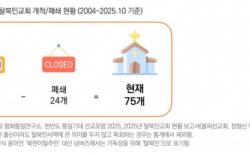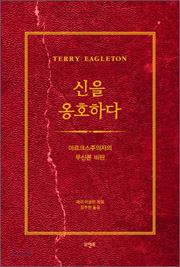
‘적의 적은 친구’라 했던가. ‘유신론자’들을 주적으로 삼았던 ‘마르크스주의자’가 역설적이게도 ‘신(神)’을 옹호하고 나섰다.
영국의 대표적인 마르크스주의 문학비평가인 테리 이글턴(Terry Eagleton)이 쓴 <신을 옹호하다(Reason, Faith, and Revolution: Reflections on the God Debate, 모멘토)>는 신에 무지한 무신론자들에 대한 신랄하고 유쾌한 비판으로 가득 차 있다.
이 책에서 이글턴은 ‘자유주의적 합리주의자’이자 무신론자들의 교주로 떠오른 <만들어진 신>, <지상 최대의 쇼>의 리처드 도킨스와 <신은 위대하지 않다>의 크리스토퍼 히친스 두 사람을 ‘디치킨스(Ditchkins)’로 줄여 부르며 싸잡아 조롱한다. 특히 “히친스의 책은 멋스럽고 재미있으며 몸을 데일 정도로 열정적이고 읽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잘 쓰였지만, 도킨스의 책에는 그의 교조적인 맹렬함이 문체에도 파고들어 그런 수식어가 하나도 어울리지 않는다”며 도킨스를 혹평한다.
이글턴이 이들을 비판하기 위해 내세우는 논거는 ‘기독교 신학’이다. 그는 아퀴나스의 말을 빌려 “하나님은 우주의 생성을 놓고 과학과 경쟁하는 존재가 아니다”며 “그러므로 도킨스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 일종의 범주오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과학과 신학 간에 어처구니없는 오해들이 생기는 이유들 중 하나는 두 학문이 대부분 같은 종류의 대상을 다루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기독교 신앙에서 일차적인 것은 초월자인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명제에 동의하느냐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둠과 고통, 혼란 속에 허덕이며 막다른 지점에 이르렀음에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에 대한 약속을 충실히 믿고 지키는 인간들이 보여주는 헌신”이라는 말로 어쩌면 수많은 기독교인들조차 잊어버린 채 살던 그들의 입장을 대변한다.
예수에 대한 설명에서 이는 더 구체화된다. “예수가 선포한 거룩하고 영광된 변모는 비난받고 더럽던 것이 약자에서 강자가 되고, 죽음이 삶으로, 고뇌가 영광으로 바뀔 때 일어난다. 그 과정을 가리키는 오랜 명칭은 비극이라기보다 희생이다. 이런 식으로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면서 옛 질서의 자투리와 찌꺼기로부터 새로운 질서가 구축된다. 우리는 그런 삶이 과연 가능한지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자기 비우기’에는 믿음이 필요하다.”
나아가 그는 마치 ‘노방전도인’들처럼 이렇게 외친다. “모든 증거가 불리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끝내 이기리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인간 조건의 적나라한 기표(記標)는 사랑과 정의를 강력하게 옹호하다 그 때문에 죽음을 당한 사람이고, 엉망으로 훼손된 그 시신이 인류 역사의 충격적 진실이다. 죄 없이 고통받은 사람의 그런 끔찍한 형상을 역사의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라면 인류의 무한정한 진보라는 순진한 꿈을 곧이곧대로 믿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꿈은 디치킨스가 열정적으로 옹호하는 것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이 동조했던 디치킨스의 ‘합리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직관적으로 기독교가 많은 사람에게 매력적인 이유중 하나로 이글턴은 ‘사랑’을 꼽았다. 기독교는 그 세계관의 중심에 사랑을 놓고 있는데, 그게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점을 대부분 사람들이 경험으로 알기 때문이다. 사랑이 비록 사방에서 배척받고 부인되지만, 그래도 인류 역사의 초점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그는 분석한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는 “현실에서는 사랑이 역사의 중심이 아닌 게 명백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가 사랑마저 실질적으로 사유화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풀이한다.
물론 그는 기독교를 마냥 옹호하고 있지는 않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불가피해서’가 아니라 ‘아무런 이유 없이 만든 것’이라고도 하고, 기독교가 오래 전부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편에서 부유하고 공격적인 사람들의 편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기독교 비판자들이 저리 설치게 됐다는 논평도 곁들였다.
진화론이 ‘허구’임을 주장하면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사람으로 매도당하는 이 시대에 이글턴의 이러한 주장은 무더운 날씨에 시원한 청량음료 같다. 마르크스주의자가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건, 어쩌면 목회자의 아들이었던 마르크스의 사상 속에 기독교적 가치가 숨어있기 때문은 아닐까.
영국의 대표적인 마르크스주의 문학비평가인 테리 이글턴(Terry Eagleton)이 쓴 <신을 옹호하다(Reason, Faith, and Revolution: Reflections on the God Debate, 모멘토)>는 신에 무지한 무신론자들에 대한 신랄하고 유쾌한 비판으로 가득 차 있다.
이 책에서 이글턴은 ‘자유주의적 합리주의자’이자 무신론자들의 교주로 떠오른 <만들어진 신>, <지상 최대의 쇼>의 리처드 도킨스와 <신은 위대하지 않다>의 크리스토퍼 히친스 두 사람을 ‘디치킨스(Ditchkins)’로 줄여 부르며 싸잡아 조롱한다. 특히 “히친스의 책은 멋스럽고 재미있으며 몸을 데일 정도로 열정적이고 읽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잘 쓰였지만, 도킨스의 책에는 그의 교조적인 맹렬함이 문체에도 파고들어 그런 수식어가 하나도 어울리지 않는다”며 도킨스를 혹평한다.
이글턴이 이들을 비판하기 위해 내세우는 논거는 ‘기독교 신학’이다. 그는 아퀴나스의 말을 빌려 “하나님은 우주의 생성을 놓고 과학과 경쟁하는 존재가 아니다”며 “그러므로 도킨스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 일종의 범주오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과학과 신학 간에 어처구니없는 오해들이 생기는 이유들 중 하나는 두 학문이 대부분 같은 종류의 대상을 다루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기독교 신앙에서 일차적인 것은 초월자인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명제에 동의하느냐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둠과 고통, 혼란 속에 허덕이며 막다른 지점에 이르렀음에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에 대한 약속을 충실히 믿고 지키는 인간들이 보여주는 헌신”이라는 말로 어쩌면 수많은 기독교인들조차 잊어버린 채 살던 그들의 입장을 대변한다.
예수에 대한 설명에서 이는 더 구체화된다. “예수가 선포한 거룩하고 영광된 변모는 비난받고 더럽던 것이 약자에서 강자가 되고, 죽음이 삶으로, 고뇌가 영광으로 바뀔 때 일어난다. 그 과정을 가리키는 오랜 명칭은 비극이라기보다 희생이다. 이런 식으로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면서 옛 질서의 자투리와 찌꺼기로부터 새로운 질서가 구축된다. 우리는 그런 삶이 과연 가능한지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자기 비우기’에는 믿음이 필요하다.”
나아가 그는 마치 ‘노방전도인’들처럼 이렇게 외친다. “모든 증거가 불리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끝내 이기리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인간 조건의 적나라한 기표(記標)는 사랑과 정의를 강력하게 옹호하다 그 때문에 죽음을 당한 사람이고, 엉망으로 훼손된 그 시신이 인류 역사의 충격적 진실이다. 죄 없이 고통받은 사람의 그런 끔찍한 형상을 역사의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라면 인류의 무한정한 진보라는 순진한 꿈을 곧이곧대로 믿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꿈은 디치킨스가 열정적으로 옹호하는 것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이 동조했던 디치킨스의 ‘합리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직관적으로 기독교가 많은 사람에게 매력적인 이유중 하나로 이글턴은 ‘사랑’을 꼽았다. 기독교는 그 세계관의 중심에 사랑을 놓고 있는데, 그게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점을 대부분 사람들이 경험으로 알기 때문이다. 사랑이 비록 사방에서 배척받고 부인되지만, 그래도 인류 역사의 초점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그는 분석한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는 “현실에서는 사랑이 역사의 중심이 아닌 게 명백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가 사랑마저 실질적으로 사유화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풀이한다.
물론 그는 기독교를 마냥 옹호하고 있지는 않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불가피해서’가 아니라 ‘아무런 이유 없이 만든 것’이라고도 하고, 기독교가 오래 전부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편에서 부유하고 공격적인 사람들의 편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기독교 비판자들이 저리 설치게 됐다는 논평도 곁들였다.
진화론이 ‘허구’임을 주장하면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사람으로 매도당하는 이 시대에 이글턴의 이러한 주장은 무더운 날씨에 시원한 청량음료 같다. 마르크스주의자가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건, 어쩌면 목회자의 아들이었던 마르크스의 사상 속에 기독교적 가치가 숨어있기 때문은 아닐까.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