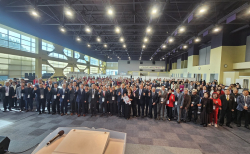재미 사학자 백지원씨 역사책 인기몰이
TV 사극에 그나마 얄팍한 자리를 뺏긴 역사책이 살아나고 있다. 흡인력 있는 특유의 문체로 대중 역사서 시대를 연 이덕일에 이어 이번에는 한 재미 사학자가 서점가의 돌풍을 이끌고 있다. 백지원의 “백성 편에서 본 조선 통사: 왕을 참하라’(진명출판사) 상하권은 주요 대형서점과 인터넷서점 역사 부문 판매 순위에서 1위에 오르며 인기를 끌고 있다. 역사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과 통념을 뒤집는 ‘왕은~’ 이순신의 불멸의 신화마저 통박힌다. 조선의 왕들은 하나같이 맹물이었고 양반계급들은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는다. 그의 책을 읽다보면 우리 역사가 이래도 되는가 하는 자괴감마저 든다.
<조선은 개같은 나라였나>
역사를 보는 새로운 관점
상하 2권짜리인 ‘왕을 참하라’는 태조 이성계부터 27대 순종에 이르기까지 조선 500년을 순서대로 다룬 통사다. 이 책의 시각은 ‘삐딱하고’ 서술은 직설적이다. 먼저 조선사를 바라보는 눈높이가 낮아졌다. 왕과 양반 계급으로 대표되는 지배층의 관점이 아니라, 백성의 관점에서 조선을 바라보고 있다. 저자의 칼날은 세계사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심했던 신분 차별, 명에 대한 지극한 사대, 그리고 백성들의 삶과는 무관했던 지배계급의 당쟁 등 병폐를 향해 신랄한 검광을 휘두른다.
조선의 계급제도에 대해 저자는 세계에서 가장 악랄했다고 꼬집는다.
“조선은 전체 인구의 10%도 채 안 되는 양반만을 위한 나라였다. 양민은 양반의 수탈 대상에 지나지 않았고 노비와 천민은 마소 대신 부려먹고 상속이 가능한 말하는 짐승들이었다. 서얼은 사회진출이 막혀 아무 것도 해 먹을 게 없었다. 나라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들에게 조선은 참으로 개 같은 나라였다~ 동족을 출생 신분이 다르거나 단지 가난하다는 이류로 짐승 취급을 하는 나라가 이 세상 어디에 있었던가. 조선이 제 할아비보다 더 극진히 모셨던 중국에도 이런 독한 제도는 없었다.”
중국에 대한 못 말리는 사대주의도 그가 눈꼴 시려하는 조선의 병폐의 하나다. “조선의 명에 대한 사대의 정도는 6.25 전쟁 후 미국에 대한 한국의 사대에 비할 바가 아니다. 법과 제도, 의복과 학문 등 모든 것을 흉내 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가치의 기준을 중국의 경서에 두었다.~ 조선에 명은 아비의 나라였고 청은 오랑캐의 나라였던 것이다.” 당쟁에 대한 비판을 일제 식민사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일부 역사학자들에 대한 통박도 서늘하다.
“당파싸움을 일으킨 자들은 나라나 백성의 이익과는 전혀 관계없이 당파와 제 문중, 그리고 자신의 이익만 우선했으며 그들에게 상대 당은 무조건 철천지원수였다. 그 철천지원수를 제거하기 위해 공작과 모함을 일삼고 역모를 조작해 수많은 아까운 인재들이 당쟁의 와중에 희생되었다~ 당쟁을 지금의 정당정치에 비교하고 일제의 식민사관이라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도 제법 되는데,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다.”
조선 지배계급의 최상층인 임금에 대한 시각도 양반과 큰 차이가 없다. 저자는 왕들을 밥값도 제대로 못한 덜 떨어지고 무능한 존재로 패대기친다.
27명의 임금 중에서 명군이라 일컬을 수 있는 임금은 세종과 정조 둘 뿐이라 한다. 그나마 밥값을 한 임금으로는 광해군, 효종, 태종, 세조, 영조 다섯만 꼽는다. 죽값을 한 왕은 성종 등 2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18명의 왕들은 얼뜨기, 멍청이, 소인배, 덜 떨어지고 모자란 무능한 임금이었다고 모질게 평가한다.
결과적으로 ▲못난 임금들과 당파싸움에 날 새는 줄 모르는 양반 ▲절대적 사대에 의한 국가 경쟁력 상실 ▲시대의 변화에 조응하지 못한 성리학의 폐단 때문에 조선은 망했고 백성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힌다.
“백성 편에서 본 조선은 진작 망했어야 할 나라였다. 사실 조선은 조일전쟁 전후, 아니면 늦어도 영조,정조 시대가 끝날 무렵 망했어야 했다~ 조선은 조일전쟁 이후 약 300년 동안 정조 시대를 빼고는 존재할 가치가 전혀 없는 왕조였다.”
역사책 읽기의 문체반정
이 책을 돋보이게 하는 또 다른 힘은 구어체에 의한 직설적 서술 방식이다. 저자는 지루하고 엄숙한 기존의 역사책의 형식을 파괴한다. 점잖은 지배층의 허구를 향해 대놓고 욕설을 퍼붓는다. 박지원이 ‘열하일기’를 통해 조선의 문학계에 불러일으킨 ‘문체반정’의 기운이 이 역사서에도 꿈틀댄다. 그래서 김수현 식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재미에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후련하다. 청소년은 물론 남녀노소 누구나 한번 손에 잡으면 놓기 싫어진다.
특히 상식에 대한 뒤집어 보기는 읽는 재미와 역사의 진실에 대한 의문을 배가시킨다. 가령 그는 세계 해전사에 길이 남을 이순신 장군의 해전마저 한수 낮춰본다.
“23전 23승의 연승신화는 허구다. 제대로 한 해전은 3번쯤밖에 없었다. 이마저도 전함의 전력의 차이 덕분이었다. 조선 전함의 함포는 유효 사거리가 500m가 넘은 반면 일본 수군의 주 무기인 조총의 유효 사거리는 100m 정도였다. 게다가 삼나무로 만든 일본함선은 소나무로 건조된 조선 판옥선에 부딪히면 와르르 부서졌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반전이 언제나 드라마틱한 건 아니다. “지금까지 읽은 소설로 도배된 조선 역사책일랑 책장에다 꽂아 놓으라”는 저자의 자부심은 군데군데 맹점을 드러낸다. 이순신 신화의 허구를 지적하는 그에게 왜 원균은 이순신과 똑 같은 상황에서 정반대의 결과를 이뤄냈을까? 하는 질문이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름도, 군번도 없는 재야 사학자의 글이라 해서 가벼움으로 폄하해선 안 된다. 사실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해석, 방대한 자료에 대한 섭렵은 이 책에 대한 일반의 환호가 허황된 것이 아님을 반영한다.
70년대, 밤이면 TV에서 “이 영화 안보시면 후회합니다”라고 시청자들에게 공갈을 놓던 영화평론가 정영일처럼 “이 책 안보시면 밥값 못 합니다”란 엄포도 가능할 것 같다.
<출처 : 워싱턴 한국일보>
TV 사극에 그나마 얄팍한 자리를 뺏긴 역사책이 살아나고 있다. 흡인력 있는 특유의 문체로 대중 역사서 시대를 연 이덕일에 이어 이번에는 한 재미 사학자가 서점가의 돌풍을 이끌고 있다. 백지원의 “백성 편에서 본 조선 통사: 왕을 참하라’(진명출판사) 상하권은 주요 대형서점과 인터넷서점 역사 부문 판매 순위에서 1위에 오르며 인기를 끌고 있다. 역사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과 통념을 뒤집는 ‘왕은~’ 이순신의 불멸의 신화마저 통박힌다. 조선의 왕들은 하나같이 맹물이었고 양반계급들은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는다. 그의 책을 읽다보면 우리 역사가 이래도 되는가 하는 자괴감마저 든다.
<조선은 개같은 나라였나>
역사를 보는 새로운 관점
상하 2권짜리인 ‘왕을 참하라’는 태조 이성계부터 27대 순종에 이르기까지 조선 500년을 순서대로 다룬 통사다. 이 책의 시각은 ‘삐딱하고’ 서술은 직설적이다. 먼저 조선사를 바라보는 눈높이가 낮아졌다. 왕과 양반 계급으로 대표되는 지배층의 관점이 아니라, 백성의 관점에서 조선을 바라보고 있다. 저자의 칼날은 세계사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심했던 신분 차별, 명에 대한 지극한 사대, 그리고 백성들의 삶과는 무관했던 지배계급의 당쟁 등 병폐를 향해 신랄한 검광을 휘두른다.
조선의 계급제도에 대해 저자는 세계에서 가장 악랄했다고 꼬집는다.
“조선은 전체 인구의 10%도 채 안 되는 양반만을 위한 나라였다. 양민은 양반의 수탈 대상에 지나지 않았고 노비와 천민은 마소 대신 부려먹고 상속이 가능한 말하는 짐승들이었다. 서얼은 사회진출이 막혀 아무 것도 해 먹을 게 없었다. 나라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들에게 조선은 참으로 개 같은 나라였다~ 동족을 출생 신분이 다르거나 단지 가난하다는 이류로 짐승 취급을 하는 나라가 이 세상 어디에 있었던가. 조선이 제 할아비보다 더 극진히 모셨던 중국에도 이런 독한 제도는 없었다.”
중국에 대한 못 말리는 사대주의도 그가 눈꼴 시려하는 조선의 병폐의 하나다. “조선의 명에 대한 사대의 정도는 6.25 전쟁 후 미국에 대한 한국의 사대에 비할 바가 아니다. 법과 제도, 의복과 학문 등 모든 것을 흉내 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가치의 기준을 중국의 경서에 두었다.~ 조선에 명은 아비의 나라였고 청은 오랑캐의 나라였던 것이다.” 당쟁에 대한 비판을 일제 식민사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일부 역사학자들에 대한 통박도 서늘하다.
“당파싸움을 일으킨 자들은 나라나 백성의 이익과는 전혀 관계없이 당파와 제 문중, 그리고 자신의 이익만 우선했으며 그들에게 상대 당은 무조건 철천지원수였다. 그 철천지원수를 제거하기 위해 공작과 모함을 일삼고 역모를 조작해 수많은 아까운 인재들이 당쟁의 와중에 희생되었다~ 당쟁을 지금의 정당정치에 비교하고 일제의 식민사관이라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도 제법 되는데,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다.”
조선 지배계급의 최상층인 임금에 대한 시각도 양반과 큰 차이가 없다. 저자는 왕들을 밥값도 제대로 못한 덜 떨어지고 무능한 존재로 패대기친다.
27명의 임금 중에서 명군이라 일컬을 수 있는 임금은 세종과 정조 둘 뿐이라 한다. 그나마 밥값을 한 임금으로는 광해군, 효종, 태종, 세조, 영조 다섯만 꼽는다. 죽값을 한 왕은 성종 등 2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18명의 왕들은 얼뜨기, 멍청이, 소인배, 덜 떨어지고 모자란 무능한 임금이었다고 모질게 평가한다.
결과적으로 ▲못난 임금들과 당파싸움에 날 새는 줄 모르는 양반 ▲절대적 사대에 의한 국가 경쟁력 상실 ▲시대의 변화에 조응하지 못한 성리학의 폐단 때문에 조선은 망했고 백성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힌다.
“백성 편에서 본 조선은 진작 망했어야 할 나라였다. 사실 조선은 조일전쟁 전후, 아니면 늦어도 영조,정조 시대가 끝날 무렵 망했어야 했다~ 조선은 조일전쟁 이후 약 300년 동안 정조 시대를 빼고는 존재할 가치가 전혀 없는 왕조였다.”
역사책 읽기의 문체반정
이 책을 돋보이게 하는 또 다른 힘은 구어체에 의한 직설적 서술 방식이다. 저자는 지루하고 엄숙한 기존의 역사책의 형식을 파괴한다. 점잖은 지배층의 허구를 향해 대놓고 욕설을 퍼붓는다. 박지원이 ‘열하일기’를 통해 조선의 문학계에 불러일으킨 ‘문체반정’의 기운이 이 역사서에도 꿈틀댄다. 그래서 김수현 식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재미에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후련하다. 청소년은 물론 남녀노소 누구나 한번 손에 잡으면 놓기 싫어진다.
특히 상식에 대한 뒤집어 보기는 읽는 재미와 역사의 진실에 대한 의문을 배가시킨다. 가령 그는 세계 해전사에 길이 남을 이순신 장군의 해전마저 한수 낮춰본다.
“23전 23승의 연승신화는 허구다. 제대로 한 해전은 3번쯤밖에 없었다. 이마저도 전함의 전력의 차이 덕분이었다. 조선 전함의 함포는 유효 사거리가 500m가 넘은 반면 일본 수군의 주 무기인 조총의 유효 사거리는 100m 정도였다. 게다가 삼나무로 만든 일본함선은 소나무로 건조된 조선 판옥선에 부딪히면 와르르 부서졌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반전이 언제나 드라마틱한 건 아니다. “지금까지 읽은 소설로 도배된 조선 역사책일랑 책장에다 꽂아 놓으라”는 저자의 자부심은 군데군데 맹점을 드러낸다. 이순신 신화의 허구를 지적하는 그에게 왜 원균은 이순신과 똑 같은 상황에서 정반대의 결과를 이뤄냈을까? 하는 질문이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름도, 군번도 없는 재야 사학자의 글이라 해서 가벼움으로 폄하해선 안 된다. 사실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해석, 방대한 자료에 대한 섭렵은 이 책에 대한 일반의 환호가 허황된 것이 아님을 반영한다.
70년대, 밤이면 TV에서 “이 영화 안보시면 후회합니다”라고 시청자들에게 공갈을 놓던 영화평론가 정영일처럼 “이 책 안보시면 밥값 못 합니다”란 엄포도 가능할 것 같다.
<출처 : 워싱턴 한국일보>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