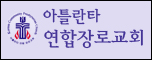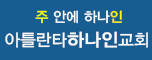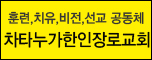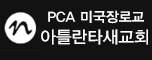나는 1960년대에 어린 시절을 보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가난한 때였다. 시대가 그랬기에 농촌교회의 가난한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 가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자랐다. 계절적으로 겨울이 가장 힘들었다. 입을 겨울 옷도 부족했고 난방시절도 형편없던 때였기에 잘 먹지도 못하고 지내던 시절, 겨울이 왜 그리 춥고 긴지 생각조차 하기 싫을 정도로 끔찍했던 기억이 난다.
이런 어린 시절의 겨울에 성탄절이 매년 기다려졌다.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께서 가난한 농촌 교회 목회자 자녀들을 위해 미국의 교회들과 연결해서 성탄 선물 꾸러미를 보내 주었기 때문이다. 성탄절이 다가오는 12월 초가 되면 하루, 하루 언제 선물 꾸러미가 소포로 오나 손꼽아 기다렸던 기억이 난다. 얼굴도 잘 모르는(가끔 사진을 보내오기도 했지만) 미국 어느 교회의 가정에서 매년마다 보내오는 성탄절 선물 꾸러미는 당시 나에게는 큰 소망이었다. 선물 꾸러미가 도착하는 날 신기하게 영어로 쓰인 미국의 주소를 바라보며 그 때부터 미국에 대한 막연한 동경 같은 것을 가지고 자라기도 했다. 가난하지 않고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나라, 천국 같은 나라(?) 일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먼 훗날 커서 나의 어린 시절 성탄절에 선물을 보내 온 미국을 꼭 가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자랐다. 도착한 선물 꾸러미를 열어보면 Made in USA (흔히 ‘미제’ 라고 사람들이 불렀기에 나도 그렇게 불렀다) 상표가 붙은 각양, 각색의 갖고 싶었던 물건들이 가득했다. 연필, 공책, 크레용, 벙어리장갑, 털목도리, 털모자, 털 스웨터, 양말, 초콜릿, 분유, 껌, 원기소 등등 먹거리로부터 입을 것, 학용품, 비타민까지 당시 한국에서는 보기 드문 물건들이 보내져 왔다. 너무 신나서 입어보고 또 입어보고 써보고 또 써보고 아끼고 또 아끼면서 보내 준 선물을 일년 내내 보물 단지처럼 여겼던 기억이 난다. 껌을 씹으면 몇 일, 몇 날을 벽이나 책상에 붙여 두었다가 떼어서 다시 씹고 다니기도 했다.
이렇게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선물들은 소모품을 제외하고는 일 년이 지나면 어김없이 아버님 어머님께서 동네 아이들 가운데 가난한 이웃들에게 정리해서 나누어 주곤 하셨다. 어떤 때는 정말 부모님이 야속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우리에게는 내년에 또 선물이 올 것이라는 부모님의 말씀에 할 수 없이 순종 하였지만 모처럼 어린 나이에 맘에 쏙 드는 선물이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일 년이 지나면 내 것에서 동네의 다른 아이 것이 되어 버리게 되었기에 어린 나이에 섭섭함이 왜 없었겠는가? 몇 년이 지나니까 작은 동네 집집마다 한, 두 개 씩은 우리가 나누어준 물건들이 있게 되기도 했다. 그것이 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임을 철이 들어서야 깨닫게 되었다.
성인이 되고 목회자가 된 지금, 나라면 그 때 우리 부모님들처럼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미 천국에 가신 우리 부모님들이 한 없이 존경스럽기만 하다. 아들 둘에 딸 셋을 거느리고 빈궁한 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시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했다는 생각이 든다. 가난한 시절에 살던 사람들이 훨씬 더 이웃을 살피고 돌보는 마음이 컸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런 어린 시절의 경험이 있기에 미국에서 이민목회를 하면서 성탄 절기가 될 때마다 어린 시절 미국교회의 가정들로부터 성탄선물 받은 것을 조금이나마 갚아 보기 위해 우리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사들을 통해 원주민 교회의 목회자 자녀들을 위해 작은 선물 꾸러미를 만들어 성탄절에 보내보기도 하고 단기 선교나 선교여행을 가면서 작지만 원주민 목회자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선물 꾸러미를 준비해 가는 작은 사랑의 실천을 해 보려고 애를 써본다. 성탄절! 가난했던 어린 시절에 생각 만해도 가슴이 두근거렸던 시간들을 이렇게 회상해본다. 작은 나의 가슴을 그토록 두근거리게 했던 것은 바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들이 그 사랑을 나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이리라. 그들의 사랑은 비록 작은 실천이었지만 내 마음에는 그 사랑이 아직도 이렇게 진하게 큰 흔적으로 남아 있는 것은 사랑만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성탄절이 되자.
이런 어린 시절의 겨울에 성탄절이 매년 기다려졌다.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께서 가난한 농촌 교회 목회자 자녀들을 위해 미국의 교회들과 연결해서 성탄 선물 꾸러미를 보내 주었기 때문이다. 성탄절이 다가오는 12월 초가 되면 하루, 하루 언제 선물 꾸러미가 소포로 오나 손꼽아 기다렸던 기억이 난다. 얼굴도 잘 모르는(가끔 사진을 보내오기도 했지만) 미국 어느 교회의 가정에서 매년마다 보내오는 성탄절 선물 꾸러미는 당시 나에게는 큰 소망이었다. 선물 꾸러미가 도착하는 날 신기하게 영어로 쓰인 미국의 주소를 바라보며 그 때부터 미국에 대한 막연한 동경 같은 것을 가지고 자라기도 했다. 가난하지 않고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나라, 천국 같은 나라(?) 일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먼 훗날 커서 나의 어린 시절 성탄절에 선물을 보내 온 미국을 꼭 가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자랐다. 도착한 선물 꾸러미를 열어보면 Made in USA (흔히 ‘미제’ 라고 사람들이 불렀기에 나도 그렇게 불렀다) 상표가 붙은 각양, 각색의 갖고 싶었던 물건들이 가득했다. 연필, 공책, 크레용, 벙어리장갑, 털목도리, 털모자, 털 스웨터, 양말, 초콜릿, 분유, 껌, 원기소 등등 먹거리로부터 입을 것, 학용품, 비타민까지 당시 한국에서는 보기 드문 물건들이 보내져 왔다. 너무 신나서 입어보고 또 입어보고 써보고 또 써보고 아끼고 또 아끼면서 보내 준 선물을 일년 내내 보물 단지처럼 여겼던 기억이 난다. 껌을 씹으면 몇 일, 몇 날을 벽이나 책상에 붙여 두었다가 떼어서 다시 씹고 다니기도 했다.
이렇게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선물들은 소모품을 제외하고는 일 년이 지나면 어김없이 아버님 어머님께서 동네 아이들 가운데 가난한 이웃들에게 정리해서 나누어 주곤 하셨다. 어떤 때는 정말 부모님이 야속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우리에게는 내년에 또 선물이 올 것이라는 부모님의 말씀에 할 수 없이 순종 하였지만 모처럼 어린 나이에 맘에 쏙 드는 선물이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일 년이 지나면 내 것에서 동네의 다른 아이 것이 되어 버리게 되었기에 어린 나이에 섭섭함이 왜 없었겠는가? 몇 년이 지나니까 작은 동네 집집마다 한, 두 개 씩은 우리가 나누어준 물건들이 있게 되기도 했다. 그것이 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임을 철이 들어서야 깨닫게 되었다.
성인이 되고 목회자가 된 지금, 나라면 그 때 우리 부모님들처럼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미 천국에 가신 우리 부모님들이 한 없이 존경스럽기만 하다. 아들 둘에 딸 셋을 거느리고 빈궁한 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시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했다는 생각이 든다. 가난한 시절에 살던 사람들이 훨씬 더 이웃을 살피고 돌보는 마음이 컸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런 어린 시절의 경험이 있기에 미국에서 이민목회를 하면서 성탄 절기가 될 때마다 어린 시절 미국교회의 가정들로부터 성탄선물 받은 것을 조금이나마 갚아 보기 위해 우리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사들을 통해 원주민 교회의 목회자 자녀들을 위해 작은 선물 꾸러미를 만들어 성탄절에 보내보기도 하고 단기 선교나 선교여행을 가면서 작지만 원주민 목회자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선물 꾸러미를 준비해 가는 작은 사랑의 실천을 해 보려고 애를 써본다. 성탄절! 가난했던 어린 시절에 생각 만해도 가슴이 두근거렸던 시간들을 이렇게 회상해본다. 작은 나의 가슴을 그토록 두근거리게 했던 것은 바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들이 그 사랑을 나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이리라. 그들의 사랑은 비록 작은 실천이었지만 내 마음에는 그 사랑이 아직도 이렇게 진하게 큰 흔적으로 남아 있는 것은 사랑만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성탄절이 되자.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