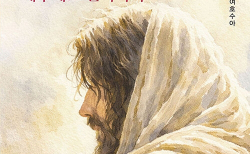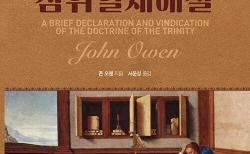|
| ▲교회를 섬기며 묵묵히 일하고 있는 한 교회 관리집사의 모습. ⓒ이동윤 기자 |
관리집사는 주로 중·대형교회에서 예배 준비, 건물 관리, 청소 등을 맡아 일하는 이들을 말한다.
관리집사들은 “낮은 곳에서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이 은혜받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것이 제일 큰 행복”이라고 입을 모은다.
재적교인이 15만여명에 달하는 서울의 한 대형교회를 11년간 섬기고 있는 관리집사는 “시설관리 뿐 아니라 예배준비, 모임안내 등 다양한 일들을 맡고는 있지만, 오히려 힘들기보다는 감사함이 크다”며 “새벽에 제일 먼저 예배당 문을 열고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다. 교인들도 많이 격려해주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일이니 큰 은혜가 된다”고 했다.
재적교인 800여명인 지방의 한 중형교회를 섬기고 있는 관리집사도 역시 “성전에서의 하루가 세상에서의 100년보다 더 낫다”며 “관리집사를 하며 성도들의 내면적인 진솔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다. 성도들이 목사님 앞에 설 때는 어느 정도 자신의 모습을 포장하는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교회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잘 봐야 한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편하게 예배드리게 할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한다. 새벽예배 전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큰 행복을 느낀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러 어려운 일들로 인한 고충도 적지 않다. 불안정한 계약직 고용, 낮은 보수, 교회와의 소통창구 부재, 교인들의 낮은 주인의식 등이 특히 사역의 걸림돌들이다.
재적교인 수 3천여명의 서울 모 교회에서 일하는 K 집사는 불안정한 고용환경과 낮은 보수에 대해 하소연했다. 관리집사는 대개 1년 단위 연봉제 계약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연말 당회는 이들의 고용 유지 여부를 판단한다. 밤샘예배, 심야예배를 준비하다 보면 1주일에 70~80시간 이상 일할 때가 많지만, 평균 급여는 120만원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만한 분위기도 아니다.
서울의 한 중형교회의 A 관리집사는 담임목사와의 갈등에 대해 조심스레 언급했다. A 집사는 “목사님은 목사님의 영역이 있고, 실무자는 실무자의 영역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목사님 입장과 실무자의 입장이 상충될 때가 많은 것 같다. 실무자의 의견이 반영되면 좋은데, 무시될 때가 많다. 그러다 보니 회의 때 제대로 건의하기도 어렵다.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목사님의 입장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다. 소통의 창구가 없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C 관리집사는 “제대로 쉴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시설관리 뿐 아니라, 차량관리, 예배준비 등 일도 하고 있고, 주말에는 교회에서 결혼식과 여러 행사가 열리기 때문에 쉴 수가 없다. 교회를 정리하고 깨끗이 유지하는 것을 교인들이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내 집 떠나면 그만’이라고, 마음이 느슨해져 물도 잠그지 않고, 불도 끄지 않고 나간다. 그래도 나이 드신 장로님, 권사님들은 인식이 있는데, 청년들은 시각에 차이가 나는 것 같다. 아무래도 교회를 좀 더 자신의 몸과 같이 여겨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담임목회자는 “교회가 관리집사들의 영과 현실을 돌봐줘야 한다. 특히 목회자가 직접 사찰집사들과 만나, 그들의 고충을 나누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