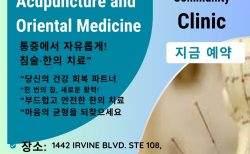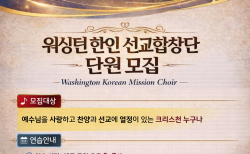창조의 심오하고도 아기자기한 작품들을
사람의 손 무늬 자국이, 추적해 갈 수 있을 걸 가
크고 작은 戰爭을 헤치고 헤어내려 온 삶의 그림자
사람들은 그것을, 수직으로 떨어져 내린
수없는 바위 갈래 낭떠러지라고 할지는 몰라도
깊은 난간지역, <바스타이스위스> 산골짜기야 말로
사람 손이 빚어내는 계곡일 수는 없는 것
흔히 만물상 산자락이라고, 부를 수야 있겠지만
손가락 모양처럼, 하늘 끝자락으로 솟아올랐다가는
천길 만길 쏟아져 내려가는 절벽들,
사이사이를 주름잡듯
돌다리나 색깔 지붕 이어 만들어
살림 꾸러미 차려내 가면서
정치도 하고, 외부 세력에 강한 방어(防禦)도 해 낸
아니, 인간 무덤도 바위 바닥에 꾸며 내는
바위 인간 共國을 만들어 냈다는, 바위산이었다.
작센의 아기자기 한 자기공인(瓷器工人)도
神의 작품을 본 떠가면서
투명한 유리, 유리 문양의 瓷器그릇
만들어 냈을 것이었을 터,
잼프 오페라하우스 곁 골목거리 높다랗게 즈빙거 궁전 건물 벽을 세운
군주들의 행렬 102mx9m의 자기그림을 그려 놓았을 텐데
무시무시한 폭격으로
온통 도시가 거이 거이 다 잿더미 화 하였어도
얼키설키 꾸며놓은 엘베 강 철재다리 하나와
군주, 王子들의 行進 건물 벽 2만5천개 쪼각의 자개 그림 한 덩어리는
戰禍 속에서도 그래도 건드릴 수가 없었던 인간知慧는
이렇게 보화처럼 남겨놓게 했을 것이려니,
아무래도
드레스덴의 중심거리 다 허물어져 내렸던 교회당 첨탑 위에다가
황금의 십자가와 장식물을 헬리콥터로 날라 와서 기증해 온
영국으로부터의 선물 이야기 와 겹쳐
인간 지성의 끝자락까지 남겨져 있을
知慧라고 자부할
사람 역사의 밝은 그림자가 아닐 넌지
우리들 하나하나 살아 온 최종의 숨결이
남겨져 있어야 할 것이라면
나의 작은 호흡 한 숨결이라도
프라우엔 고딕 식 교회당 안 높다랗게
엄숙히 퍼져 내려오는 스테인리스 유리창 채광(採光)처럼
색깔, 빛 한 줄기 쯤 만이라도,
나의 빛깔이 되어
현란(眩亂)한 역사 속에
진실한 그 빛줄기 하나쯤은 꼭 좀 되어, 번져 내처 가고 싶어라.
마음 깊이, 저 瓷器 그 壁畵 <君主들의 行陣>을 사진으로 오래 전에 만나 보고서는, 나는 언제쯤 한 번 저 瓷器그림 앞에 가 서보게 될 것인가 하는, 어린 아이 같은 꿈을 담아 내 본 적이 한참 전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래도 길게 세월을 보내 놓고 나서, 여기 이렇게 그 瓷器 그림 앞에 와 서 있는 것이 꿈은 아니겠지 하는 설렘을 그날 그 現場에서, 가라 앉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형 자기 그림의 솜씨를 피어나게 한 근원지가 어디에서부터였을 가하는, 또 다른 궁금증이 내 속 마음에서는 용광로만큼까지는 아니겠지만 꿈 트려 왔습니다. 그게 바로, 이 생각지도 못했던 現場이고, 바로 이 <바스타이스위스>산자락이었습니다. 기암절벽을 촘촘히 포개 놓은 산자락 까마득히 저 아래에는 유유히 엘베 江이 그림 속처럼 드리워져 흐르고 있는 절묘한 절경이었습니다. 아~ 이 절벽을 인간 손으로 깎아내서, 政治의 나라, 방어의 共國을 꾸며냈던 사람들의 손作業들이, 작센의 瓷器의 근원이었다는, 지난 궁금증을 나 나름대로 풀어내게 하였습니다. 무한한 神의 손작업(시편8:3)을 닮아 묻혀서 담은 技巧가 그 근간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세상에 <닮음>을 찾아 헤맬 수 있는 最先의 하나를 추적해 내라고 한다면, 누가 무어라 해도, 나는 단연코 그분의 모습이여야 함을, 누가 버릇없는 함성소리라, 철모르게 비소해도 관계없이, 나는 이렇게 그 眞實을 喊聲처럼 외처 내보고 싶고, 또 그것만이 나의 마지막 생명 걸고 외처 대는, 귀중한 진실입니다.
사람의 손 무늬 자국이, 추적해 갈 수 있을 걸 가
크고 작은 戰爭을 헤치고 헤어내려 온 삶의 그림자
사람들은 그것을, 수직으로 떨어져 내린
수없는 바위 갈래 낭떠러지라고 할지는 몰라도
깊은 난간지역, <바스타이스위스> 산골짜기야 말로
사람 손이 빚어내는 계곡일 수는 없는 것
흔히 만물상 산자락이라고, 부를 수야 있겠지만
손가락 모양처럼, 하늘 끝자락으로 솟아올랐다가는
천길 만길 쏟아져 내려가는 절벽들,
사이사이를 주름잡듯
돌다리나 색깔 지붕 이어 만들어
살림 꾸러미 차려내 가면서
정치도 하고, 외부 세력에 강한 방어(防禦)도 해 낸
아니, 인간 무덤도 바위 바닥에 꾸며 내는
바위 인간 共國을 만들어 냈다는, 바위산이었다.
작센의 아기자기 한 자기공인(瓷器工人)도
神의 작품을 본 떠가면서
투명한 유리, 유리 문양의 瓷器그릇
만들어 냈을 것이었을 터,
잼프 오페라하우스 곁 골목거리 높다랗게 즈빙거 궁전 건물 벽을 세운
군주들의 행렬 102mx9m의 자기그림을 그려 놓았을 텐데
무시무시한 폭격으로
온통 도시가 거이 거이 다 잿더미 화 하였어도
얼키설키 꾸며놓은 엘베 강 철재다리 하나와
군주, 王子들의 行進 건물 벽 2만5천개 쪼각의 자개 그림 한 덩어리는
戰禍 속에서도 그래도 건드릴 수가 없었던 인간知慧는
이렇게 보화처럼 남겨놓게 했을 것이려니,
아무래도
드레스덴의 중심거리 다 허물어져 내렸던 교회당 첨탑 위에다가
황금의 십자가와 장식물을 헬리콥터로 날라 와서 기증해 온
영국으로부터의 선물 이야기 와 겹쳐
인간 지성의 끝자락까지 남겨져 있을
知慧라고 자부할
사람 역사의 밝은 그림자가 아닐 넌지
우리들 하나하나 살아 온 최종의 숨결이
남겨져 있어야 할 것이라면
나의 작은 호흡 한 숨결이라도
프라우엔 고딕 식 교회당 안 높다랗게
엄숙히 퍼져 내려오는 스테인리스 유리창 채광(採光)처럼
색깔, 빛 한 줄기 쯤 만이라도,
나의 빛깔이 되어
현란(眩亂)한 역사 속에
진실한 그 빛줄기 하나쯤은 꼭 좀 되어, 번져 내처 가고 싶어라.
 | |
마음 깊이, 저 瓷器 그 壁畵 <君主들의 行陣>을 사진으로 오래 전에 만나 보고서는, 나는 언제쯤 한 번 저 瓷器그림 앞에 가 서보게 될 것인가 하는, 어린 아이 같은 꿈을 담아 내 본 적이 한참 전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래도 길게 세월을 보내 놓고 나서, 여기 이렇게 그 瓷器 그림 앞에 와 서 있는 것이 꿈은 아니겠지 하는 설렘을 그날 그 現場에서, 가라 앉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형 자기 그림의 솜씨를 피어나게 한 근원지가 어디에서부터였을 가하는, 또 다른 궁금증이 내 속 마음에서는 용광로만큼까지는 아니겠지만 꿈 트려 왔습니다. 그게 바로, 이 생각지도 못했던 現場이고, 바로 이 <바스타이스위스>산자락이었습니다. 기암절벽을 촘촘히 포개 놓은 산자락 까마득히 저 아래에는 유유히 엘베 江이 그림 속처럼 드리워져 흐르고 있는 절묘한 절경이었습니다. 아~ 이 절벽을 인간 손으로 깎아내서, 政治의 나라, 방어의 共國을 꾸며냈던 사람들의 손作業들이, 작센의 瓷器의 근원이었다는, 지난 궁금증을 나 나름대로 풀어내게 하였습니다. 무한한 神의 손작업(시편8:3)을 닮아 묻혀서 담은 技巧가 그 근간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세상에 <닮음>을 찾아 헤맬 수 있는 最先의 하나를 추적해 내라고 한다면, 누가 무어라 해도, 나는 단연코 그분의 모습이여야 함을, 누가 버릇없는 함성소리라, 철모르게 비소해도 관계없이, 나는 이렇게 그 眞實을 喊聲처럼 외처 내보고 싶고, 또 그것만이 나의 마지막 생명 걸고 외처 대는, 귀중한 진실입니다.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