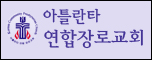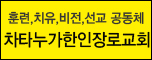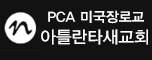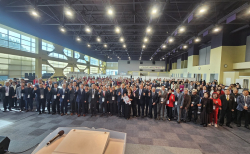시대를 떠나, 언제나 들을 수 있는 태초의 소리가 있다면 소나기가 아닐까 함이다. 그만큼 인위적인 소릴 배제한다. 소나기가 쏟아지는 날의 리듬과 냄새는 어울림의 교향악이라 할까? 글쎄, 소리를 냄새와 조화해 본다는 것이 가능한지 갸우뚱한 느낌이 서지만, 이런 조화의 능력이 소나기를 정감 있게 경험하는 것 같다. 인간의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흙 냄새, 풀 냄새, 물과 지열의 조화로 올라오는 향취, 여기에 이곳 저곳에서 소나기와 부딪쳐서 나는 잔디의 합창은 하나님의 교향악임을 배제 할 수 없다. 물론 잔디의 교향악뿐 아니라 숲 속에서 들리는 “쏴-”하는 소린 또 무엇이라 표현 할 수 있을까?
물론 인간의 손길이 닿음으로 말미암은 수 없이 많은 창조의 소리들, 지붕에서 “뚜뚜뚜 딱딱” 거리는 타악기와 물받이를 통과해서 나는 소통의 소린, 금관악기라고 말해도 될까? 마룻바닥을 똑똑똑 때리는 소리는 무슨 악기에 비유할까? 이렇듯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소린 지천에 깔린 소리지만, 특히 소나기 오는 날엔 생명의 냄새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창조를 더욱 음미하게 하는 은총의 날이기도 하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은총 가운데 빼 놓을 수 없는 은총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에게 소리를 주심이다. 만일 사람이 사람의 소리도 들을 수 없는 바다 속 깊은 심연에 혼자 산다고 가정해 보았을 때, 그 무서움이란 무엇이라 표현해 볼 수 있을까? 적막함 속에 인간의 이미지에 익숙하지 않은 기하학적 기형에 가까운 괴물들과 더불어서 소통이 없는 곳에 인간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많은 기형적 인성을 양산할까? 그래서 사람의 소리가 있고, 자연의 소리가 있는, 적절한 타이밍에 들려주시는 창조의 교향악, 소나기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더불어서 인간에게 친숙한 리듬의 바이오는 사람이 사람에게 사람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인식하지 아니 할 수 없는 사람의 소릴 발하지 않을까?
오늘 오후 한참 잔디를 깎다가 소나기가 “후두두 탁탁“ 쏟아졌다. ”이게 웬 떡인가!“하는 심산으로 소나기를 음미하고 싶은 간절함이 집 앞 포치에 깔린 돗자리 위에 자릴 잡고 소나기를 들으며 글을 끼적이게 되었다. 집을 둘러싸고 하늘을 맞닿은 나무들의 흔들거림, 소나기 교향악에 맞추어서 춤추는 모양새를 연상케 한다. 가끔 번쩍거리는 조명과 함께 들려주는 팀파니의 ”우르르 꽝꽝“거림, 하늘의 기병들의 달림처럼 ”공격 앞으로“ 달리는 구름들의 용맹 민첩한 광경은 참으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웅대한 교향악을 혼자서 경험함이 참으로 아깝다.
만일 누군가를 필자의 집 앞 포치로 불러내어 함께 이렇게 감미롭고 웅장한 소나기 교향악에 초대해서, 둥굴레 차를 대접해 드리고, 아무 소리 않고 가만히 감상을 함께 함이 얼마나 좋을까! 멀리서 가까이서 들리는 팀파니의 쿵쾅거림을 들으면서 가슴 벅차 기도를 드린다. “하나님 창조의 소릴 듣도록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명철과 슬기도 주시옵소서!”
물론 인간의 손길이 닿음으로 말미암은 수 없이 많은 창조의 소리들, 지붕에서 “뚜뚜뚜 딱딱” 거리는 타악기와 물받이를 통과해서 나는 소통의 소린, 금관악기라고 말해도 될까? 마룻바닥을 똑똑똑 때리는 소리는 무슨 악기에 비유할까? 이렇듯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소린 지천에 깔린 소리지만, 특히 소나기 오는 날엔 생명의 냄새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창조를 더욱 음미하게 하는 은총의 날이기도 하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은총 가운데 빼 놓을 수 없는 은총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에게 소리를 주심이다. 만일 사람이 사람의 소리도 들을 수 없는 바다 속 깊은 심연에 혼자 산다고 가정해 보았을 때, 그 무서움이란 무엇이라 표현해 볼 수 있을까? 적막함 속에 인간의 이미지에 익숙하지 않은 기하학적 기형에 가까운 괴물들과 더불어서 소통이 없는 곳에 인간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많은 기형적 인성을 양산할까? 그래서 사람의 소리가 있고, 자연의 소리가 있는, 적절한 타이밍에 들려주시는 창조의 교향악, 소나기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더불어서 인간에게 친숙한 리듬의 바이오는 사람이 사람에게 사람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인식하지 아니 할 수 없는 사람의 소릴 발하지 않을까?
오늘 오후 한참 잔디를 깎다가 소나기가 “후두두 탁탁“ 쏟아졌다. ”이게 웬 떡인가!“하는 심산으로 소나기를 음미하고 싶은 간절함이 집 앞 포치에 깔린 돗자리 위에 자릴 잡고 소나기를 들으며 글을 끼적이게 되었다. 집을 둘러싸고 하늘을 맞닿은 나무들의 흔들거림, 소나기 교향악에 맞추어서 춤추는 모양새를 연상케 한다. 가끔 번쩍거리는 조명과 함께 들려주는 팀파니의 ”우르르 꽝꽝“거림, 하늘의 기병들의 달림처럼 ”공격 앞으로“ 달리는 구름들의 용맹 민첩한 광경은 참으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웅대한 교향악을 혼자서 경험함이 참으로 아깝다.
만일 누군가를 필자의 집 앞 포치로 불러내어 함께 이렇게 감미롭고 웅장한 소나기 교향악에 초대해서, 둥굴레 차를 대접해 드리고, 아무 소리 않고 가만히 감상을 함께 함이 얼마나 좋을까! 멀리서 가까이서 들리는 팀파니의 쿵쾅거림을 들으면서 가슴 벅차 기도를 드린다. “하나님 창조의 소릴 듣도록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명철과 슬기도 주시옵소서!”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