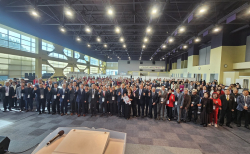60-70년대 한국영화들은 판에 박은 듯 모두가 눈물로 도배된 것들이었다. 언제나 울고, 그것도 소리 내어 오래오래 우는 장면들로 도배되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옛 장례(葬禮) 에서는 곡(哭)쟁이까지 있었던 우리 사회이고 보니 한국인에게서의 울음이란 도드라진 국민성의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와 유사하게 중국인들도 체면을 생각지 않고 우는 민족이다. 중국 CCTV의 ‘뉴스 초점(新闻焦点)’ 프로에는 매일처럼 수없이 많은 사람이 나와서 운다. 산골 벽지에서 태어난 탓에 아무리 발버둥쳐도 진학의 뜻을 이루지 못하겠노라고, 꾀임에 빠져 외지로 팔려 나갔다가 험한 꼴을 당한 끝에 어찌어찌 극적으로 가족의 품에 안겼다고, 돈밖에 모르는 마음씨 고약한 의사를 만나 심신이 엉망진창이 되었다고, 허황되게 미모만을 추구하다가 정상인의 용모를 잃어버렸다고 소리 내어 끝없이 운다.
유별나게 사람이 많은 중국이니 그만큼 아쉬움, 억울함, 원통함에 사무쳐 하소연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워낙 국민성이 울음의 미학에 통달한 터일 것이다. 그러나 서양인에게서 울음이란 내면으로 깊숙이 감추어야 하는 것이며 타인에게 울음을 보인다는 것은 감정조절을 하지 못하는 인격 결함자로 보이는 까닭에 극한 슬픔을 울음으로 승화시키지 못한다.
반면에 같은 동양 문화권에 속하지만 일본인들은 서양인의 태도와 비슷하다. 지난해 부산에서 일어났던 사격연습장의 화재로 일본 관광객들이 다수 사망하였는데 그들의 가족들이 보여준 침착함과 슬픔을 내면에 새기는 모습은 참으로 대단한 감이 없지 않았다.
치유 상담자인 정태기박사의 숨겨진 상처의 치유란 책에 이런 글이 나온다. “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 한국 여성들이 세계 어느 나라의 여성들보다 강한 것도 잘 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쏟아낸 눈물로 모든 슬픔과 고통을 정화해버립니다. 눈물이 메말랐다는 것은 어딘가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크리스쳔 중년여성이 딸을 먼저 보냈는데 그 딸의 장례에도 굳건히 눈물을 참고 버텼단다. 왜냐하면 딸이 천국에 갔는데 엄마란 사람이 울면 비 신앙적 행위가 될까 해서였는데 그 과도한 슬픔을 삭이지 못해 결국 2년만에 암으로 죽고 말았다고 한다. 그 남편인 의사가 하는 말이 그때 실컷 울었다면 이렇게 허망하게 가지 않아도 되었을 것을 하면서 한탄하였다 하니 울음이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매우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한국 남성들이 꺼이 꺼이 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사내다움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일인 까닭이다. 그러나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십자가 앞에서 울어야 할 때이다. 2010년은 새천년의 또 다른 십년을 출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이 문턱에 와 있는 그 꼭지점에 달한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까닭이다.
이제 개인을 위해 가족을 위해 우리가 속한 크고 작은 공동체를 위해 민족과 국가를 위해 크게는 세계를 위해 울고 또 울어야 한다. 요즘 교회안에 웃기는 재담은 있으나 심령을 울리는 통곡의 메아리는 들려오지 않는다. 매일 울 수는 없다 하더라도 시시때때로 나의 영혼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울 수 있어야 한다.
우리와 유사하게 중국인들도 체면을 생각지 않고 우는 민족이다. 중국 CCTV의 ‘뉴스 초점(新闻焦点)’ 프로에는 매일처럼 수없이 많은 사람이 나와서 운다. 산골 벽지에서 태어난 탓에 아무리 발버둥쳐도 진학의 뜻을 이루지 못하겠노라고, 꾀임에 빠져 외지로 팔려 나갔다가 험한 꼴을 당한 끝에 어찌어찌 극적으로 가족의 품에 안겼다고, 돈밖에 모르는 마음씨 고약한 의사를 만나 심신이 엉망진창이 되었다고, 허황되게 미모만을 추구하다가 정상인의 용모를 잃어버렸다고 소리 내어 끝없이 운다.
유별나게 사람이 많은 중국이니 그만큼 아쉬움, 억울함, 원통함에 사무쳐 하소연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워낙 국민성이 울음의 미학에 통달한 터일 것이다. 그러나 서양인에게서 울음이란 내면으로 깊숙이 감추어야 하는 것이며 타인에게 울음을 보인다는 것은 감정조절을 하지 못하는 인격 결함자로 보이는 까닭에 극한 슬픔을 울음으로 승화시키지 못한다.
반면에 같은 동양 문화권에 속하지만 일본인들은 서양인의 태도와 비슷하다. 지난해 부산에서 일어났던 사격연습장의 화재로 일본 관광객들이 다수 사망하였는데 그들의 가족들이 보여준 침착함과 슬픔을 내면에 새기는 모습은 참으로 대단한 감이 없지 않았다.
치유 상담자인 정태기박사의 숨겨진 상처의 치유란 책에 이런 글이 나온다. “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 한국 여성들이 세계 어느 나라의 여성들보다 강한 것도 잘 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쏟아낸 눈물로 모든 슬픔과 고통을 정화해버립니다. 눈물이 메말랐다는 것은 어딘가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크리스쳔 중년여성이 딸을 먼저 보냈는데 그 딸의 장례에도 굳건히 눈물을 참고 버텼단다. 왜냐하면 딸이 천국에 갔는데 엄마란 사람이 울면 비 신앙적 행위가 될까 해서였는데 그 과도한 슬픔을 삭이지 못해 결국 2년만에 암으로 죽고 말았다고 한다. 그 남편인 의사가 하는 말이 그때 실컷 울었다면 이렇게 허망하게 가지 않아도 되었을 것을 하면서 한탄하였다 하니 울음이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매우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한국 남성들이 꺼이 꺼이 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사내다움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일인 까닭이다. 그러나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십자가 앞에서 울어야 할 때이다. 2010년은 새천년의 또 다른 십년을 출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이 문턱에 와 있는 그 꼭지점에 달한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까닭이다.
이제 개인을 위해 가족을 위해 우리가 속한 크고 작은 공동체를 위해 민족과 국가를 위해 크게는 세계를 위해 울고 또 울어야 한다. 요즘 교회안에 웃기는 재담은 있으나 심령을 울리는 통곡의 메아리는 들려오지 않는다. 매일 울 수는 없다 하더라도 시시때때로 나의 영혼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울 수 있어야 한다.
© 2020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