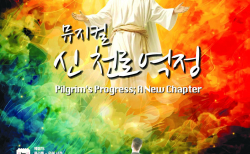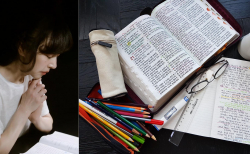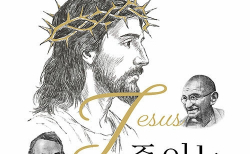시리아 남쪽, 이집트 북쪽, 지중해 동쪽 끝에 사는 유별난 민족을 유대인이라고 부른다. 이네들의 유별난 자존심과 똥고집은 로마제국 전체에 꽤나 알려져 있다. 로마 이전 그리스가 또 그 이전엔 메소포타미아가 세상의 중심이던 시절부터 이들은 빛나는 역사를 자부하며 신앙을 지독히 고집하여 왔다. 솔직히 객관적으로 저들의 조상은 이집트의 노예 출신이며 이후로도 내내 바빌론국가들의 속국이었고, 이들 역사의 전성기라 할 다윗과 솔로몬의 치세 역시 신의 영광을 크게 빛나게 하였다고 자평하기에는 민망한 수준이었다. 그런데도 이들은 자신을 신의 선택된 민족이며 그들 외의 모든 민족을 이방인이라 하며 내려다보곤 한다.
저들의 기준에 의해 이방인이 되버린 내게 이 유별남은 기독교인이 된 지금에도 종종 거슬린다. 유대인으로 이 세상에 살고간 예수의 때로 독기서린 가르침도 그러하고, 로마인이지만 유대 베냐민지파인 바울에게서도 가끔 이러한 끝모를 자부심을 느끼곤 하였다. 바울의 편지들은 이방인에게는 전혀 문제가 안되는 유대인의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곤 하였다. 물론 기독교가 이스라엘밖의 유대인 이민자들 사이에 먼저 크게 번진 탓에 읽는 이가 대체로 유대계여서인걸 모르진 않지만. 할례도 그 중 하나이다. 태어난지 8일이 되면 성기 일부를 잘라내었던 유대의 율법을 적지않은 유대계 기독교인이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에게 요구하였다.
율법의 의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이 그동안 율법의 무게에 짓눌려 있던 많은 유대인에게는 문자 그대로 기쁜 소식이 되었겠지만, 애초에 지킬 율법이라는 게 없었던 이방인에게는 그다지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로마인인 내가 기독교에 마음을 두게 된 이유는, 죄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예수가 비유로 말한 천국, 그 하나님 나라가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점에서 예수의 동생이자 예루살렘교회 지도자 야고보가 보여주는 유대인스럽지 않게 융통성있는 처신은 내게 꽤나 신선하게 느껴진다. 할례를 포함한 유대의 율법을 이방인에게도 요구해야 하는가를 두고 사도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릴 때, 그가 내린 합리적인 중재로 인해 이방인 선교의 길을 크게 연 것이 아니던가. (저자주- 사도행전 15장, 야고보는 예루살렘회의에서 바울과 점점 마음이 열리던 베드로의 입장을 지지하면서도 고집센 유대계의 체면을 살려 중재하면서 지켜야 할 율법의 예로 우상숭배, 음행, 목매어 죽는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것만 언급하였다.)
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문제는 유대인에게는 매우 심각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 30여년 기독교가 이스라엘 본토에서는 크게 환영받지 못하고 주로 로마제국에 퍼진 유대이민자들 사이에 크게 번지게 된 배경은, 이들이 같은 유대인이더라도 외국에 살면서 열린 시각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짐작한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다보니 구원이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에 의한다는 바울의 가르침은 교인들과 심지어 교회지도자들 사이에도 종종 방종으로 이어지곤 하였다. 아 이 어쩔수 없는 인간의 죄성이여. 각교회마다 이 자유를 남용하여 권위와 선행을 부지불식간에 부인하며, 거룩함을 요구하던 율법에서는 자유로우면서 쉽게 구원을 기대하는 풍조가 만연하게 된 것이다.
사도 야고보가 이를 또 그냥 보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시대를 열게 한 장본인이라고도 할 그가 노구를 이끌고 교회들을 다니며 반대로 각성을 요구한 것이다. 그가 순교하기 전 남기며 회람을 지시한 편지속에서도 그러하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며 (저자주 – 야고보서 2장15절) 거룩함에서 멀어지는 일부 신자들의 태도를 준엄하게 경고하는 야고보의 일갈. 노사도의 지적에 많은 공감이 있던 차에, 마가를 이어 예수의 생애를 글로 남기는 작업을 하는 동지들 사이에서도 행함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에 주목하자는 목소리가 많이 들려오고 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은 이토록 중용을 지키기가 어려운 것인지. 자유와 율법을 오가며 헤매고 있다. <계속>